| J Korean Neurol Assoc > Volume 43(1); 2025 > Article |
|
Abstract
Background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is a rare and a rapidly progressive, invariably fatal neurodegenerative disorder believed to be caused by an abnormal isoform of a cellular glycoprotein known as the prion protein. The disease develops in very different ways, such as sporadic, genetic, and iatrogenic. We aim to identify the incidence of CJD genotypes registered in the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from 2017 to 2023 and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pathogenic CJD genotypes to serve as a basis for preventing transmission.
Method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ereditary CDJ among subjects reported through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from 2017 to 2023.
Results
In total, six pathogenic genotypes were identified in Korean patients, with P102L belonging to Gerstmann-Sträussler-Scheinker syndrome being the most common (16, 30.2%), followed by V180I (13, 24.5%), M232R (10, 18.9%), and E200K (seven, 18.9%), which are highly prevalent in Asia, and D178N (six, 11.3%) and V203I (one, 1.9%), which belong to fatal familial insomnia.
Conclu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identification of P102L as the predominant genotype observed among individuals in their 30s and 40s in Korea. Moreover, it highlights that the occurrence of visual symptoms at an early stage is more prevalent in this age group compared to individuals over 50. Therefore, if a young individual reports a subjective decline in visual acuity not adequately accounted for by structural abnormalities of the eye, it becomes imperative to confirm the presence of CJD before undergoing ophthalmic procedures (such as corneal or retinal surgery), as these procedures involve high-risk organs for CJD transmission.
프리온 질환은 변형된 프리온단백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환으로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해면상 뇌병증이다. 프리온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는 PrPSC이며 정상 신경전달물질인 프리온단백(PrPC)을 코팅하는 PRNP유전자에 병원성 변종(pathogenic mutation)이 발생하여[1] 비정상적인 불용 단백질(PrPSC) 형태가 축적되면서 신경 파괴를 유발한다[2]. 동물의 경우 양, 염소(scrapie), 사슴(chronic wasting disease), 소(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등에서 발생하며 사람의 경우 전파 경로에 따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 sCJD)과 획득형인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atragenic Creutzfeldt-Jakob disease, iCJD), 변종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유전적 소인에 의한 유전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genetic Creutzfeldt-Jakob disease, gCJD)으로 구분된다. vCJD는 2019년 프랑스 프리온 실험실 연구원에서 발생 이후 보고가 없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0만 명당 1-2명 발생 수준이다.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sCJD가 85-90%이고 gCJD가 10-15%이다. sCJD와 gCJD의 감별은 프리온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특이적인 PRNP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로 확인한다. 병원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친족 간에 유전되는 확률은 변이마다 다른데 게르스트만-스트로이슬러-샤인케르증후군(Gerstmann-Sträussler-Scheinker syndrome, GSS)과 치명 가족성 불면증(fatal familial insomnia, FFI)에 속하는 유전형은 특정 가계에서 높은 유전율이 확인된 유전형으로 이는 별도로 GSS, FFI로 분류되고 있다[3]. 특히 GSS에 속하는 유전형들은 sCJD보다 이른 나이에 발생하며 유병 기간이 다른 유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4]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gCJD는 sCJD와 달리 증상 발생 이전에도 선제 검사를 통한 감별이 가능하여 무증상기의 전파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정감염병 전수 감시 체계에 등록된 CJD 유전형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병원성 CJD 유전형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전파 차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017-2023년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감시 체계를 통해 신고된 대상자 중 질병관리청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환자(추정, 확진)로 분류된 건은 475이며 그중 sCJD가 352건, 특이 유전자 확인 사례가 123건이다. 특이 유전자 사례 중 병독성 PRNP유전자 돌연변이로 분류되지 않는 유전자 다형성(polymorphism) 70명과 sCJD 환자 35명을 제외한 gCJD 환자는 53명이다(Fig. 1).
병원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 총 5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유전자 돌연변이 종류별 특성과 생존 기간을 분석하였다. 생존 기간 산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망 정보와 연계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의 사망일자를 사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CJD의 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성별, 연령 구간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 병원성 유전형 종류별 생존 기간(증상 발생일부터 사망일까지)은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카플란마이어(Kaplan Meier)를 하였다.
국내에서 10년간 발생한 gCJD 환자는 총 53명이다. 매년 4-11명까지 발생하였으며 전체 CJD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은 여자가 29명, 남성이 24명으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발생 연령대는 60대에서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 50대에서 10명, 70대에서 8명, 80대에서 6명, 30대에서 3명 순이었다. 주요 발생 연령대는 40-60대로 전체 발생의 68%였다.
CJD 환자에서 신경계 증상은 크게 9가지 증상을 척도로 한다. 모든 사례가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었으며 중복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증상은 진행 치매(progressive dementia, 79.2%), 보행장애를 나타내는 소뇌기능장애(cerebellar sign, 64.2%)로 전체 환자의 60-70% 이상에서 확인되었다. 우울증, 불안, 환각 등의 정신 증상(psychiatric symptom, 39.6%)과 진전, 근긴장 이상 등의 추체외로징후(extrapyramidal sign, 37.7%), 위약감, 경직 등의 추체로징후(pyramidal sign)는 약 30-40%였고 흐린 시야, 시야 결손 등의 시각징후(visual sign, 28.3%)와 근간대성 경련(myoclonus, 28.3%)은 30% 미만에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증상을 보면 남성이 진행 치매, 소뇌기능장애, 근간대성 경련, 추체로-추체외로징후, 시각징후, 정신 증상 순이었고, 여성은 진행 치매, 소뇌기능장애, 정신 증상, 추체외로 징후, 시각징후, 근간대성 경련 순이었다. 남녀 모두 50% 이상 확인된 증상은 진행 치매와 소뇌기능장애였다. 성별 간 증상 구분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 증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이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연령군을 50대 전후로 구분하여 증상 분포를 확인하였다. 두 연령군에서 진행 치매, 소뇌기증장애의 순위는 각각 1위, 2위로 같았다. 시작징후와 추체로징후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높았고 정신 증상과 근간대성 경련 비중은 50대 이상이 젊은 연령층보다 높았다. 연령 구분에서의 임상 증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뇌기능장애는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Table 2).
발병 초기 증상으로 진행 치매가 80% 이상의 비중을 보인 유전형은 P102L, V180I, E200K이고 소뇌기능장애가 80% 이상 비중인 유전형은 P102L (87%)이며 정신 증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전형은 D178N (68%)이었다.
P102L은 진행 치매와 소뇌기능장애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특징적이며 추체외로징후, 추체로징후, 시각징후, 근간대성 경련 증상은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정신 증상, 무운동함구증(akinetic mutism)이 18%였으며 지속적인 통증 감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V180I는 CJD 환자에서 발현되는 모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으며 그중 진행 치매 비중이 85%로 가장 높았다. 정신 증상을 포함하여 소뇌기능 이상, 추체로, 추체외로징후가 46%로 같은 비중이었으며 시각 징후, 근간대성 경련, 지속적인 통증 감각이 20-30%, 무운동함구증이 10% 미만 비중이었다.
M232R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진행 치매(70%)였고 정신 증상, 소뇌기능장애, 추체로징후와 추체외로징후가 20-40%의 비중이었다.
E200K에서는 진행 치매가 85% 이상이었으며 정신 증상이 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소뇌기능장애, 추체외로징후, 시각징후, 근간대성 경련, 무운동함구증이 20-40% 비중이었으며 추체로징후는 10% 내외였다.
D178N은 진행 치매, 소뇌기능장애, 정신 증상이 67%의 같은 비중으로 발생하였으며 시각징후, 근간대성 경련이 10% 내외이고 추체로징후는 없었다(Table 3).
임상 검사는 뇌파 검사(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통해 특징적인 주기성의 예파(typical periodic complexes on the electroencephalogram)를 확인하고 뇌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 또는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fluid-attenuated in version recovery)에서 대뇌피질과 미상핵, 기저핵의 고신호강도의 소견을 확인한다.
MRI를 실시한 49명 중 31명(63.3%)에서 확산강조영상 또는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였고 EEG를 실시한 32명 중 13명(40.6%)에서 주기예파가 관찰되었다. 유형별로는 MRI의 경우 E200K가 85.7%로 가장 높았고 P102L, V180I, M232R에서는 50-60%, D178N은 33% 이하였다. EEG는 모든 사례에서 40%대 이하였으며 그중 E200K가 42.9%로 가장 높았다.
실험실 검사는 뇌척수액에서 변형 프리온단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실시간진동유도변환법(real-time quaking-induced conversion, RT-QuIC) 검사와 14-3-3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의 양성률을 확인하였다. RT-QuIC는 검사 미실시 3건을 제외한 50명의 실시자 중 32명이 양성(64.0%)이었고 14-3-3은 49명이 검사 실시하여 29명 양성(59.2%)이었다. 유전형별 RT-QuIC 양성률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확인되는 P102L과 D178N에서는 60%대였으며 E200K, M232R에서 90-100%였다. V180I는 23%로 가장 낮았는데 methionine-valine (MV)의 비율이 다른 유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 129번 유전자부호(codon) 다형성의 3가지 유형(methionine-methionine [MM], MV, valine-valine [VV]) 검사는 CJD 법정감염병 진단 검사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형 접합일 경우 CJD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분석하였다. 전체 사례 중 MM형 동형 접합(homozygote)은 44명(83.0%)이었고 MV형은 9명(17.0%)이었다. 유전형별 동형 접합률은 D178N, E200K가 100%, P102L은 85%, V180I, M232R이 약 70%였다(Table 3).
가족성 CJD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직계 후손에게 병원성 돌연변이가 유전될 확률은 50%이다[5]. 부모를 통해 받은 유전자가 자식에서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다. 7년 데이터는 모계 추정 기간으로 충분치 않아 부계(동일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동일 성씨 분포는 D178N-129M이 100%, P102L이 75%, E200K는 28.6%, V180I는 15.4%, M232R이 11.8%였고 기록을 통해 확인된 가족력은 P102L이 6명(부 2명, 모 1명, 형제자매 3명), D178N-129M 2명(자매, 사촌), E200K 1명(부), V180l 1명(자매)이었다. 해당 사례 중 PRNP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가족성 CJD로 확인된 사례는 2023년 P102L 유전형 사례(M/48) 1건으로, 환자로부터 친누나가 CJD 진단 후 사망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추적 결과 친누나는 2017년 의심 환자로 신고되어 동일 유전형(P102L)으로 분류된 유전형 환자(F/48)였다. 남매는 각각 48, 47세에 발병하였다. 이외는 gCJD로 진단된 환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 및 신경학적 증상으로 단기간에 사망한 정보를 공유받았으나 신고 및 검사 기록이 없고 정보 제공 시점 이전 사망으로 가족성 CJD 여부 확인은 불가하였다(Table 4).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병원성 PRNP유전자 돌연변이는 30개 이상이며 병원성 유전형이 있는 경우 100% 발현된다[3]. 국내에서 확인된 유전형은 다형성 3종(M129V, E219K, P68P)과 유전성 돌연변이 6종(P102L [16명], V180I [13명], D178N-129M [6명], M232R [10명], E200K [7명])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P102L은 GSS에 속하는 유전형으로 주로 PRNP유전자 102번 유전자부호 돌연변이로 유발된다. 증상은 소뇌기능장애가 높게 확인되며 유전율이 높고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8]. 국내 분석 결과에서도 30-40대가 주요 발생 연령이었으며 2년 이상 생존율이 50% 이상이었다. 주요 증상은 진행 치매(79.2%), 소뇌기능장애(64.2%)였으며 신경계 증상 외 시각장애가 다른 유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V180I는 180번 유전자부호에서 발린(valine)이 아이소류신(isoleucine)으로 치환된 돌연변이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고 일본에서는 가장 높은 유전형이며[9] 백인에서는 드문 유전형으로 알려져 있다[10]. 대체로 늦은 나이에 발생하며 질병이 느리게 진행되고 근간대성 경련, 소뇌기능장애, 추체로 징후와 시각징후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증상은 인지장애이다. MRI의 확산강조영상에서 뇌피질의 고신호강도가 진단에 유용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에서 PrPSc 양성이 낮아 느리게 진행되는 치매와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11].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추체외로징후, 추체로징후, 정신 증상 외 소뇌기능장애가 같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시각징후도 30% 이상에서 확인되었다. 5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짧게는 8개월, 길게는 43개월 생존하였다.
M232R은 232번 유전자부호에서 메싸이오닌(methionine)이 아르지닌으로 치환된 돌연변이로 일본에서 높게 확인되는 돌연변이 중 하나이다[9]. 가족력이 낮고 저병원성 돌연변이이거나 sCJD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형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3]. 우리나라에서는 10명이 발생하여으며 평균 연령은 60세이고 평균 생존 기간은 15개월이며 발생 수(10명)에 비해 증상 빈도는 높지 않았다.
E200K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PRNP돌연변이로 군집 사례(clustering)를 일으킨 유일한 돌연변이다. 슬로바키아에서 클러스터가 처음 확인되었으며 슬로바키아 인구와 역사적, 지리적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이 보고되었다. 사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연간 발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5-154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12,13]. 우리나라에서는 7명 확인되었으며 초기 증상은 5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2년 이내 사망하는 특성을 보이며 정신 증상이 57% 이상 높았다.
D178N-129M는 FFI에 속하며 유전형으로 국내에서는 총 6명이 확인되었다. D178N PRNP유전자는 129번 유전자 부호의 유전자형에 따라 표현형이 나타나는데 발린일 경우 gCJD이며 메싸이오닌일 경우 FFI로 분류된다. FFI는 발병 시기와 생존 기간이 넓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 국내 확인된 유전형은 모두 FFI이며 발병 시기는 30대에서 80대였고 생존 기간 1년 미만에서 2년으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초기 증상은 진행 치매(66.7%)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소뇌기능장애(66.7%)와 정신 증상(66.7%)이 같은 빈도였다.
병원성 PRNP유전자 돌연변이 외에도 CJD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29번 유전자부호 다형성은 두 가지 아미노산, 즉 메싸이오닌과 발린에 따라 MM, MV, VV 세 가지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129번 유전자부호가 MM형일 때 CJD에 감수성이 높다[13]. 국내 유전형 53명 중 44명(83.0%)이 MM 동형 접합체(homozygote)였으며 MV가 17.0%였다. 정상인의 경우 PRNP유전자 129번 유전자부호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polymorphism)을 나타내는데 특히 129번 유전자부호가 MM 동형 접합체를 가진 사람에서 발생률이 높고 한국의 경우 11명(94.33%)이 MM형으로 CJD에 감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 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CJD 환자의 129번 유전자부호는 MM형이 71%로 높았으며[16] 영국의 프라이온 전문가인 콜린지 등에서 vCJD 환자 모두가 MM형인 사실을 확인하면서[17] MM형 분포가 높은 동아시아 지역(한국 94%, 일본 92%, 중국 98% 등)이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18] 이후 연구에서 129번 유전자부호의 EK 이형 접합이 프리온 질환에 저항하는 유전 형질로 발견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CJD 감수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는 줄었고[19]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은 인구 100명 당 1-2명 수준이다.
임상 검사(MRI, EEG)와 실험실 결과(RT-QuIC, 14-3-3)에서는 대체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P102L과 D178N에서의 양성률이 낮았고 50대 이후에서 확인되는 M232R, E200K에서는 높았다. V180I는 50대 이후 확인되는 유전형이나 예외적으로 RT-QuIC 양성률이 23%로 가장 낮았는데 MV의 비율이 다른 유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129번 유전자부호의 MV형은 RT-QuIC의 민감도가 낮은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20].
본 연구는 병원성 유전형 종류별 환자의 생존 기간, 발생 증상의 종류, 증상 발생 시기 등이 변수 통제 실험을 할 경우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감시 체계에 등록된 CJD 환자 전수(2017-2023년)를 대상으로 국내 유전형 CJD 특성을 분석한 최초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 3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전형은 P102L이며 초기에 시각징후의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높았다. 젊은 연령층에서 안과의 구조적 이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주관적인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 시술(수술) 전 CJD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CJD 선별 질문서'를 제작하여 안과 시술(수술) 전 CJD 증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 배포하였다. E200K 유전형 발생이 높은 슬로바키아에서는 iCJD 전파 예방을 위해 각막 기증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1].
그간 PRNP유전자 분석 결과 친족 사례에서 동일 유전형이 확인된 가족성 CJD 사례는 P102L 유전형에서 1건이었다. 추정되는 가족성 CJD 사례는 9건이며 그중 P102L형이 5건(55.6%)으로 국내 가족성 CJD의 주요 유전형일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유전형은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유병 기간이 다른 유전형보다 길어 iCJD 전파 예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족성 CJD 직계 가족 대상 유전형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gCJD 환자 가족(직계, 형제, 자매)은 전국 신경과 의료기관을 통해 PRNP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CJD는 급속히 진행하는 인지장애에 이어 운동 실조증과 근간대성 경련 등의 신경계 증상이 진행되고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증상의 초기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몇 달에서 몇 년의 매우 고통스러운 임상 경과를 거치게 된다. 이에 진단된 환자나 가족에 대해 심리사회적 문제, 가족의 역학 평가, 정보 오류로 인한 불안감 등을 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Windl O, Dempster M, Estibeiro JP, Lathe R, de Silva R, Esmonde T, et al. Genetic basis of Creutzfeldt-Jakob disease in the United Kingdom: a systematic analysis of predisposing mutations and allelic variation in the PRNP gene. Hum Genet 1996;98:259-264.


2.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 PRNP gene: prion protein (Kanno blood group). [online] [cited 2013 Sep 19]. Available from: https://ghr.nlm.nih.gov/gene/PRNP.
3. Cracco L, Appleby BS, Gambetti P. Fatal familial insomnia and sporadic fatal insomnia. Handb Clin Neurol 2018;153:271-299.


4. Chen Z, Guo JJ, Ran N, Zhong Y, Yang F, Sun H. A family with mental disorder as the first symptom finally confirmed with Gerstmann-Sträussler-Scheinker disease with P102L mutation in PRNP gene - case report. Prion 2023;17:37-43.



5. Clift K, Guthrie K, Klee EW, Boczek N, Cousin M, Blackburn P, et al. Familial Creutzfeldt-Jakob disease: case report and role of genetic counseling in post mortem testing. Prion 2016;10:502-506.



6. Goldgaber D, Goldfarb LG, Brown P, Asher DM, Brown WT, Lin S, et al. Mutations in familial Creutzfeldt-Jakob disease and Gerstmann-Sträussler-Scheinker’s syndrome. Exp Neurol 1989;106:204-206.


7. Kretzschmar HA, Honold G, Seitelberger F, Feucht M, Wessely P, Mehraein P, et al. Prion protein mutation in family first reported by Gerstmann, Sträussler, and Scheinker. Lancet 1991;337:1160.


8. Hsiao K, Baker HF, Crow TJ, Poulter M, Owen F, Terwilliger JD, et al. Linkage of a prion protein missense variant to Gerstmann-Sträussler syndrome. Nature 1989;338:342-345.


9. Minikel EV, Vallabh SM, Lek M, Estrada K, Samocha KE, Sathirapongsasuti JF, et al. Quantifying prion disease penetrance using large population control cohorts. Sci Transl Med 2016;8:322ra9.


10. Takada LT, Kim MO, Cleveland RW, Wong K, Forner SA, Gala II, et al. Genetic prion disease: Experience of a rapidly progressive dementia center in the United States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 J Med Genet B Neuropsychiatr Genet 2017;174:36-69.



11. Qina T, Sanjo N, Hizume M, Higuma M, Tomita M, Atarashi R. Clinical features of genetic Creutzfeldt-Jakob disease with V180I mutation in the prion protein gene. BMJ Open 2014;4:e004968.



12. Goldfarb LG, Mitrová E, Brown P, Toh BK, Gajdusek DC. Mutation in codon 200 of scrapie amyloid protein gene in two clusters of Creutzfeldt-Jakob disease in Slovakia. Lancet 1990;336:514-515.

13. Kovács GG, Bakos A, Mitrova E, Minárovits J, László L, Majtényi K. Human prion diseases: the Hungarian experience. Ideggyogy Sz 2007;60:447-452.

14. Kovács GG, Puopolo M, Ladogana A, Pocchiari M, Budka H, Collins SJ, et al. Genetic prion disease: the EUROCJD experience. Hum Genet 2005;118:166-174.


15. Kim YS. Mad cow disease and new 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J Korean Acad Fam Med 2004;25:509-518.
16. Gelpi E, Baiardi S, Nos C, Dellavalle S, Aldecoa I, Ruiz-Garcia R, et al. 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 VM1: phenotypic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 novel subtype of human prion disease. Acta Neuropathol Commun 2022;10:114.



17. Ironside JW, Head MW. Neuropathology and molecular biology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Curr Top Microbiol Immunol 2004;284:133-159.


19. Shibuya S, Higuchi J, Shin RW, Tateishi J, Kitamoto T. Codon 219 Lys allele of PRNP is not found in 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 Ann Neurol 1998;43:826-828.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reported cases (2017-2023)
Table 2.
Types of neurological symptoms by sex and age group in genotype Creutzfeldt-Jakob disease cases (2017-2023)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hogenic genotypes by types (2017-2023)
| Category | Total (n=53) | P102L (n=16) | D178N (n=6) | V180I (n=13) | M232R (n=10) | E200K (n=7) | V203I (n=1) | |
|---|---|---|---|---|---|---|---|---|
| Neurological symptoms | progressive dementia | 42 (79.2) | 13 (81.2) | 4 (66.7) | 11 (84.6) | 7 (70.0) | 6 (85.7) | 1 (100.0) |
| Cerebellar signs | 32 (60.4) | 14 (87.5) | 4 (66.7) | 6 (46.2) | 4 (40.0) | 3 (42.9) | 1 (100.0) | |
| Psychiatric signs | 20 (37.7) | 3 (18.8) | 4 (66.7) | 6 (46.2) | 3 (30.0) | 4 (57.1) | - | |
| Extrapyramidal signs | 18 (34.0) | 5 (31.3) | 2 (33.3) | 6 (46.2) | 3 (30.0) | 2 (28.6) | - | |
| Pyramidal signs | 16 (30.2) | 6 (37.5) | - | 6 (46.2) | 2 (20.0) | 1 (14.3) | 1 (100.0) | |
| Visual signs | 15 (28.3) | 6 (37.5) | 1 (16.7) | 4 (30.8) | 2 (20.0) | 2 (28.6) | - | |
| Myoclonus | 15 (28.3) | 5 (31.5) | 1 (16.7) | 3 (23.1) | 3 (30.0) | 3 (42.9) | - | |
| Akinetic mutism | 6 (11.3) | 3 (18.8) | - | 1 (7.7) | - | 2 (28.6) | ||
| Persistent painful sensory | 3 (5.7) | - | - | 3 (23.1) | - | - | ||
| Age (years) | 30-40 | 13 (24.5) | 12 (75.0) | 1 (33.3) | - | - | - | - |
| 50-60 | 26 (49.1) | 4 (25.0) | 4 (66.7) | 4 (30.8) | 8 (80.0) | 6 (85.7) | - | |
| 70-80 | 14 (26.4) | - | 9 (69.2) | 2 (20.0) | 1 (14.3) | 1 (100.0) | ||
| Survival timea | Less than 1 year | 17 (32.1) | - | 2 (33.3) | 4 (30.8) | 6 (60.0) | 5 (71.4) | - |
| 1 to 2 years | 17 (32.1) | 6 (37.5) | 4 (66.7) | 3 (23.1) | 3 (30.0) | 2 (28.6) | 1 (100.0) | |
| More than 2 years | 14 (26.4) | 8 (50.0) | - | 3 (23.1) | 1 (10.0) | - | - | |
| Other survivors | 5 (9.4) | 2 (12.5) | - | 3 (23.1) | - | - | - | |
| MRI/EEG | MRI | 31 (63.3) | 8 (50.0) | 2 (33.3) | 9 (69.2) | 6 (60.0) | 6 (85.7) | - |
| EEG | 13 (40.6) | 3 (18.8) | 0 (0.0) | 4 (30.8) | 3 (30.0) | 3 (42.9) | - | |
| Laboratory tests | RT-QuIC | 32 (64.0) | 9 (56.3) | 4 (66.7) | 3 (23.1) | 9 (90.0) | 7 (100.0) | - |
| 14-3-3 | 29 (59.2) | 8 (50.0) | 1 (16.7) | 7 (53.8) | 7 (70.0) | 5 (71.4) | 1 (100.0) | |
| 129 codon | MM | 44 (83.0) | 14 (87.5) | 6 (100.0) | 9 (69.5) | 8 (80.0) | 7 (100.0) | 1 (100.0) |
| MV | 9 (17.0) | 2 (12.5) | - | 4 (30.5) | 2 (20.0) | - | - |
Table 4.
Classification of same surname by pathogenic genotype type (2017-2023)
- TOOLS
-
METRICS

-
- 0 Crossref
- 0 Scopus
- 633 View
- 24 Download
- Related articles
-
Patient with Creutzfeldt-Jakob Disease Who Presented Peripheral Type Facial Palsy2024 February;42(1)
Clinical Features of Genetic Creutzfeldt-Jakob Disease with E200K Mutation2021 August;39(3)
Patient with Creutzfeldt-Jakob Disease Who Presented Symptom Fluctuation2021 February;39(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REM-Dependent Obstructive Sleep Apnea in Korean Adults2016 May;34(2)
Current Status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Korea198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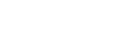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