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성인발병실조(sporadic adult-onset ataxia)는 20세 이후 성인에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진행하는 실조를 보이는 소뇌의 퇴행질환이다[1]. 사지, 보행의 운동실조, 진전, 구음장애, 안운동장애와 같은 소뇌와 연관된 운동 증상이 주 증상이며 환자에 따라서 감각 이상, 요실금, 기립 저혈압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2]. 뚜렷한 생물 표지자가 없어 증상의 진행과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cale for the Assessment and Rating of Ataxia (SARA) 같은 척도 검사가 주로 이용된다[3]. SARA 척도 검사는 기존 운동실조 환자 척도 검사에 비해 항목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나 평균 측정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로 실제 외래 환경에서 측정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3]. 일어서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UG)와 10미터 보행 검사(10-meter walk test, 10MWT)는 보행 및 운동과 연관된 신경계질환의 운동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비교적 수행 소요 시간이 짧고 간편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발성인발병실조와 같은 진행하는 운동 질환에서 평가 척도로써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증 례
3차병원 이상운동질환 클리닉에서 진단 후 1년 이상 추적 관찰 중인 산발성인발병실조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SARA 척도와 TUG, 10MWT를 각각 측정하였다. 대상 환자는 진행하는 운동실조를 보이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뇌자기공명영상, 뇌 도파민운반체양전자단층촬영(N-3-fluoropropyl-2-β-carbomethoxy-3-β-(4-iodophenyl) nortropan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P-CIT PET)을 시행하고 임상 수준에서 검사 가능한 SCA 패널, 자율신경장애 검사, 세룰로플라스민과 갑상샘항체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선천성, 이차성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TUG는 표준 검사 방법을 따라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3 m 보행 후 되돌아와 의자에 앉기까지 소요 시간과 걸음 수를 기록하였다. 10MWT도 수행하는 동안 소요 시간과 걸음 수를 측정하였다. TUG와 10MWT는 각각 2회 시행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SARA 점수 총점, 10MWT의 소요 시간(초), 걸음 수, TUG의 소요 시간(초)과 걸음 수를 변수로 측정하였다. 모든 검사는 같은 날 시행하였다. SARA 총점과 각 보행 검사의 측정값으로 이변량 상관 분석을 하였다. 통계 및 그래프 작성에는 R 4.0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과 ggplot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체 35명의 산발성인발병실조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중 남자 17명, 여자 18명으로 성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55.5±11.3세였고 평균 유병 기간은 40.0±15.3개월이었다. SARA 점수가 29.5점으로 측정된 53세 여자 환자는 낙상 위험으로 TUG 수행이 불가하여 해당 결과값을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각 측정값은 SARA 총점 11.6±5.6, TUG 수행 시간 19.5±10.4초, 걸음 수 27.0±13.1걸음, 10MWT 수행 시간 17.3±13.2초, 걸음 수 28.9±15.3걸음이었다. SARA 총점과 각 보행 측정값과의 상관 분석을 하였다. SARA 총점과 각 측정값의 상관관계는 10MWT 수행 시간(n=35; r=0.81; p<0.001), TUG 수행 시간(n=34; r=0.79; p<0.001), 10MWT 걸음 수(n=35; r=0.73; p<0.001) 그리고 TUG 걸음 수(n=34; r=0.73; p<0.001) 순서로 상관관계가 높았고 모든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ARA 총점과 각 측정값의 분포 그래프는 Fig.와 같았다. SARA 점수의 세부 항목에서는 걷기, 서기, 앉기, 구어장애, 손가락 따라가기, 손바닥 빨리 뒤집기에서는 4가지 보행 지표와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코-손가락 검사, 발꿈치-정강이 검사 두 항목에서는 4가지 보행 지표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 찰
산발성인발병실조는 퇴행운동실조 원인 중 하나로 흔히 다계통위축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다계통위축증은 평균적으로 진단 5년 후 휠체어 의존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산발성인발병실조는 11년 정도로 이전 연구에서 관찰 연구 대상자 36명 중 7명만 휠체어 의존적이었다는 보고도 있다[4]. 평균 생존 기간 역시 25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외래에서 보행 가능한 상태로 추적 관찰되고 있다[5]. 질환의 특성상 추적 관찰 기간이 긴 반면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 진단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평가와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운동실조 환자의 경우 질환의 중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cooperative ataxia rating scale (ICARS)과 SARA 척도 검사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척도 검사는 운동실조와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세부 항목별로 측정하여 정확성은 높으나 측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고 측정 시간 역시 15-40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산발성인발병실조와 같이 임상 연구가 드물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서는 바쁜 외래 환경에서 척도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의 경과와 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의 설명과 시진에 의존하게 되어 정량적인 평가가 부족하다. TUG와 10MWT는 검사자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고 간편하여 여러 신경계질환의 운동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보행의 큰 문제가 없는 경우 3분 이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바쁜 외래 환경에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 더불어 정량적 수치로 기록할 수 있어 비교 추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 두 보행 검사의 모든 측정값이 실제 SARA 척도 검사의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행 가능한 상태로 외래 추적 관찰이 되는 산발성인발병실조의 경우 임상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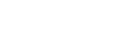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