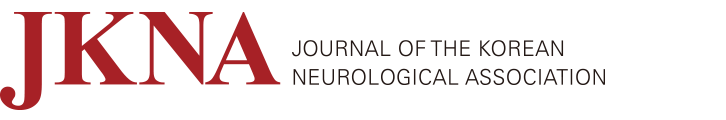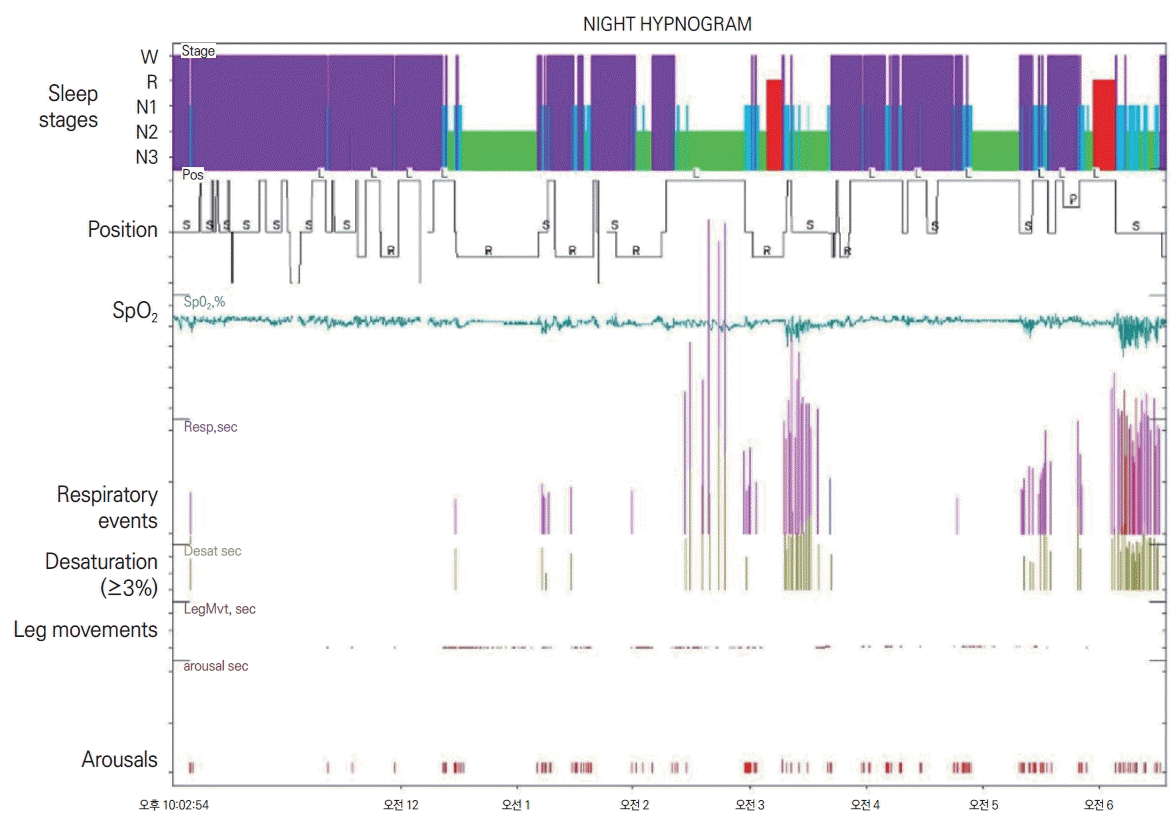A 73-year-old Woman Presenting with Insomnia
- Dongyeop Kim, MD, PhD, Jee Hyun Kim, MD, PhD
л¶Ҳл©ҙмҰқмқ„ мЈјмҶҢлЎң лӮҙмӣҗн•ң 73м„ё м—¬мһҗ
- к№ҖлҸҷм—Ҫ, к№Җм§Җнҳ„
- Received July 31, 2025; В В В Revised September 1, 2025; В В В Accepted September 1, 2025;
- мҰқ лЎҖ
- мҰқ лЎҖ
73м„ё м—¬мһҗ нҷҳмһҗк°Җ 60лҢҖл¶Җн„° л°ңмғқн•ң л¶Ҳл©ҙмҰқмңјлЎң лӮҙмӣҗн•ҳмҳҖлӢӨ. лҲ„мҡҙ нӣ„ мһ л“Өкё°к№Ңм§Җ м•Ҫ 2мӢңк°„мқҙ мҶҢмҡ”лҗңлӢӨкі нҳёмҶҢн•ҳмҳҖкі мһ…л©ҙ мқҙнӣ„м—җлҠ” 3-4м°ЁлЎҖ м •лҸ„ мһҗлӢӨк°Җ 깬лӢӨкі н•ҳмҳҖлӢӨ.
- м§Ҳл¬ё 1. мқҙ нҷҳмһҗм—җкІҢм„ң 추к°ҖлЎң мІӯм·Ён•ҙм•ј н• лі‘л ҘмқҖ л¬ҙм—Үмқёк°Җ?
- м§Ҳл¬ё 1. мқҙ нҷҳмһҗм—җкІҢм„ң 추к°ҖлЎң мІӯм·Ён•ҙм•ј н• лі‘л ҘмқҖ л¬ҙм—Үмқёк°Җ?
л¶Ҳл©ҙмҰқмқҖ м§ҖмҶҚ кё°к°„м—җ л”°лқј 3к°ңмӣ” лҜёл§Ңмқҳ мқјмӢңм Ғмқё мӣҗмқёмңјлЎң л°ңмғқн•ҳлҠ” кёүм„ұ л¶Ҳл©ҙмҰқкіј мЈј 3нҡҢ мқҙмғҒ мҲҳл©ҙмһҘм• к°Җ 3к°ңмӣ” мқҙмғҒ м§ҖмҶҚлҗҳлҠ” л§Ңм„ұ л¶Ҳл©ҙмҰқмңјлЎң кө¬л¶„лҗңлӢӨ. мҰқмғҒ м–‘мғҒм—җ л”°лқјм„ңлҠ” мһ…л©ҙмһҘм• (initiation insomnia), мҲҳл©ҙмң м§ҖмһҘм• (maintenance insomnia), мЎ°кё° к°Ғм„ұ(early morning awakening)мңјлЎң 분лҘҳн• мҲҳ мһҲлӢӨ.лі‘л Ҙ мІӯм·Ё мӢңм—җлҠ” л¶Ҳл©ҙ мҰқмғҒмқҳ мӢңмһ‘ мӢңм җ, м§ҖмҶҚ кё°к°„, мҰқмғҒ м–‘мғҒкіј н•Ёк»ҳ мң л°ң мҡ”мқё(мӢ¬лҰ¬ мҠӨнҠёл ҲмҠӨ, нҷҳкІҪ ліҖнҷ” л“ұ)кіј л¶Ҳл©ҙмҰқмқ„ м§ҖмҶҚмӢңнӮӨлҠ” мқём§Җ н–үлҸҷ мҡ”мқё(мҲҳл©ҙм—җ лҢҖн•ң кіјлҸ„н•ң кұұм •, 비нҡЁмңЁм Ғмқё мҲҳл©ҙ мҠөкҙҖ, л¶Ҳлҹүн•ң мҲҳл©ҙ мң„мғқ л“ұ)м—җ лҢҖн•ң нҸүк°Җк°Җ н•„мҡ”н•ҳлӢӨ. лҳҗн•ң нҸүмҶҢ мҲҳл©ҙ мӢңк°„лҢҖ, мЈјмӨ‘кіј мЈјл§җмқҳ мҲҳл©ҙ нҢЁн„ҙ м°Ёмқҙ, мЈјкҙҖм Ғ мҲҳл©ҙ л§ҢмЎұлҸ„, мЈјк°„мЎёлҰј л°Ҹ кё°лҠҘ м Җн•ҳ м—¬л¶ҖлҘј нҷ•мқён•ҙм•ј н•ңлӢӨ. лҚ”л¶Ҳм–ҙ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ҳлЈЁмЈјкё°лҰ¬л“¬мҲҳл©ҙ-к°Ғм„ұ мһҘм• л“ұ л¶Ҳл©ҙмҰқмқ„ мң л°ңн• мҲҳ мһҲлҠ” кё°нғҖ мҲҳл©ҙмһҘм• м—җ лҢҖн•ң к°җлі„, кё°м Җ м§Ҳнҷҳ л°Ҹ ліөмҡ© м•Ҫл¬јм—җ лҢҖн•ң лі‘л Ҙ мІӯм·ЁлҸ„ мӨ‘мҡ”н•ҳлӢӨ.нҷҳмһҗлҠ” мЈјмӨ‘кіј мЈјл§җ лӘЁл‘җ м·Ём№Ё мӢңк°Ғмқҙ 22мӢңлЎң мқјм •н•ҳмҳҖмңјл©° кё°мғҒ мӢңк°ҒмқҖ мЈјмӨ‘ 5мӢң 30분, мЈјл§җ 6мӢңмҳҖлӢӨ. мЈјмӨ‘кіј мЈјл§җмқҳ мӨ‘к°„ мҲҳл©ҙ мӢңк°Ғм°ЁлҠ” 15분мңјлЎң кі„мӮ°лҗҳм—Ҳкі мң мқҳн•ң мӮ¬нҡҢм Ғ мӢңм°ЁлҠ” м—ҶлҠ” кІғмңјлЎң нҷ•мқёлҗҳм—ҲлӢӨ. нҷҳмһҗлҠ” л°Өм—җ мӢ¬н•ҙм§ҖлҠ” мўҢмёЎ н•ҳм§Җ м ҖлҰјкіј мқҙлЎң мқён•ң л¶ҲнҺёк°җ л•Ңл¬ём—җ мӣҖм§Ғмқҙкі мӢ¶мқҖ 충лҸҷмқҙ л“Өм–ҙ мһ л“Өкё° нһҳл“ӨлӢӨкі н•ҳмҳҖлӢӨ. к°җк°Ғ мҰқмғҒмқҖ л°Өм—җл§Ң лӮҳнғҖлӮҳл©° мһҗл Өкі лҲ„мӣҢ мһҲмңјл©ҙ мӢ¬н•ҙм§Җкі мӣҖм§Ғмқҙл©ҙ нҳём „лҗҳлҠ”лҚ° к°ҖмЎұл ҘмқҖ м—ҶлӢӨкі н•ҳмҳҖлӢӨ. 추к°ҖлЎң мҳҶ мӮ¬лһҢм—җкІҢ л°©н•ҙк°Җ лҗ м •лҸ„лЎң мҪ”кіЁмқҙ мҶҢлҰ¬к°Җ нҒ¬л©° м•„м№Ём—җ мқјм–ҙлӮҳл©ҙ мһҗмЈј мһ…мқҙ л§ҲлҘҙкі мҲҳл©ҙ мӨ‘ мЈјкё°м ҒмңјлЎң лӢӨлҰ¬лҘј мӣҖм°”кұ°лҰ°лӢӨлҠ” мқҙм•јкё°лҘј л“Өм–ҙліҙм•ҳлӢӨкі н•ҳмҳҖлӢӨ. лӘ© л‘ҳл Ҳ 32 cm, н—ҲлҰ¬л‘ҳл Ҳ 92 cm, мІҙм§Ҳлҹү м§ҖмҲҳ(body mass index, BMI) 27 kg/m2 мқҙкі кі нҳҲм••, кіЁлӢӨкіөмҰқ мҷё лӢӨлҘё кё°м Җ м§ҲнҷҳмқҖ м—Ҷм—ҲлӢӨ. мқҢмЈј л°Ҹ нқЎм—°мқҖ н•ҳм§Җ м•Ҡмңјл©° н•ҳлЈЁм—җ м»Өн”ј н•ң мһ” м„ӯм·Ён•ңлӢӨкі н•ҳмҳҖлӢӨ. мҲҳл©ҙмқҳ м§Ҳ м§ҖмҲҳ(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13м җ, л¶Ҳл©ҙмҰқ мӢ¬к°ҒлҸ„ м§ҖмҲҳ(insomnia severity index, ISI) 28м җ, мЈјк°„мЎёлҰј мІҷлҸ„(Epworth sleepiness scale, ESS) 17м җмңјлЎң мёЎм •лҗҳм—Ҳмңјл©° мң мқҳлҜён•ң мҲҳмӨҖмқҳ мҡ°мҡёмқҙлӮҳ л¶Ҳм•Ҳ мҰқмғҒмқҖ нҳёмҶҢн•ҳм§Җ м•Ҡм•ҳлӢӨ.
- м§Ҳл¬ё 2. мғҒкё° нҷҳмһҗм—җм„ң мқҳмӢ¬лҗҳлҠ” мҲҳл©ҙмһҘм• лҠ” м–ҙл–Ө кІғл“Өмқҙ мһҲлҠ”к°Җ?
- м§Ҳл¬ё 2. мғҒкё° нҷҳмһҗм—җм„ң мқҳмӢ¬лҗҳлҠ” мҲҳл©ҙмһҘм• лҠ” м–ҙл–Ө кІғл“Өмқҙ мһҲлҠ”к°Җ?
2014л…„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м—җм„ң л°ңн‘ңн•ң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진лӢЁ кё°мӨҖм—җ л”°лҘҙл©ҙ лӢӨмқҢмқҳ лӢӨм„Ҝ к°Җм§Җ н•„мҲҳ мЎ°кұҙмқ„ лӘЁл‘җ л§ҢмЎұн• л•Ң 진лӢЁн• мҲҳ мһҲлӢӨ[1]. мІ«м§ё, мЈјлЎң лӢӨлҰ¬м—җм„ң лҠҗк»ҙм§ҖлҠ” л¶ҲнҺён•ҳкі л¶ҲмҫҢн•ң к°җк°Ғм—җ мқҳн•ҳм—¬ лӢӨлҰ¬лҘј мӣҖм§Ғмқҙкі мӢ¶мқҖ 충лҸҷмқҙ мң л°ңлҗңлӢӨ. л‘ҳм§ё, нңҙмӢқмқҙлӮҳ 비нҷңлҸҷмӢң мӢңмһ‘лҗҳкұ°лӮҳ м•…нҷ”лҗңлӢӨ. м…Ӣм§ё, кұ·кё°, мҠӨнҠёл Ҳм№ӯ л“ұмқҳ мӣҖм§Ғмһ„м—җ мқҳн•ҳм—¬ л¶Җ분м Ғ лҳҗлҠ” мҷ„м „нһҲ мҷ„нҷ”лҗңлӢӨ. л„·м§ё, мЈјк°„ліҙлӢӨ м Җл…ҒмқҙлӮҳ м•јк°„м—җ мҰқмғҒмқҙ мӢ¬н•ҙ진лӢӨ. лӢӨм„Ҝм§ё, мқҙлҹ¬н•ң мҰқмғҒмқҙ к·јмңЎнҶө, м •л§Ҙ мҡёнҳҲ, н•ҳм§Җ л¶Җмў…, кҙҖм Ҳм—ј, к·јмңЎкІҪл Ё л“ұ лӢӨлҘё м§ҲнҷҳмңјлЎң м„ӨлӘ…лҗҳм§Җ м•Ҡм•„м•ј н•ңлӢӨ.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Җ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 м—ҶмқҙлҸ„ мһ„мғҒ мҰқмғҒл§ҢмңјлЎң 진лӢЁмқҙ к°ҖлҠҘн•ҳлӢӨ.мқҙ мҷём—җлҸ„ нҷҳмһҗлҠ” мһ…л©ҙ нӣ„ л°ҳліөм Ғмқё к°Ғм„ұ, м•јк°„ л№ҲлҮЁ, мӢ¬н•ң мҪ”кіЁмқҙ, кө¬к°• кұҙмЎ°, кіјлҸ„н•ң мЈјк°„мЎёлҰјмқ„ нҳёмҶҢн•ҳмҳҖлӢӨ. ESS м җмҲҳлҠ” 17м җмңјлЎң кіјлҸ„н•ң мЈјк°„мЎёлҰј(10м җ мқҙмғҒ) л°Ҹ мӨ‘мҰқ мЎёмқҢ(16м җ мқҙмғҒ)м—җ н•ҙлӢ№н•ңлӢӨ. мқҙлҹ¬н•ң мҰқмғҒмқҖ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 мӢңмӮ¬н•ҳл©° 비л§Ң л°Ҹ мҰқк°Җлҗң н—ҲлҰ¬ л‘ҳл ҲлҠ” мЈјмҡ” мң„н—ҳ мқёмһҗлЎң нҸүк°ҖлҗңлӢӨ. көӯм ң мҲҳл©ҙмһҘм• л¶„лҘҳ м ң3нҢҗ(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3rd edition, ICSD-3)м—җ л”°лҘҙл©ҙ м„ұмқё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ҳ 진лӢЁмқҖ лӢӨмқҢ л‘җ мЎ°кұҙ мӨ‘ н•ҳлӮҳлҘј л§ҢмЎұн• л•Ң к°ҖлҠҘн•ҳлӢӨ[2].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м—җм„ң мӢңк°„лӢ№ 5нҡҢ мқҙмғҒмқҳ нҸҗмҮ„м„ұ нҳёнқЎ мӮ¬кұҙмқҙ нҷ•мқёлҗҳл©ҙм„ң мЈјк°„мЎёлҰј, н”јлЎң, л¶Ҳл©ҙ л“ұмқҳ мҲҳл©ҙ кҙҖл Ё мҰқмғҒмқҙлӮҳ мҲҳл©ҙ мӨ‘ мҲЁл§үнһҳ, н—җл–Ўмһ„, л°ҳліөм Ғмқё мҪ”кіЁмқҙ лҳҗлҠ” л¬ҙнҳёнқЎмқҙ ліҙкі лҗҳкұ°лӮҳ кҙҖм°°лҗң кІҪмҡ°лӮҳ мҰқмғҒ мң л¬ҙмҷҖ кҙҖкі„м—Ҷмқҙ мӢңк°„лӢ№ 15нҡҢ мқҙмғҒмқҳ нҸҗмҮ„м„ұ нҳёнқЎ мӮ¬кұҙмқҙ нҷ•мқёлҗҳлҠ” кІҪмҡ°мқҙлӢӨ. мқҙлҹ¬н•ң кё°мӨҖм—җ л”°лқј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лҠ” мҲҳл©ҙл¬ҙнҳёнқЎ 진лӢЁм—җ н•„мҲҳм Ғмқё кІҖмӮ¬мқҙлӢӨ.нҷҳмһҗлҠ” мҲҳл©ҙ мӨ‘ лӢӨлҰ¬лҘј мЈјкё°м ҒмңјлЎң мӣҖм°”кұ°лҰ°лӢӨлҠ” мқҙм•јкё°лҘј л“ӨмқҖ л°” мһҲмңјл©° мқҙлҠ” мҲҳл©ҙ м—°мҶҚм„ұмқ„ л°©н•ҙн•ҳлҠ” мЈјкё°мӮ¬м§ҖмҡҙлҸҷмһҘм• (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PLMD)лҘј мӢңмӮ¬н•ңлӢӨ. мқҙ м§ҲнҷҳмқҖ м„ұмқёмқҳ кІҪмҡ°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лҘј нҶөн•ҙ мёЎм •н•ң мЈјкё°мӮ¬м§ҖмҡҙлҸҷ м§ҖмҲҳ(periodic limb movements index, PLMI)к°Җ мӢңк°„лӢ№ 15нҡҢ мқҙмғҒ, мҶҢм•„м—җм„ңлҠ” мӢңк°„лӢ№ 5нҡҢ мқҙмғҒмқҙл©ҙм„ң мҲҳл©ҙмқҳ л°©н•ҙлӮҳ мЈјк°„кё°лҠҘмһҘм• к°Җ лҸҷл°ҳлҗ л•Ң 진лӢЁн• мҲҳ мһҲлӢӨ. лӢЁ мқҙлҹ¬н•ң мҰқмғҒмқҖ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 л ҳмҲҳл©ҙн–үлҸҷмһҘм• , кё°л©ҙмҰқ л“ұ лӢӨлҘё мҲҳл©ҙ м§ҲнҷҳмңјлЎң лҚ” мһҳ м„ӨлӘ…лҗҳм§Җ м•Ҡм•„м•ј н•ҳл©° нҠ№нһҲ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ҙ нҷ•мқёлҗң кІҪмҡ°м—җлҠ” PLMDлҘј лі„лҸ„лЎң 진лӢЁн•ҳкё°ліҙлӢӨлҠ” мҲҳл©ҙ мӨ‘ мЈјкё°мӮ¬м§ҖмҡҙлҸҷ(periodic limb movements during sleep, PLMS)мқ„ лҸҷл°ҳ мҶҢкІ¬мңјлЎң кё°мҲ н•ҳлҠ” кІғмқҙ мӣҗм№ҷмқҙлӢӨ[2].нҷҳмһҗлҠ” 충분н•ң мҲҳл©ҙ кё°нҡҢмҷҖ м Ғм Ҳн•ң мҲҳл©ҙ нҷҳкІҪм—җлҸ„ л¶Ҳкө¬н•ҳкі мһ…л©ҙмһҘм• л°Ҹ мҲҳл©ҙмң м§ҖмһҘм• лҘј нҳёмҶҢн•ҳмҳҖмңјл©° мң мқҳн•ң мЈјк°„мЎёлҰј л“ұ мЈјк°„кё°лҠҘ м Җн•ҳлҘј нҳёмҶҢн•ҳмҳҖлӢӨ. PSQI 13м җ, ISI 28м җмңјлЎң м„Өл¬ём§ҖлҘј ліј л•Ң мҲҳл©ҙмқҳ м§Ҳ м Җн•ҳ л°Ҹ мӨ‘л“ұлҸ„ мқҙмғҒмқҳ л¶Ҳл©ҙ мҰқмғҒмқҙ нҷ•мқёлҗңлӢӨ. ICSD-3м—җ л”°лҘҙл©ҙ мқҙлҹ¬н•ң м–‘мғҒмқҖ л§Ңм„ұ л¶Ҳл©ҙмһҘм• (chronic insomnia disorder)м—җ л¶Җн•©н•ҳлӮҳ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ҙлӮҳ мҲҳл©ҙл¬ҙнҳёнқЎ л“ұ лӢӨлҘё мҲҳл©ҙмһҘм• м—җ мқҳн•ҳм—¬ лҚ” мһҳ м„ӨлӘ…лҗ к°ҖлҠҘм„ұмқҙ мһҲм–ҙ нҳ„ мӢңм җм—җм„ң лӢЁлҸ… 진лӢЁмқҖ мң ліҙм ҒмқҙлӢӨ[2].
- м§Ҳл¬ё 3. мқҙ нҷҳмһҗм—җм„ң н•„мҡ”н•ң кІҖмӮ¬лҠ”?
- м§Ҳл¬ё 3. мқҙ нҷҳмһҗм—җм„ң н•„мҡ”н•ң кІҖмӮ¬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ҙ мқҳмӢ¬лҗ кІҪмҡ° мқҙм°Ём Ғ мӣҗмқё к°җлі„мқ„ мң„н•ҳм—¬ ліөмҡ© м•Ҫл¬ј нҷ•мқёкіј н•Ёк»ҳ кё°мҙҲ нҳҲм•Ў кІҖмӮ¬к°Җ н•„мҡ”н•ҳлӢӨ. мІ кІ°н•ҚмқҖ к°ҖмһҘ нқ”н•ң мӣҗмқёмқҙлҜҖлЎң нҳҲмғүмҶҢ, нҺҳлҰ¬нӢҙ(ferritin), мІ кІ°н•©кёҖлЎңл¶ҲлҰ°нҸ¬нҷ”лҸ„(transferrin saturation, TSAT) л“ұмқ„ нҷ•мқён•ҳл©° л§җмҙҲ л№ҲнҳҲмқҙ м—Ҷм–ҙлҸ„ мӨ‘추 мІ кІ°н•Қм—җ мқҳн•ң мҰқмғҒмқҙ к°ҖлҠҘн•ҳлӢӨ. лҳҗн•ң мӢ кё°лҠҘ, к°‘мғҒмғҳкё°лҠҘ, лӢ№лҮЁ, 비нғҖлҜј кІ°н•Қ(folic acid, B12) л“ұ мҰқмғҒмқ„ мң л°ңн•ҳкұ°лӮҳ м•…нҷ”мӢңнӮ¬ мҲҳ мһҲлҠ” м „мӢ м§Ҳнҷҳм—җ лҢҖн•ң к°җлі„мқ„ мң„н•ҳм—¬ кҙҖл Ё кІҖмӮ¬лҘј мӢңн–үн•ңлӢӨ. л§җмҙҲмӢ кІҪлі‘мҰқмқҙлӮҳ мӢ кІҪк·јлі‘мҰқ л“ұ мң мӮ¬ мҰқнӣ„кө°кіјмқҳ к°җлі„мқҙ н•„мҡ”н•ң кІҪмҡ° мқҙн•ҷм Ғ мҶҢкІ¬м—җ л”°лқј мӢ кІҪм „лҸ„ кІҖмӮ¬, к·јм „лҸ„ кІҖмӮ¬, мҳҒмғҒ кІҖмӮ¬ л“ұмқ„ кі л Өн•ңлӢӨ.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 мң л¬ҙлҘј нҸүк°Җн•ҳкё° мң„н•ҳм—¬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к°Җ н•„мҡ”н•ҳл©° мқҙ кІҖмӮ¬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ҷҳмһҗм—җм„ң нқ”нһҲ лҸҷл°ҳлҗҳлҠ” PLMSмқҳ мң л¬ҙ л°Ҹ мӨ‘л“ұлҸ„лҘј к°қкҙҖм ҒмңјлЎң нҸүк°Җн•ҳлҠ” лҚ°м—җлҸ„ мң мҡ©н•ҳлӢӨ.ліё нҷҳмһҗмқҳ мқјл°ҳ нҳҲм•Ў кІҖмӮ¬м—җм„ң нҠ№мқҙ мҶҢкІ¬мқҖ м—Ҷм—Ҳмңјл©° нҳҲмғүмҶҢ(hemoglobin) 13.0 g/dL, нҳҲмІӯмІ (serum iron) 94 Ојg/dL, TSAT 23%лЎң м •мғҒмқҙм—ҲмңјлӮҳ ferritin 22 ng/mLлЎң мӨ‘추мӢ кІҪкі„ мІ кІ°н•Қкіј кҙҖл Ёлҗң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 мӢңмӮ¬н• мҲҳ мһҲлҠ” мҲҳмӨҖмқҙм—ҲлӢӨ.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м—җм„ң мҙқм·Ём№Ё мӢңк°„(time in bed)мқҖ 511.5분, мҙқмҲҳл©ҙ мӢңк°„(total sleep time)мқҖ 235분мңјлЎң мҲҳл©ҙ нҡЁмңЁмқҖ 45.9%лЎң нҳ„м ҖнһҲ м Җн•ҳлҗҳм–ҙ мһҲм—ҲлӢӨ. мһ…л©ҙ мқҙнӣ„ к°Ғм„ұ мӢңк°„(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WASO)мқҖ м „мІҙ мҲҳл©ҙ мӢңк°„мқҳ 53.3%лҘј м°Ём§Җн•ҳм—¬ мҲҳл©ҙмң м§ҖмһҘм• к°Җ нҷ•мқёлҗҳм—Ҳмңјл©° N1 мҲҳл©ҙ мҰқк°Җ, N3 мҲҳл©ҙ мҶҢмӢӨ л°Ҹ л ҳмҲҳл©ҙ к°җмҶҢ л“ұ л№„м •мғҒм Ғмқё мҲҳл©ҙ кө¬мЎ°лҘј ліҙмҳҖлӢӨ. мҲҳл©ҙ мһ ліөкё°лҠ” 8.5분мңјлЎң 짧м•ҳм§Җл§Ң мҙҲкё° N1 мҲҳл©ҙ 진мһ… нӣ„ к°Ғм„ұмқҙ л°ҳліөлҗҳм–ҙ м—°мҶҚ мҲҳл©ҙк№Ңм§Җ м•Ҫ 2мӢңк°„мқҙ мҶҢмҡ”лҗҳм—Ҳмңјл©° мқҙ кё°к°„ лҸҷм•Ҳ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җ мқҳн•ң л°ҳліө мӣҖм§Ғмһ„мқҙ кҙҖм°°лҗҳм—ҲлӢӨ. к·ё кІ°кіј л ҳмҲҳл©ҙ мһ ліөкё°лҠ” 297.5분мңјлЎң нҳ„м ҖнһҲ м§Җм—°лҗҳм–ҙ мһҲм—ҲлӢӨ(Fig.).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Җ apnea-hypopnea index (AHI) 19.4/hлЎң мӨ‘л“ұлҸ„ мҲҳмӨҖмқҙм—Ҳмңјл©° мёЎмҷҖмң„ л°Ҹ м•ҷмҷҖмң„м—җм„ң AHIлҠ” к°Ғк°Ғ 8.3/h, 56.2/hлЎң лҡңл ·н•ң мІҙмң„ мқҳмЎҙм„ұ(positional dependency)мқҙ нҷ•мқёлҗҳм—ҲлӢӨ. м ҖнҳёнқЎмқҙ мЈјлЎң кҙҖм°°лҗҳм—Ҳкі мөңм Җ мӮ°мҶҢнҸ¬нҷ”лҸ„лҠ” 74%к№Ңм§Җ м Җн•ҳлҗҳм—Ҳмңјл©° мӨ‘л“ұлҸ„ мҲҳмӨҖмқҳ мҪ”кіЁмқҙк°Җ нҷ•мқёлҗҳм—ҲлӢӨ. лҳҗн•ң PLMI 54.4/h, PLM arousal index 12.0/hлЎң мӢ¬н•ң PLMSк°Җ лҸҷл°ҳлҗң мҶҢкІ¬мқҙм—ҲлӢӨ.
- м§Ҳл¬ё 4. мқҙ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лҠ”?
- м§Ҳл¬ё 4. мқҙ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лҠ”?
2025л…„ лҜёкөӯмҲҳл©ҙн•ҷнҡҢ(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ASM)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җ л”°лҘҙл©ҙ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л°Ҹ PLMD м№ҳлЈҢмқҳ мІ« лӢЁкі„лҠ” мҰқмғҒмқ„ м•…нҷ”мӢңнӮ¬ мҲҳ мһҲлҠ” мҡ”мқё(м•ҢмҪ”мҳ¬, м№ҙнҺҳмқё, н•ӯнһҲмҠӨнғҖлҜјм ң, м„ёлЎңнҶ лӢҢмһ‘мҡ©м ң, лҸ„нҢҢлҜјкёён•ӯм ң, м№ҳлЈҢлҗҳм§Җ м•ҠмқҖ 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 л“ұ)мқ„ нҷ•мқён•ҳкі м ңкұ°н•ҳлҠ” кІғмқҙлӢӨ[3]. лӘЁл“ мң мқҳн•ң мҰқмғҒмқ„ ліҙмқҙ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ҷҳмһҗм—җм„ңлҠ” нҳҲмІӯ ferritin л°Ҹ TSAT мёЎм •мқҙ к¶ҢмһҘлҗҳл©° ferritin вүӨ75 ng/mL лҳҗлҠ” TSAT <20%мқё кІҪмҡ° кІҪкө¬ лҳҗлҠ” м •мЈј мІ л¶„ м№ҳлЈҢлҘј кі л Өн•ңлӢӨ. лӢЁ ferritin 75-100 ng/mLмқё кІҪмҡ°м—җлҠ” кІҪкө¬ мІ л¶„мқҳ нқЎмҲҳмңЁмқҙ лӮ®м•„ м •мЈј мІ л¶„ м№ҳлЈҢл§Ң к¶ҢмһҘлҗңлӢӨ. мқҙлҠ” нҳҲмӨ‘ ferritin мҲҳм№ҳк°Җ м •мғҒмқҙлҚ”лқјлҸ„ мӨ‘추мӢ кІҪкі„ мІ кІ°н•Қмқҙ мЎҙмһ¬н• мҲҳ мһҲ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ҳ лі‘нғңмғқлҰ¬м—җ кё°л°ҳн•ң кІғмқҙлӢӨ. м •мЈј мІ л¶„м ң мӨ‘м—җм„ңлҠ” ferric carboxymaltoseк°Җ к°•н•ң к¶Ңкі (strong recommendation)м—җ н•ҙлӢ№н•ҳл©° iron sucroseлҠ” нҡЁкіјк°Җ м ңн•ңм Ғмқҙкі л§җкё° мӢ л¶Җм „мқҙ лҸҷл°ҳлҗң нҷҳмһҗм—җм„ң мЎ°кұҙл¶Җ(ferritin <200 ng/mL and TSAT <20%)лЎң мӮ¬мҡ©н• мҲҳ мһҲлӢӨ(Table 1).лҸ„нҢҢлҜјмһ‘мҡ©м ңлҠ” лӢЁкё°м Ғмқё мҰқмғҒ мҷ„нҷ” нҡЁкіјлҠ” лӘ…нҷ•н•ҳм§Җл§Ң мһҘкё° мӮ¬мҡ© мӢң мҰқмғҒ м•…нҷ”(augmentation), м•Ҫл¬ј мӨ‘лӢЁ мӢң л°ҳлҸҷм„ұ м•…нҷ”, 충лҸҷмЎ°м ҲмһҘм• л“ұмқҳ л¶Җмһ‘мҡ© мң„н—ҳмқҙ мһҲм–ҙ 2025л…„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җм„ңлҠ” н‘ңмӨҖм Ғмқё мӮ¬мҡ©мқ„ м§Җм–‘н• кІғ(conditional recommendation against use)мқ„ к¶Ңкі н•ҳкі мһҲлӢӨ. лҢҖмӢ pregabalin, gabapentin л“ұ Оұ2-Оҙ ligand кі„м—ҙ м•Ҫл¬јмқҙ 1м°Ё м№ҳлЈҢм ңлЎң к¶ҢмһҘлҗңлӢӨ. лҸ„нҢҢлҜјмһ‘мҡ©м ңлҠ” мқјмӢңм ҒмңјлЎң н•„мҡ”мӢң м ңн•ңм ҒмңјлЎң мӮ¬мҡ© к°ҖлҠҘн•ҳлӮҳ мҰқмғҒ м•…нҷ”(augmentation) л°Ҹ 충лҸҷмЎ°м ҲмһҘм• мқҳ л°ңмғқ м—¬л¶ҖлҘј м •кё°м ҒмңјлЎң лӘЁлӢҲн„°л§Ғн•ҳкі к°җлҹү л°Ҹ мӨ‘лӢЁ кі„нҡҚмқ„ мӮ¬м „м—җ мҲҳлҰҪн• кІғмқҙ к¶Ңкі лҗңлӢӨ.ліё нҷҳмһҗм—җкІҢлҠ” м№ҙнҺҳмқё м„ӯм·Ё мӨ‘лӢЁмқ„ к¶Ңкі н•ҳкі ferric carboxymaltose 1,000 mg л°Ҹ pregabalin кё°л°ҳ м•Ҫл¬ј м№ҳлЈҢлҘј мӢңмһ‘н•ҳмҳҖлӢӨ. лҳҗн•ң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җ лҢҖн•ҙ мғқнҷңмҠөкҙҖ к°ңм„ көҗмңЎ(к·ңм№ҷм Ғ мҡҙлҸҷ, мІҙмӨ‘ к°җлҹү)кіј н•Ёк»ҳ м–‘м••кё° м№ҳлЈҢлҘј мӢңн–үн•ҳмҳҖлӢӨ.
- нҶ мқҳ
- нҶ мқҳ
ліё мҰқлЎҖ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кіј мқҙм—җ л”°лҘё мҲҳл©ҙ к°ңмӢң л¶Ҳл©ҙмҰқкіј PLMS к·ёлҰ¬кі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ҙ н•Ёк»ҳ кҙҖм°°лҗң мӮ¬лЎҖмқҙлӢӨ.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Җ лӢӨм–‘н•ң л№ҲлҸ„мҷҖ мӨ‘мҰқлҸ„лЎң лӮҳнғҖлӮҳлҠ” к°җк°ҒмҡҙлҸҷм§ҲнҷҳмңјлЎң мЎ°кё° л°ңлі‘кө°(45м„ё мқҙм „)мқҖ лҢҖм№ӯм Ғмқё к°җк°Ғ 분нҸ¬, к°ҖмЎұл Ҙ, мҷ„л§Ңн•ң кІҪкіјк°Җ нҠ№м§•мқё л°ҳл©ҙ ліё мҰқлЎҖмҷҖ к°ҷмқҖ нӣ„кё° л°ңлі‘кө°(45м„ё мқҙнӣ„)мқҖ 비лҢҖм№ӯм Ғмқё к°җк°Ғ 분нҸ¬лӮҳ н•ҳм§Җ мҷё л¶Җмң„ м№ЁлІ”мқҙ нқ”н•ҳкі м§„н–ү мҶҚлҸ„к°Җ л№ лҘҙл©° лҸҷл°ҳ м§Ҳнҷҳмқҳ л№ҲлҸ„к°Җ лҶ’лӢӨ(Table 2) [4,5]. л“ңл¬јкІҢ н•ҳм§Җ мҰқмғҒмқҙ кұ°мқҳ м—Ҷмқҙ нҢ”, лЁёлҰ¬, ліөл¶Җ л“ұ м „мӢ мқҳ лӢӨм–‘н•ң л¶Җмң„м—җм„ң мҰқмғҒмқҙ мӢңмһ‘лҗҳкё°лҸ„ н•ҳлҜҖлЎң мқҳмӢ¬ нҷҳмһҗм—җ лҢҖн•ҙм„ңлҠ” көӯм ң 진лӢЁ кё°мӨҖм—җ л”°лҘё нҸүк°ҖмҷҖ м№ҳлЈҢ кІ°м •мқҙ мӨ‘мҡ”н•ҳлӢӨ[6,7].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ҷҳмһҗмқҳ 60-70%лҠ” мһ…л©ҙ кіӨлһҖ л°Ҹ л°ҳліөм Ғ к°Ғм„ұкіј к°ҷмқҖ мҲҳл©ҙмһҘм• лҘј кІҪн—ҳн•ҳл©° к°җк°Ғ мҰқмғҒліҙлӢӨ л¶Ҳл©ҙ мһҗмІҙлҘј лҚ” л¶ҲнҺён•ҳкІҢ мқёмӢқн•ҳлҠ” кІҪмҡ°к°Җ л§ҺлӢӨ[4]. м „мІҙ л¶Ҳл©ҙмҰқ нҷҳмһҗмқҳ м•Ҫ 10%к°Җ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 лҸҷл°ҳн•ҳлҜҖлЎң л¶Ҳл©ҙмқ„ мЈјмҶҢлЎң лӮҙмӣҗн•ң кІҪмҡ° мқҙм—җ лҢҖн•ң нҸүк°Җк°Җ н•„мҲҳм ҒмқҙлӢӨ.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җм„ң лӮҳнғҖлӮҳлҠ” л¶Ҳл©ҙмқҖ мқјл°ҳм Ғмқё мҲҳл©ҙм ңм—җ л°ҳмқ‘мқҙ м Ғкұ°лӮҳ к°җк°Ғ мҰқмғҒмқҙ нҳём „лҗң мқҙнӣ„м—җлҸ„ м§ҖмҶҚлҗ мҲҳ мһҲлӢӨ. лҢҖл¶Җ분 мЈјк°„мЎёлҰјмқҖ лҡңл ·н•ҳм§Җ м•Ҡм§Җл§Ң н”јлЎң, 집мӨ‘л Ҙ м Җн•ҳ, мҡ°мҡёк°җ л“ұмқҙ лӮҳнғҖлӮ мҲҳ мһҲмңјл©° мЈјк°„мЎёлҰјмқҙ мӢ¬н• кІҪмҡ°м—җлҠ”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мқҙлӮҳ мӨ‘추과лӢӨмҲҳл©ҙмһҘм• л“ұ лӢӨлҘё мҲҳл©ҙмһҘм• мҷҖмқҳ к°җлі„мқҙ н•„мҡ”н•ҳлӢӨ. PLMSлҠ”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ҷҳмһҗмқҳ м•Ҫ 80% мқҙмғҒм—җм„ң лҸҷл°ҳлҗҳл©° н”јм§Ҳ к°Ғм„ұ, мӢ¬л°•мҲҳ л°Ҹ нҳҲм•• ліҖнҷ”лҘј мң л°ңн• мҲҳ мһҲлӢӨ[1]. к·ёлҹ¬лӮҳ мқҙлҹ¬н•ң мғқлҰ¬ ліҖнҷ”к°Җ мҲҳл©ҙмһҘм• лӮҳ мӢ¬нҳҲкҙҖ мң„н—ҳм—җ лҜём№ҳлҠ” мҳҒн–ҘмқҖ м•„м§Ғ лӘ…нҷ•нһҲ к·ңлӘ…лҗҳм§Җ м•Ҡм•ҳлӢӨ.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кіј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Җ к°Ғк°Ғ мқёкө¬мқҳ м•Ҫ 9-38%, 5-15%м—җм„ң лӮҳнғҖлӮҳлҠ” нқ”н•ң мҲҳл©ҙ м§Ҳнҷҳмқҙл©°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 нҷҳмһҗмқҳ мөңлҢҖ 36%м—җм„ң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ҙ лҸҷл°ҳлҗ мҲҳ мһҲлӢӨ[8]. л‘җ м§Ҳнҷҳмқҙ н•Ёк»ҳ мЎҙмһ¬н• кІҪмҡ° мҲҳл©ҙмқҳ лӢЁнҺёнҷ”лҘј мӢ¬нҷ”мӢңнӮӨкі мӢ¬нҳҲкҙҖкі„ мң„н—ҳмқ„ мҰқк°ҖмӢңнӮ¬ мҲҳ мһҲлӢӨ[9]. лҳҗн•ң PLMSлҠ” 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 нҷҳмһҗмқҳ мөңлҢҖ 50%м—җм„ң лҸҷл°ҳлҗҳл©° мҲҳл©ҙ лӢЁм Ҳкіј к°Ғм„ұмқ„ мң л°ңн•ҳм—¬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мҰқмғҒмқ„ лҚ”мҡұ м•…нҷ”мӢңнӮ¬ мҲҳ мһҲлӢӨ. м–‘м••кё° м№ҳлЈҢлҠ” мҲҳл©ҙмқҳ м—°мҶҚм„ұмқ„ нҡҢліөмӢңмјң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мҰқмғҒ л°Ҹ PLMSлҘј мҷ„нҷ”н•ҳлҠ” лҚ° нҡЁкіјм ҒмқҙлҜҖлЎң л‘җ м§Ҳнҷҳмқҙ лҸҷл°ҳлҗң кІҪмҡ° мҡ°м„ м ҒмңјлЎң кі л Өн•ҙм•ј н•ҳл©° м•Ҫл¬ј мӮ¬мҡ©мқ„ мӨ„мқҙкі мҲҳл©ҙмқҳ м§Ҳмқ„ н–ҘмғҒмӢңнӮӨлҠ” лҚ° лҸ„мӣҖмқҙ лҗңлӢӨ[8].ліё мҰқлЎҖм—җм„ңлҠ” мһ…л©ҙмһҘм• мҷ„нҷ”лҘј мң„н•ҳм—¬ лЁјм Җ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җ лҢҖн•ң м•Ҫл¬ј м№ҳлЈҢлҘј мӢңн–үн•ҳмҳҖкі мҰқмғҒ мҷ„нҷ” нӣ„ мҲҳл©ҙлӢӨмӣҗ кІҖмӮ¬ кІ°кіјм—җ л”°лқј м–‘м••кё° м№ҳлЈҢлҘј лҸ„мһ…н•ҳмҳҖлӢӨ. к·ёлҹ¬лӮҳ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м№ҳлЈҢл§ҢмңјлЎң л¶Ҳл©ҙ мҰқмғҒмқҙ 충분нһҲ нҳём „лҗҳм§Җ м•ҠлҠ” кІҪмҡ° л¶Ҳл©ҙмҰқкіј мҲҳл©ҙл¬ҙнҳёнқЎмҰқмқҙ н•Ёк»ҳ мЎҙмһ¬н•ҳлҠ” ліөн•©мһҘм• (comorbid insomnia and sleep apnea, COMISA)мқҳ к°ҖлҠҘм„ұмқ„ кі л Өн• н•„мҡ”к°Җ мһҲлӢӨ. мқҙ кІҪмҡ° л¶Ҳл©ҙ мҰқмғҒмңјлЎң мқён•ҳм—¬ м–‘м••кё° м Ғмқ‘мқҙ м–ҙл Өмҡё мҲҳ мһҲмңјлҜҖлЎң мқём§Җ н–үлҸҷ м№ҳлЈҢлҘј нҸ¬н•Ён•ң л¶Ҳл©ҙмҰқ м№ҳлЈҢлҘј м„ н–үн•ҳкұ°лӮҳ лі‘н–үн•ҳлҠ” кІғмқҙ м–‘м••кё° мҲңмқ‘лҸ„лҘј лҶ’мқҙлҠ” лҚ° лҸ„мӣҖмқҙ лҗңлӢӨ.
- KEY POINTS
- KEY POINTS
1.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кіј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Җ к°Ғк°Ғ нқ”н•ң мҲҳл©ҙ м§ҲнҷҳмңјлЎң л‘җ м§Ҳнҷҳмқҙ н•Ёк»ҳ мЎҙмһ¬н• кІҪмҡ° мҲҳл©ҙмқҳ лӢЁнҺёнҷ”лҘј мӢ¬нҷ”мӢңнӮӨкі мӢ¬нҳҲкҙҖкі„ мң„н—ҳмқ„ лҶ’мқј мҲҳ мһҲм–ҙ м Ғк·№м Ғмқё м„ лі„кіј лҸҷмӢңм—җ м№ҳлЈҢк°Җ мӨ‘мҡ”н•ҳлӢӨ.2.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진лӢЁ мӢңм—җлҠ” м•…нҷ” мҡ”мқё м ңкұ° нӣ„ мӨ‘추мӢ кІҪкі„ мІ кІ°н•Қ к°ҖлҠҘм„ұмқ„ нҸүк°Җн•ҳкі кІ°кіјм—җ л”°лқј мІ л¶„ м№ҳлЈҢлҘј кі л Өн•ҙм•ј н•ңлӢӨ. мөңк·ј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җм„ңлҠ” лҸ„нҢҢлҜј мһ‘мҡ©м ңмқҳ мһҘкё° мӮ¬мҡ©м—җ л”°лҘё мҰқмғҒ м•…нҷ” (augmentation) л°Ҹ 충лҸҷмЎ°м ҲмһҘм• л“ұмқҳ мҡ°л ӨлЎң Оұ2-Оҙ ligand кі„м—ҙ м•Ҫл¬јмқҙ мқјм°Ё м№ҳлЈҢм ңлЎң к¶Ңкі лҗҳкі мһҲлӢӨ.3.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 нҷҳмһҗм—җм„ң нҸҗмҮ„мҲҳл©ҙл¬ҙнҳёнқЎмқҙ лҸҷл°ҳлҗң кІҪмҡ° м§ҖмҶҚ м–‘м•• нҳёнқЎкё° м№ҳлЈҢлҠ” мҲҳл©ҙ м—°мҶҚм„ұмқ„ нҡҢліөмӢңнӮӨкі мҲҳл©ҙ мӨ‘ мЈјкё°мӮ¬м§ҖмҡҙлҸҷмқ„ мӨ„м—¬ н•ҳм§Җл¶Ҳм•ҲмҰқнӣ„кө°мқҳ мҰқмғҒ к°ңм„ кіј м•Ҫл¬ј мӮ¬мҡ©лҹү к°җмҶҢм—җ кё°м—¬н• мҲҳ мһҲлӢӨ.
TableВ 1.
Summary of recommended interventions in adult populationsa
TableВ 2.
Frequent comorbid conditions associated with RLS/PLMS
Reproduced from Manconi et al. [4]
RLS; restless legs syndrome, PLMS; periodic limb movements during sleep, ESRD; end-stage renal disease, REM; rapid eye movement.
- REFERENCES
- REFERENCES
- 1. Allen RP, Picchietti DL, Garcia-Borreguero D, Ondo WG, Walters AS, Winkelman JW, et al. Restless legs syndrome/Willis-Ekbom disease diagnostic criteria: updated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 (IRLSSG) consensus criteria - history, rationale, description, and significance. Sleep Med 2014;15:860-873.
[Article] [PubMed]2. Sateia MJ.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 third edition. Chest 2014;146:1387-1394.
[Article] [PubMed]3. Winkelman JW, Berkowski JA, DelRosso LM, Koo BB, Scharf MT, Sharon D, et al. Treatment of restless legs syndrome and 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an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Sleep Med 2025;21:137-152.
[Article] [PubMed]4. Manconi M, Garcia-Borreguero D, Schormair B, Videnovic A, Berger K, Ferri R, et al. Restless legs syndrome. Nat Rev Dis Primers 2021;7:80.
[Article] [PubMed]5. Koo YS, Lee GT, Lee SY, Cho YW, Jung KY. Topography of sensory symptoms in patients with drug-naГҜve restless legs syndrome. Sleep Med 2013;14:1369-1374.
[Article] [PubMed]6. Karroum EG, Leu-Semenescu S, Arnulf I. Topography of the sensations in primary restless legs syndrome. J Neurol Sci 2012;320:26-31.
[Article] [PubMed]7. Turrini A, Raggi A, Calandra-Buonaura G, Martinelli P, Ferri R, Provini F. Not only limbs in atypical restless legs syndrome. Sleep Med Rev 2018;38:50-55.
[Article] [Pub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