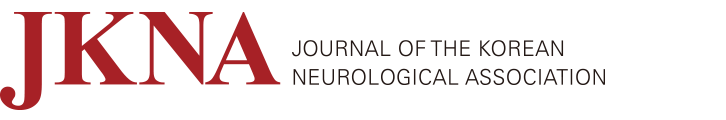Reconstructing Neurology Residency Training Program for Essential Medical Discipline: Strategic Directions and Future Challenges
- Hyung-Soo Lee, MD, PhD*, Chi Kyung Kim, MD, PhDa,*, Kyung Min Kim, MD, PhDb, Young Seo Kim, MD, PhDc, Yeshin Kim, MDd, Jae-Myung Kim, MD, PhDe, Jun-Soon Kim, MDf, Hyeyun Kim, MD, PhDg, Hong-Kyun Park, MDh, Jong Seok Bae, MD, PhDi, Jung Im Seok, MDj, Suk-Won Ahn, MDk, Seong-il Oh, MD, PhDl, Eungseok Oh, MD, PhDm, Sang Hak Lee, MDn, Woong-Woo Lee, MDo, Jung Hwan Lee, MD, PhDp, Yoonkyung Chang, MD, PhDq, Jin-Heon Jeong, MDr, Soohyun Cho, MD, PhDs, Ki-Hwan Ji, MDt, Kyomin Choi, MD, PhDu, Jae Hwan Choi, MD, PhDv, Hojin Choi, MD, PhDw, Jeeyoung Oh, MD, PhDu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мһ¬кө¬м„ұкіј кіјм ң
- мқҙнҳ•мҲҳ*, к№Җм№ҳкІҪa,*, к№ҖкІҪлҜјb, к№ҖмҳҒм„ңc, к№ҖмҳҲмӢ d, к№Җмһ¬лӘ…e, к№ҖмӨҖмҲңf, к№ҖнҳңмңӨg, л°•нҷҚк· h, л°°мў…м„қi, м„қм •мһ„j, м•Ҳм„қмӣҗk, мҳӨм„ұмқјl, мҳӨмқ‘м„қm, мқҙмғҒн•ҷn, мқҙмӣ…мҡ°o, мқҙм •нҷҳp, мһҘмңӨкІҪq, м •м§„н—Ңr, мЎ°мҲҳнҳ„s, м§Җкё°нҷҳt, мөңкөҗлҜјu, мөңмһ¬нҷҳv, мөңнҳём§„w, мҳӨм§ҖмҳҒu
- Received June 27, 2025; В В В Revised July 16, 2025; В В В Accepted July 21, 2025;
2024л…„ 8мӣ” лҢҖнҶөл № м§ҒмҶҚ мқҳлЈҢк°ңнҳҒнҠ№лі„мң„мӣҗнҡҢлҠ” мқҳлЈҢк°ңнҳҒ 1м°Ё мӢӨн–ү л°©м•ҲмңјлЎң мӢ кІҪкіјлҘј нҸ¬н•Ён•ң лӮҙкіј, мҷёкіј, мӮ°л¶Җмқёкіј, мҶҢм•„мІӯмҶҢл…„кіј, мқ‘кёүмқҳн•ҷкіј, нқүл¶Җмҷёкіј, мӢ кІҪмҷёкіјлҘј 8к°ңмқҳ н•„мҲҳ 진лЈҢкіјлЎң м„ м •н•ҳмҳҖлӢӨ[1]. мқҙм–ҙ лӢӨмқҢлӢ¬ ліҙкұҙліөм§Җл¶ҖлҠ” м „кіөмқҳ мҲҳл Ё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мқ„ м—°мҶҚн•ҙм„ң л°ңн‘ңн•ЁмңјлЎңмҚЁ н•„мҲҳ 진лЈҢкіјмқҳ м—ӯлҹү мһҲлҠ” м „л¬ёмқҳ м–‘м„ұмқ„ мң„н•ң мҲҳл Ё мІҙкі„мқҳ мһ¬м •л№„лҘј мӢңкёүн•ң кіјм ңлЎң л¶Җк°ҒмӢңмј°лӢӨ[2].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Ҳҳл Ёмң„мӣҗнҡҢм—җм„ңлҠ” мқҙлҜё 2018л…„ м—ӯлҹү мӨ‘мӢ¬мқҳ м „кіөмқҳ көҗмңЎкіј нҸүк°ҖлҘј мң„н•ҳм—¬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 м ңлҸ„лҘј мӢ м„Өн•ҳкі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к°Җ м „л¬ёмқҳ к°җлҸ… м—Ҷмқҙ нҠ№м • мӨ‘мҡ” мһ„мғҒ м—…л¬ҙлҘј мҲҳн–үн• мҲҳ мһҲлҠ” кё°ліё м—ӯлҹү 13к°ң н•ӯлӘ©мқ„ к·ңм •н•ң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мқҳ мӢ лў°н• л§Ңн•ң м „л¬ё нҷңлҸҷмқё Korean NeurologistвҖҷs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13 (K-NEPA 13)мқ„ кё°л°ҳмңјлЎң мҲҳл Ё м§Җм№Ём„ңлҘј к°ңнҺён•ҳмҳҖмңјл©° мқҙлҘј м „мһҗ нҸ¬нҠёнҸҙлҰ¬мҳӨ(e-portfolio) мӢңмҠӨн…ңм—җ л°ҳмҳҒн•ҳм—¬ м „кіөмқҳмҷҖ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 нҷңлҸҷмқ„ лӘЁлӢҲн„°л§Ғн•ҙ мҷ”лӢӨ(Table) [3,4].
2024л…„ 8мӣ” мқҳлЈҢк°ңнҳҒ 1м°Ё мӢӨн–ү л°©м•Ҳмқҳ нӣ„мҶҚ кіјм •мңјлЎң 2025л…„ 4мӣ” л…јмқҳлҗ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мқҖ мҙқ 2,788м–ө мӣҗмқҳ көӯк°Җ мһ¬мӣҗмқҙ нҲ¬мһ…лҗҳлҠ” лҢҖк·ңлӘЁ м •мұ… мӮ¬м—…мңјлЎң 비лЎқ н•„мҲҳкіјлӘ©м—җ көӯн•ңлҗң м§Җмӣҗмқҙкё°лҠ” н•ҳлӮҳ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м§Ҳм Ғ н–ҘмғҒкіј көҗмңЎ нҷҳкІҪ к°ңм„ мқ„ мң„н•ҳм—¬ көӯк°Җк°Җ мІҳмқҢмңјлЎң м§Ғм ‘ к°ңмһ…н•ҳмҳҖлӢӨлҠ” м җм—җм„ң н–Ҙн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җ мһҲм–ҙ мӨ‘мҡ”н•ң ліҖкіЎм җмқҙ лҗ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5]. мқҙм—җ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Ҳҳл Ёмң„мӣҗнҡҢлҠ” м§ҖлӮң 1мӣ” мӣҢнҒ¬мҲҚмқ„ нҶөн•ҙ нҳ„мһ¬к№Ңм§Җмқҳ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 лҸҢмқҙмјң ліҙкі н–Ҙнӣ„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 к°ңм„ л°©м•Ҳкіј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мқ„ мӨ‘мӢ¬мңјлЎң н•ң көҗмңЎ мІҙкі„ к°ңнҺёмқҳ н•„мҡ”м„ұм—җ лҢҖн•ҙ л…јмқҳн•ҳмҳҖлӢӨ. ліё л…јл¬ёмқҖ мӣҢнҒ¬мҲҚм—җм„ң лӮҳлҲҲ мқҳкІ¬мқ„ м •лҰ¬н•ң кІғмңјлЎң кёүліҖн•ҳлҠ” мҲҳл Ё нҷҳкІҪ ліҖнҷ”м—җ л”°лқј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көҗмңЎмқҖ м–ҙл–Ө м§Җн–Ҙм җмқ„ к°Җм ём•ј н• кІғмқёк°Җм—җ лҢҖн•ң нҷ”л‘җлҘј лҚҳм§Җкі мһҗ н•ңлӢӨ.
- 1.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Ӣ кІҪкіјмқҳ м—ӯн• кіј мӨ‘мҡ”м„ұ
- 1.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Ӣ кІҪкіјмқҳ м—ӯн• кіј мӨ‘мҡ”м„ұ
- 1) н•„мҲҳмқҳлЈҢлһҖ?
- 1) н•„мҲҳмқҳлЈҢлһҖ?
н•„мҲҳмқҳлЈҢм—җ лҢҖн•ң лӘ…нҷ•н•ҳкі кө¬мІҙм Ғмқё к°ңл…җмқҖ м•„м§Ғк№Ңм§Җ м—ҶлӢӨ[6]. 2021л…„ лҢҖн•ңмқҳмӮ¬нҳ‘нҡҢк°Җ к°„н–үн•ң вҖҳн•„мҲҳмқҳлЈҢ мӨ‘мӢ¬мқҳ кұҙк°•ліҙн—ҳ м Ғмҡ©кіј к°ңм„ л°©м•ҲвҖҷм—җм„ңлҠ” н•„мҲҳмқҳлЈҢлҘј 진лЈҢк°Җ м§Җм—°лҗ кІҪмҡ° нҷҳмһҗмқҳ мғқлӘ…кіј кұҙк°•м—җ нҒ° мҳҒн–Ҙмқ„ лҜём№ҳлҠ” мҳҒм—ӯмңјлЎң м§Җм—ӯкіј мӢңк°„м—җ кҙҖкі„м—Ҷмқҙ нҳ•нҸүм„ұ мһҲкІҢ м ңкіөлҗҳм–ҙм•ј н•ҳлҠ” мқҳлЈҢлЎң м •мқҳн•ҳм—¬ көӯлҜјмқҳ мғқлӘ… ліҙмһҘк¶Ңм—җ м§Ғм ‘ мҳҒн–Ҙмқ„ лҜём№ҳлҠ” мқ‘кёү 진лЈҢл“Өмқ„ н•„мҲҳ 진лЈҢлЎң к·ңм •н•ң л°” мһҲмңјлӮҳ кө¬мІҙм Ғмқё м§ҲнҷҳмқҙлӮҳ кҙҖл Ё 진лЈҢкіјлҠ” лӘ…мӢңлҗҳм§Җ м•Ҡм•ҳлӢӨ[7]. 2023л…„ 1мӣ” ліҙкұҙліөм§Җл¶Җк°Җ л°ңн‘ңн•ң вҖҳн•„мҲҳмқҳлЈҢ м§ҖмӣҗлҢҖмұ…вҖҷ м—ӯмӢң н•„мҲҳмқҳлЈҢм—җ лҢҖн•ң лӘ…нҷ•н•ң м •мқҳлҘј лӮҙлҶ“м§ҖлҠ” м•Ҡм•ҳмңјлӮҳ көӯлҜјмқҳ мғқлӘ…мқ„ мӮҙлҰ¬кі м „ көӯлҜјмқҙ м–ём ң м–ҙл””м„ңл“ кіЁл“ нғҖмһ„(golden time) лӮҙ мӨ‘мҰқ л°Ҹ мқ‘кёү 진лЈҢлҘј м ңкіөл°ӣлҠ” кІғмқ„ лӘ©н‘ңлЎң м ңмӢңн•ҳл©ҙм„ң 3мӢңк°„ кіЁл“ нғҖмһ„мқҳ н—ҲнҳҲлҮҢмЎёмӨ‘мқ„ м–ёкёүн•ҳл©° мқҙм—җ лҢҖн•ң м§Җмӣҗмқ„ к°ҖмӢңнҷ”н•ҳмҳҖлӢӨ[8]. 2024л…„ 2мӣ” л°ңн‘ңлҗң вҖҳн•„мҲҳмқҳлЈҢ м •мұ… нҢЁнӮӨм§ҖвҖҷм—җм„ң 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қҙ мӨ‘мҰқ мқ‘кёүмқҳ н•„мҲҳмқҳлЈҢмҳҒм—ӯмңјлЎң 분лҘҳлҗҳм—Ҳкі 2024л…„ 8мӣ” лҢҖнҶөл № м§ҒмҶҚ мқҳлЈҢк°ңнҳҒнҠ№лі„мң„мӣҗнҡҢм—җм„ң л°ңн‘ңн•ң вҖҳмқҳлЈҢк°ңнҳҒ 1м°Ё мӢӨн–ү л°©м•ҲвҖҷм—җм„ң мӢ кІҪкіјмҷҖ н•Ёк»ҳ лӮҙкіј, мҷёкіј, мӮ°л¶Җмқёкіј, мҶҢм•„мІӯмҶҢл…„кіј, мқ‘кёүмқҳн•ҷкіј, нқүл¶Җмҷёкіј, мӢ кІҪмҷёкіјлҘј 8к°ң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 м„ м •н•ҳкі м „л¬ёмқҳ лҢҖмғҒ кі„м•Ҫнҳ• н•„мҲҳ мқҳмӮ¬м ңмҷҖ м „кіөмқҳ мІҳмҡ° к°ңм„ л“ұмқҳ лӮҙмҡ©мқ„ нҸ¬н•Ён•ң м§Җмӣҗмұ…мқ„ л°ңн‘ңн•ҳмҳҖлӢӨ[1,9].- 2)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Ӣ кІҪкіјмқҳ м—ӯн•
- 2) н•„мҲҳмқҳлЈҢлЎңм„ң мӢ кІҪкіјмқҳ м—ӯн•
мӢ кІҪкіјлҠ” лҮҢ, мІҷмҲҳ, л§җмҙҲмӢ кІҪ л°Ҹ к·јмңЎм—җ л°ңмғқн•ң м§Ҳлі‘мқ„ кҙ‘лІ”мң„н•ҳкІҢ лӢӨлЈЁлҠ” м „л¬ё 분야мқҙл©° л§ҺмқҖ нҷҳмһҗл“Өмқҙ мӢ кІҪкі„ мҰқмғҒмңјлЎң мқ‘кёүмӢӨмқ„ м°ҫлҠ”лӢӨ. лҜёкөӯм—җм„ңлҠ” мқ‘кёүмӢӨмқ„ м°ҫлҠ” нҷҳмһҗмқҳ 2.2-8.4%к°Җ мӢ кІҪкі„ мқҙмғҒ мҰқмғҒмқҙм—Ҳкі [10-12] мҳҒкөӯмқҳ н•ң м—°кө¬м—җм„ңлҠ” мқ‘кёүмӢӨ л°©л¬ё нҷҳмһҗмқҳ 10%к°Җ мөңмҶҢ н•ҳлӮҳмқҳ мӢ кІҪн•ҷм Ғ мқҙмғҒ мҰқмғҒмқ„ нҳёмҶҢн•ҳмҳҖлӢӨкі ліҙкі н•ҳмҳҖлӢӨ[13]. мҡ°лҰ¬лӮҳлқјм—җм„ңлҠ” мқ‘кёүмӢӨ мқҙмҶЎ нҷҳмһҗ мӨ‘ 8.2%к°Җ мӢ кІҪкіј 진лЈҢлҘј л°ӣмқҖ кІғмңјлЎң ліҙкі лҗҳм—ҲлӢӨ[14]. мқ‘кёүмӢӨмқ„ м°ҫмқҖ мӢ кІҪкіј нҷҳмһҗмқҳ 10-11%лҠ” мӨ‘мҰқ мӢ кІҪкі„м§ҲнҷҳмңјлЎң к°ҖмһҘ нқ”н•ң 진лӢЁмқҖ 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қҙл©° к·ё мҷё лҮҢм „мҰқл°ңмһ‘, мқҳмӢқмһҘм• л“ұмқҙм—ҲлӢӨ[12,14-16].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ҮҢм „мҰқл°ңмһ‘, мқҳмӢқмһҘм• лҠ” лӘЁл‘җ мӢ кІҪн•ҷм Ғ мқ‘кёү мғҒнҷ©мқҙл©° нҠ№нһҲ мҙҲкёүм„ұ лҮҢкІҪмғү, лҮҢм „мҰқмӨ‘мІ©мҰқ, м„ёк· мҲҳл§үм—ј л“ұмқҖ мҶҢмң„ кіЁл“ нғҖмһ„мқ„ лҶ“м№ кІҪмҡ° лҸҢмқҙнӮ¬ мҲҳ м—ҶлҠ” нӣ„мң мҰқмқ„ мҙҲлһҳн•ҳкұ°лӮҳ мӮ¬л§қм—җ мқҙлҘј мҲҳ мһҲлҠ” мӨ‘мҰқ мқ‘кёү м§ҲнҷҳмқҙлӢӨ. л°ңлі‘ нӣ„ мӢ мҶҚн•ң лҢҖмқ‘мқҙ нҷҳмһҗмқҳ мҳҲнӣ„лҘј кІ°м •м§“лҠ” мӨ‘мҡ”н•ң мҡ”мқёмқҙл©°[17-19]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 •нҷ•н•ң 진лӢЁкіј мӢ мҶҚн•ң м№ҳлЈҢк°Җ нҷҳмһҗмқҳ мғқмЎҙкіј мҳҲнӣ„м—җ к°ҖмһҘ нҒ° мҳҒн–Ҙмқ„ лҜём№ҳлҠ” мқёмһҗлЎң кјҪнһҲлҠ” л§ҢнҒј[20,21]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мқҳ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лҹүмқҖ көӯлҜјмқҳ мғқлӘ…к¶Ңкіј кіөкіөліҙкұҙм—җ м§Ғм ‘м ҒмңјлЎң мҳҒн–Ҙмқ„ лҜём№ңлӢӨ. л”°лқјм„ң мӢ кІҪкіј м „л¬ё 진лЈҢ мІҙкі„мқҳ кө¬м¶•мқҖ н•„мҲҳм ҒмқҙлӢӨ.
- 2.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ҳ ліҖнҷ”
- 2.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ҳ ліҖнҷ”
- 1)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ліҖнҷ”
- 1)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ліҖнҷ”
2024л…„л¶Җн„°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Җ кёүмҶҚнһҲ ліҖнҷ”н•ҳкі мһҲмңјл©° ліҙкұҙліөм§Җл¶Җк°Җ л°ңн‘ңн•ң вҖҳмқҳлЈҢк°ңнҳҒ 1м°Ё мӢӨн–ү л°©м•ҲвҖҷм—җм„ң м—ӯмӢ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ҳҒмӢ мқҙ 4лҢҖ мҡ°м„ кіјм ң мӨ‘ н•ҳлӮҳлЎң лӘ…мӢңлҗҳм—ҲлӢӨ[1]. м–‘м Ғмқё мёЎл©ҙм—җм„ңлҠ” 2016л…„ м ңм •лҗҳм—ҲлҚҳ гҖҢм „кіөмқҳмқҳ мҲҳл ЁнҷҳкІҪ к°ңм„ л°Ҹ м§Җмң„ н–ҘмғҒмқ„ мң„н•ң лІ•лҘ гҖҚмқҙ 2024л…„ 2мӣ” к°ңм •лҗҳм–ҙ 2026л…„л¶Җн„° м „кіөмқҳмқҳ к·јл¬ҙ мӢңк°„мқҙ мЈјлӢ№ 72мӢңк°„ мқҙлӮҙ, м—°мҶҚ 24мӢңк°„ мқҙлӮҙлЎң 축мҶҢлҗҳм—Ҳмңјл©° 2025л…„ 4мӣ” кё°мӨҖ м „көӯ 42к°ң мҲҳл Ёлі‘мӣҗм—җм„ң мӢңлІ”мӮ¬м—… мӨ‘мқҙлӢӨ[22]. м§Ҳм Ғмқё мёЎл©ҙм—җм„ңлҠ” 2024л…„ 2мӣ”л¶Җн„° мқҙм–ҙ진 мқҳм • мӮ¬нғң мқҙнӣ„ м „кіөмқҳмқҳ н”јкөҗмңЎмһҗ мӢ 분м—җ лҢҖн•ң мқёмӢқ к°ңм„ кіј лҚ”л¶Ҳм–ҙ м „кіөмқҳ м—ӯлҹү к°•нҷ”мҷҖ мҲҳл Ё лӮҙмӢӨнҷ”мқҳ н•„мҡ”м„ұмқҙ л¶Җк°Ғлҗҳм—Ҳкі мқҙм—җ лҢҖн•ң көӯк°Җ м°Ёмӣҗмқҳ м •мұ… л§Ҳл Ёкіј мһ¬м • м§Җмӣҗмқҙ мҡ”кө¬лҗҳм—ҲлӢӨ.мҲҳл Ё нҷҳкІҪмқҳ ліҖнҷ”лҠ” м ңлҸ„лҝҗ м•„лӢҲлқј м§ҖлҸ„м „л¬ёмқҳмҷҖ м „кіөмқҳ к°„мқҳ кҙҖкі„м—җлҸ„ мҳҒн–Ҙмқ„ лҜём№ҳкі мһҲлӢӨ. мқҙлІҲ мқҳм • мӮ¬нғңлҘј нҶөн•ҙ м „кіөмқҳлҠ” лҚ” мқҙмғҒ мҲҳлҸҷм Ғ көҗмңЎ лҢҖмғҒмқҙ м•„лӢҲлқј мқҳлЈҢмқёмқҳ м •мІҙм„ұмқ„ мҠӨмҠӨлЎң нҷ•лҰҪн•ҳкі кіөлҸҷмқҳ лӘ©н‘ңлҘј мӢӨнҳ„н•ҳлҠ” лҠҘлҸҷм Ғ мЈјмІҙлЎң ліҖнҷ”н•ҳкі мһҲлӢӨ. лҢҖн•ңм „кіөмқҳнҳ‘мқҳнҡҢ 비мғҒлҢҖмұ…мң„мӣҗнҡҢк°Җ м ңмӢңн•ҳмҳҖлҚҳ м„ұлӘ…м„ңм—җлҠ” м „кіөмқҳ мқҳмЎҙлҸ„лҘј лӮ®м¶”кё° мң„н•ҳм—¬ мҲҳл Ёлі‘мӣҗмқҳ м „л¬ёмқҳ мқёл Ҙ мұ„мҡ©мқ„ нҷ•лҢҖн•ҳкі м—ҙм•…н•ң мҲҳл Ё нҷҳкІҪмқ„ к°ңм„ н•ҙ лӢ¬лқјлҠ” мҡ”кө¬к°Җ нҸ¬н•Ёлҗҳм–ҙ мһҲлӢӨ[23]. кё°мЎҙмқҳ м§ҖлҸ„м „л¬ёмқҳк°Җ мқҙлҹ° к°ңмқё м •мІҙм„ұ мӨ‘мӢ¬ мӮ¬кі мҷҖ кіөм •м„ұм—җ лҢҖн•ң лҜјк°җн•Ёмқ„ нҠ№м§•мңјлЎң н•ҳлҠ” нҳ„мһ¬ м „кіөмқҳ м„ёлҢҖм—җкІҢ вҖҳмҳҲм „м—җлҠ”вҖҷ, вҖҳлӮҳ л•ҢлҠ”вҖҷ л“ұмқҳ мғқк°ҒмңјлЎң м ‘к·јн•ңлӢӨл©ҙ мҶҢнҶөмқҖ лӢЁм Ҳлҗҳкі мӢ лў°лҠ” кё°лҢҖн• мҲҳ м—Ҷ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 н•ңнҺё нҳ„мһ¬мқҳ мҲҳл Ё мқён”„лқјлҘј кі л Өн•ҳм§Җ м•ҠмқҖ мқјл¶Җ м „кіөмқҳмқҳ мҡ”кө¬мҷҖ л¶ҲлӘ…нҷ•н•ң м „л¬ёк°„нҳёмӮ¬мқҳ м—…л¬ҙ мҳҒм—ӯ м—ӯмӢң мғҲлЎңмҡҙ к°Ҳл“ұмқҳ л¶Ҳм”Ёк°Җ лҗ мЎ°м§җмқҙ мһҲкё° л•Ңл¬ём—җ лӘЁл‘җмқҳ м§ҖнҳңмҷҖ мҲҷмқҳк°Җ н•„мҡ”н•ң мӢңм җмқҙкё°лҸ„ н•ҳлӢӨ.- 2)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
- 2)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
2024л…„ 10мӣ” ліҙкұҙліөм§Җл¶ҖлҠ” н•„мҲҳ진лЈҢкіј м§Җмӣҗкіј мҲҳл Ё нҷҳкІҪ к°ңм„ мқ„ мң„н•ң кө¬мІҙм Ғмқё лҢҖмұ…мңјлЎң вҖҳ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вҖҷмқ„ л°ңн‘ңн•ҳмҳҖлӢӨ. мқҙ мӮ¬м—…мқҖ мҙқ 6к°ңмқҳ м„ёл¶ҖмӮ¬м—…мқ„ нҸ¬н•Ён•ҳкі мһҲлҠ”лҚ° м§ҖлҸ„м „л¬ёмқҳлҘј лҢҖмғҒмңјлЎң н•ң нҷңлҸҷ мІҙкі„нҷ” л°Ҹ мҲҳлӢ№ м§Җмӣҗ, мҲҳл Ё көҗмңЎ мҡҙмҳҒкіј мҲҳл Ё мӢңм„Ө к°ңм„ мқ„ мң„н•ң мҲҳл Ёлі‘мӣҗ м§Җмӣҗ, м „кіөмқҳ көҗмңЎ мҡҙмҳҒ н”„лЎңк·ёлһЁ к°ңл°ң л°Ҹ нҸүк°ҖлҘј мң„н•ң м „л¬ён•ҷнҡҢ м§Җмӣҗ, мҲ кё° көҗмңЎмқ„ мң„н•ң м „кіөмқҳ м§Ғм ‘ м§Җмӣҗ(мҷёкіјкі„) л“ұмқҙ мЈјмҡ” лӮҙмҡ©мқҙлӢӨ[1,24].м „кіө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мқҖ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н•өмӢ¬ мЈјмІҙлЎңм„ң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мқ„ к°•мЎ°н•ҳл©ҙм„ң мҲҳл Ёмқҳ н•өмӢ¬ м—ӯн• мқҙ к°Ғ лі‘мӣҗ м§ҖлҸ„м „л¬ёмқҳм—җ мһҲлӢӨкі лӘ…мӢңн•ҳмҳҖкі мӢӨм ңлЎң м§ҖлҸ„м „л¬ёмқҳ нҷңлҸҷм—җ лҢҖн•ң мҲҳлӢ№мқҙ н•ҙлӢ№ мӮ¬м—… мҳҲмӮ°мқҳ к°ҖмһҘ нҒ° 비мӨ‘мқ„ м°Ём§Җн•ңлӢӨ. мқҙ мӮ¬м—…м—җм„ңлҠ”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кіј м—…л¬ҙ 비мӨ‘м—җ л”°лқј мұ…мһ„м§ҖлҸ„м „ л¬ёмқҳмҷҖ көҗмңЎм „лӢҙм§ҖлҸ„м „л¬ёмқҳлЎң 세분нҷ” л°Ҹ мІҙкі„нҷ”н•ҳкі к·ём—җ л”°лҘё м—ӯн• мқ„ к°•нҷ”н•ҳмҳҖлӢӨ. м •л¶ҖлҠ” к°Ғ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л°Ҹ м—…л¬ҙлҘј кө¬мІҙм ҒмңјлЎң м ңмӢңн•ҳмҳҖлҠ”лҚ°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лҠ”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мқ„ м „л°ҳм ҒмңјлЎң мҡҙмҳҒ, кҙҖлҰ¬н•ҳлҠ” мұ…мһ„мқҙ мһҲмңјл©° м—…л¬ҙ мӢңк°„мқҳ 40-50%лҘ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көҗмңЎ, нҸүк°Җ, л©ҙлӢҙ л°Ҹ н–үм • м—…л¬ҙм—җ н• м• н•ҙм•ј н•ҳкі мҲҳл Ё көҗмңЎ н”„лЎңк·ёлһЁ кө¬м¶•, мҲҳл Ё нҷҳкІҪ кҙҖлҰ¬, нғҖ м§ҖлҸ„м „л¬ёмқҳ кҙҖлҰ¬ л“ұ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 к°ңл°ңкіј к°ңм„ нҷңлҸҷмқ„ мҙқкҙ„н•ҳлҠ” м—…л¬ҙлҘј н•ҳлҸ„лЎқ н•ҳмҳҖлӢӨ. көҗмңЎм „лӢҙм§ҖлҸ„м „л¬ёмқҳлҠ” м „кіөмқҳ м „лӢҙ көҗмңЎ м—ӯн• мқ„ н•ҳкі м—…л¬ҙ мӢңк°„мқҳ 15%лҘј м „кіөмқҳ көҗмңЎкіј нҸүк°Җм—җ н• м• н•ҳм—¬ нҡҢ진, мҷёлһҳ 진лЈҢ, кІҖмӮ¬ л“ұмқ„ нҶөн•ҙ м „кіөмқҳлҘј көҗмңЎн•ҳкі нғңлҸ„мҷҖ мҲ кё°лҘј нҸүк°Җн•ҳлҸ„лЎқ н•ҳмҳҖлӢӨ.м–‘м§Ҳмқҳ мҲҳл Ёмқ„ мң„н•ҙм„ңлҠ” көҗмңЎмқ„ м ңкіөн•ҳлҠ”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нҷҳкІҪ лҳҗн•ң к°ңм„ лҗҳкі м§„лЈҢмҷҖ м—°кө¬л§ҢнҒј лҸҷл“ұн•ң мқём •кіј ліҙмғҒмқҙ н•„мҡ”н•ҳлӢӨлҠ” м җм—җм„ңлҠ” кёҚм •м Ғмқё м ңлҸ„лЎң ліј мҲҳ мһҲлӢӨ. к·ёлҹ¬лӮҳ кіјлҸ„н•ң 진лЈҢ м—…л¬ҙм—җ л– л°ҖлҰ° м§ҖлҸ„м „л¬ёмқҳк°Җ мҲҳл Ё мӢңк°„мқҙ лӢЁм¶•лҗҳл©ҙм„ң лӢ№м§Ғ м—…л¬ҙлҸ„ лҠҳм–ҙлӮҳкІҢ лҗңлӢӨл©ҙ м—…л¬ҙ мӢңк°„ мӨ‘ 15-50%м—җ лӢ¬н•ҳлҠ” мӢңк°„мқ„ мҳӨлЎҜмқҙ м „кіөмқҳ көҗмңЎм—җ мҸҹлҠ” кІғмқҖ нҳ„мӢӨм ҒмңјлЎң м–ҙл Өмҡё кІғмңјлЎң мӮ¬лЈҢлҗҳл©° мқҙлҘј ліҙмҷ„н• м ңлҸ„м Ғмқё к°ңм„ мқҙ м„ н–үлҗҳм–ҙм•ј н• кІғмқҙлӢӨ.
- 3.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нҳ„мһ¬мҷҖ лҜёлһҳ
- 3.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нҳ„мһ¬мҷҖ лҜёлһҳ
- 1)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нҳ„мһ¬
- 1)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нҳ„мһ¬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лҠ” 2018л…„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 м ңлҸ„лҘј мӢ м„Өн•ҳмҳҖмңјл©° 2020л…„м—җ ліҙкұҙліөм§Җл¶ҖмҷҖ лҢҖн•ңлі‘мӣҗнҳ‘нҡҢк°Җ 진н–үн•ң вҖҳм „кіөмқҳ м—°м°Ёлі„ мҲҳл Ё көҗкіј кіјм • мІҙкі„нҷ” кө¬м¶•мӮ¬м—…вҖҷ 1м°Ёл…„лҸ„ мӮ¬м—…м—җ м°ём—¬н•ҳм—¬ м—ӯлҹү мӨ‘мӢ¬мқҳ мҲҳл Ё көҗкіј кіјм •мқ„ к°ңл°ңн•ҳкі мҲҳл ЁкөҗмңЎм§Җм№Ём„ңлҘј к°ңнҺён•ҳмҳҖлӢӨ. к·ёлҰ¬кі 2021л…„ 2м°Ёл…„лҸ„ мӮ¬м—…мқ„ нҶөн•ҙ м „кіөмқҳ нҸүк°ҖмҷҖ м „кіөмқҳ e-portfolio мӢңмҠӨн…ңм—җ мқҙлҘј л°ҳмҳҒн•ҳмҳҖлӢӨ[3]. K-NEPA 13мқ„ кё°л°ҳмңјлЎң н•ң мғҲлЎңмҡҙ мҲҳл Ё көҗкіј кіјм •мқҖ мһ„мғҒ м—ӯлҹүм—җ лҢҖн•ң м „кіөмқҳмқҳ мһҗмӢ к°җмқ„ ліҙлӢӨ кі м·ЁмӢңнӮӨлҠ” н•ңнҺё к°ңл°©м Ғмқё мһҗкё° м„ұм°°кіј мһ¬кі лҘј нҶөн•ҙ ліҙлӢӨ к°қкҙҖм ҒмңјлЎң мһҗмӢ мқҳ м—ӯлҹүмқ„ нҸүк°Җн• мҲҳ мһҲлҸ„лЎқ н•ҳмҳҖлӢӨ[3].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Ҳҳл Ёмң„мӣҗнҡҢлҠ” мғҲлЎңмҡҙ мҲҳл Ё көҗмңЎ м ңлҸ„ л§Ҳл Ём—җ к·ём№ҳм§Җ м•Ҡкі м ңлҸ„ к°ңм„ кіј нҸүк°ҖлҘј мң„н•ҳм—¬ м§ҖмҶҚм Ғмқё м—°кө¬лҘј 진н–үн•ҙ мҷ”мңјл©°[3,4] мқҙлҹ¬лӢқм„јн„°(E-learning Center) мҡҙмҳҒ, к°ңл°©нҳ• лҢҖнҷ” н”Ңлһ«нҸј(м „кіөмқҳ л¬јм–ҙліҙмӮҙ) мӢңлІ” мҡҙмҳҒ, мқёкіөм§ҖлҠҘ л“ұмқҳ мҳЁлқјмқё кё°мҲ мқ„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җ лҸ„мһ…н•ҳл©ҙм„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көҗмңЎ мӢңмҠӨн…ңм—җ нҳҒмӢ мқ„ кё°н•ҳкі мһҲлӢӨ[25].к·ёлҹ¬лӮҳ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 м ңлҸ„к°Җ лҸ„мһ…лҗңм§Җ л§Ң 4л…„мқҙ м§ҖлӮ¬мқҢм—җлҸ„ л¶Ҳкө¬н•ҳкі м•„м§Ғ мҳЁм „нһҲ м •м°©лҗҳм§Җ лӘ»н•ң кІғмқҙ мӮ¬мӢӨмқҙлӢӨ. мқҙлҠ” лӢӨлҘё м „л¬ё 진лЈҢ кіјлӘ©лҸ„ мҳҲмҷёлҠ” м•„лӢҢлҚ° нҠ№нһҲ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кіјмӨ‘н•ң м—…л¬ҙлЎң мқён•ң мӢңк°„м Ғ м ңм•Ҫмқҙ мЈјмҡ” л¬ём ңлЎң м§Җм Ғлҗҳм—ҲлӢӨ. лҳҗн•ң кё°мЎҙмқҳ м§ҖмӢқ м „лӢ¬нҳ• көҗмңЎм—җ 비н•ҙ м—ӯлҹү мӨ‘мӢ¬ көҗмңЎм—җлҠ” м§ҖлҸ„м „л¬ёмқҳк°Җ л§ҺмқҖ мӢңк°„мқ„ м§Ғм ‘ көҗмңЎм—җ н• м• н•ҙм•ј н•ҳм§Җл§Ң мқҙм—җ лҢҖн•ң н•©лӢ№н•ң ліҙмғҒкіј м ңлҸ„к°Җ л’·л°ӣм№Ёлҗҳм§Җ м•ҠлҠ” кІғлҸ„ мЈјмҡ” л¬ём ңм җмңјлЎң м§Җм Ғлҗҳкі мһҲлӢӨ.лҳҗн•ң м§Җм—ӯкіј лі‘мӣҗмқҳ нҷҳкІҪкіј мӮ¬м •м—җ л”°лқј мҲҳл Ё нҷҳкІҪмқҙ мғҒмқҙн•Ём—җлҸ„ л¶Ҳкө¬н•ҳкі нҳ„ мӢңмҠӨн…ңмқҙ мқҙлҘј 충분нһҲ л°ҳмҳҒн•ҳм§Җ лӘ»н•ҳкі мһҲлӢӨлҠ” н•ңкі„к°Җ м ңкё°лҗҳм–ҙ мҷ”лӢӨ. нҳ„мһ¬ м „кіөмқҳмқҳ м—ӯлҹү нҸүк°ҖлҠ” л§Өл…„ мӢӨмӢңн•ҳлҠ”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 •м„ұ нҸүк°ҖмҷҖ мқём„ң비мҠӨ мӢңн—ҳмқ„ нҶөн•ң м •лҹү нҸүк°Җк°Җ мқҙлЈЁм–ҙм§Җкі мһҲмңјлӮҳ мҲ кё°лҘј нҸ¬н•Ён•ң н•өмӢ¬ м „л¬ё м—ӯлҹүмқ„ ліҙлӢӨ лӢӨл©ҙм ҒмңјлЎң нҸүк°Җн• мҲҳ мһҲлҠ” м§Җн‘ңк°Җ н•„мҡ”н•ҳлӢӨ. м•„мҡёлҹ¬ нҸүк°Җ м§Җн‘ңл“Өмқ„ н‘ңмӨҖнҷ”н•ҳкі кі лҸ„нҷ”н•ҳлҠ” мһ‘м—…лҸ„ н•„мҡ”н•ҳлӢӨ. мӢ кІҪкіј 분야мқҳ м§ҖмӢқкіј мҲ кё°лҠ” л№ лҘҙкІҢ л°ңм „н•ҳкі мһҲмңјл©° мқҙм—җ л”°лқј м „кіөмқҳл“Өм—җкІҢ мҡ”кө¬лҗҳлҠ” н•ҷмҠө лІ”мң„лҸ„ нҒ¬кІҢ лҠҳм–ҙлӮҳкі мһҲлӢӨ. л”°лқјм„ң мҲҳл Ё көҗкіј кіјм •лҸ„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м—…лҚ°мқҙнҠёлҗҳм–ҙм•ј н•ңлӢӨ.- 2)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мӢңмҠӨн…ңм—җм„ң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 2)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мӢңмҠӨн…ңм—җм„ң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кіјкұ°мқҳ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ӯн• мқҙ мЈјлЎң м§ҖмӢқ м „лӢ¬мһҗмҳҖлӢӨл©ҙ м•һмңјлЎңлҠ” м „кіөмқҳмқҳ мҲ кё°лҘј м§ҖлҸ„, к°җлҸ…, нҸүк°Җн•ҳл©ҙм„ң мҲҳл Ё кіјм • лҸҷм•Ҳ мҪ”м№ҳлЎңм„ңмқҳ м—ӯн• лҸ„ н•Ёк»ҳ мҡ”кө¬лҗңлӢӨ. н•ң м—°кө¬ кІ°кіјм—җ л”°лҘҙл©ҙ м Җл…„м°Ём—җм„ңлҠ” мӢ кІҪкі„ 진찰, лі‘ліҖ көӯмҶҢнҷ”, 진лЈҢ мӢңмҠӨн…ң мқҙн•ҙ л°Ҹ лҸ…лҰҪм„ұ л“ұмқҳ л¶Җ분м—җм„ң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 нҸүк°Җм—җ 비н•ҙ ліёмқёмқ„ кіјлҢҖнҸүк°Җн•ҳкі мһҲм—Ҳкі мқҙлҠ” м—ӯлҹү мӨ‘мӢ¬ көҗмңЎм—җм„ң мҳӨлҠ” кіјлҸ„н•ң мһҗмӢ к°җмқҙ мӣҗмқёмқј к°ҖлҠҘм„ұмқҙ мһҲлӢӨкі л¶„м„қн•ҳмҳҖлӢӨ[4]. кі л…„м°Ём—җм„ңлҠ” мҷёлһҳ 진лЈҢ, мӢ кІҪкі„ кІҖмӮ¬ нҢҗлҸ…, лҸҷлЈҢмҷҖмқҳ нҳ‘м—…, мқҳмӮ¬мҶҢнҶө кё°мҲ л“ұмқҳ н•ӯлӘ©м—җм„ң мҠӨмҠӨлЎңлҘј кіјмҶҢнҸүк°Җн•ҳкі мһҲм—Ҳмңјл©° кё°мЎҙмқҳ м§ҖмӢқ м „лӢ¬ мӨ‘мӢ¬мқҳ лҸ„м ңмӢқ көҗмңЎмңјлЎң мқён•ң ліҙмҲҳм Ғмқё ліёмқё нҸүк°Җк°Җ мқҙм—җ мҳҒн–Ҙмқ„ лҜёміӨмқ„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3]. мқҙлҹ° л¬ём ңл“ӨмқҖ лӢЁмҲңнһҲ мҲҳл Ё кіјм • нҳ№мқҖ мҲҳл Ё мӢңмҠӨн…ңмқ„ к°ңм„ н•ҳлҠ” кІғмңјлЎңлҠ” н•ҙкІ°н•ҳкё° м–ҙл өкё° л•Ңл¬ём—җ м§ҖлҸ„м „л¬ёмқҳк°Җ м „кіөмқҳ к°ңк°ңмқёмқҳ м—ӯлҹүмқ„ кі л Өн•ҳм—¬ мңөнҶөм„ұ мһҲкІҢ к°ңмһ…н•ҳлҠ” кІғмқҙ н•„мҡ”н•ҳлӢӨ. лҳҗн•ң м§ҖлҸ„м „л¬ёмқҳлҠ” м „кіөмқҳ нҸүк°ҖлҘј нҶөн•ҙ м „кіөмқҳм—җкІҢ л¶ҖмЎұн•ң м—ӯлҹүмқ„ мЎ°кё°м—җ нҢҢм•…н•ҳкі к·ё н•ҙкІ°мұ…мқ„ м ңмӢңн• мҲҳ мһҲм–ҙм•ј н•ң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нҠ№м • мҲ кё°лӮҳ 진лЈҢ кІҪн—ҳмқҙ л¶ҖмЎұн•ң кІҪмҡ° н•ҙлӢ№ нҢҢнҠёмқҳ 추к°Җ мҲҳл Ёмқ„ м§ҖмӢңн•ҳкұ°лӮҳ кІҪн—ҳн•ҳм§Җ лӘ»н•ң нҷҳмһҗкө°мқҙлӮҳ мҲ кё°к°Җ мһҲлӢӨл©ҙ нҢҢкІ¬ мҲҳл Ёмқ„ ліҙлӮҙкұ°лӮҳ н•ҷнҡҢ көҗмңЎм—җ м°ём—¬н•ҳлҸ„лЎқ лҸ…л Өн•ҙм•ј н•ңлӢӨ.кҙ‘лІ”мң„н•ҙм§Җл©ҙм„ңлҸ„ к№Ҡм–ҙм§ҖлҠ” мӢ кІҪкі„ м§ҖмӢқмқҖ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мқ„ м җм җ 세분нҷ”н•ҳкі м •көҗн•ҙм§ҖлҸ„лЎқ н•ҳкі мһҲлӢӨ. мӢ кІҪкіј м§Ҳнҷҳмқҳ мң лі‘лҘ мҰқк°Җ, мӨ‘мҰқ л°Ҹ мқ‘кёү мӢ кІҪкі„ м§Ҳнҷҳм—җм„ң мӢ кІҪн•ҷм Ғ мӨ‘мһ¬ м№ҳлЈҢмқҳ л°ңм „мқҖ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лҘј н•„мҲҳмқҳлЈҢмқҳ н•өмӢ¬ мқёл ҘмңјлЎң мһҗлҰ¬л§Өк№Җн•ҳкІҢ н•ҳкі мһҲлӢӨ. мқҙлҹ° ліҖнҷ” мҶҚм—җм„ң м—ӯлҹү мһҲлҠ”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лҘј мңЎм„ұн•ҙ лӮҙлҠ” 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Ө‘мҡ”м„ұмқҖ м•„л¬ҙлҰ¬ к°•мЎ°н•ҙлҸ„ м§ҖлӮҳм№ҳм§Җ м•ҠлӢӨ. нҠ№нһҲ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лҠ” к°Ғ мҲҳл Ёлі‘мӣҗмқҳ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 мҙқкҙ„н•ҳлҠ” мҙқкҙ„ к°җлҸ…мһҗ(director)лЎңм„ңмқҳ м—ӯн• кіј м§Ғм ‘ көҗмңЎмқ„ лӢҙлӢ№н•ҳлҠ” мҲҳл Ё/көҗмңЎмһҗ(trainer)лЎңм„ңмқҳ м—ӯн• мқ„ лҸҷмӢңм—җ мҲҳн–үн•ҙм•ј н•ңлӢӨ. лҚ”л¶Ҳм–ҙ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мқҙ м җм°Ё м„ёл¶Җ м „кіөмңјлЎң нҠ№нҷ”лҗЁм—җ л”°лқј мғҒлҢҖм ҒмңјлЎң 축мҶҢлҗҳкі мһҲлҠ” мқјл°ҳ мӢ кІҪкіј(general neurology)м—җ лҢҖн•ң көҗмңЎкіј мҲҳл Ёмқ„ лӢҙлӢ№н•ҳлҠ” м—ӯн• лҸ„ мҲҳн–үн• мҲҳ мһҲлӢӨ.мұ…мһ„м§ҖлҸ„м „л¬ёмқҳлҠ” м§Ғм ‘ м „кіөмқҳлҘј көҗмңЎн• лҝҗл§Ң м•„лӢҲлқј лҢҖн•ң мӢ кІҪкіјн•ҷнҡҢ л°Ҹ мӮ°н•ҳ мҲҳл Ёмң„мӣҗнҡҢмҷҖ кёҙл°ҖнһҲ нҳ‘л Ҙн•ҳм—¬ м—°м°Ёлі„ мҲҳл Ё көҗкіј кіјм •мқ„ к°Ғ лі‘мӣҗмқҳ нҷҳкІҪм—җ л§һкІҢ мЎ°мңЁн•ҳкі м Ғмҡ©н•ҙм•ј н•ңлӢӨ. лҳҗн•ң м „кіөмқҳмқҳ көҗмңЎ мҠөл“қ м •лҸ„лҘј нҸүк°Җн•ҳкі нғҖ м§ҖлҸ„м „л¬ёмқҳк°Җ 진н–үн•ҳлҠ” м „кіөмқҳ көҗмңЎ н”„лЎңк·ёлһЁмқ„ к°җлҸ…н•ҳм—¬ м „мІҙ мҲҳл Ёмқҙ мқјкҙҖлҗҳкі нҡЁкіјм ҒмңјлЎң мқҙлЈЁм–ҙм§Җкі мһҲлҠ”м§Җ м •кё°м ҒмңјлЎң нҷ•мқён•ҙм•ј н•ңлӢӨ. мқҙлҹ¬н•ң мІҙкі„м Ғмқё м—ӯн• мҲҳн–үмқ„ мң„н•ҳм—¬ н•ҷнҡҢлҠ” к°Ғ мҲҳл Ёкё°кҙҖмқҳ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л“Өмқҙ лӘЁм—¬м„ң м„ңлЎң мӮ¬лЎҖмҷҖ мқҳкІ¬мқ„ кіөмң н•ҳкі лҸҷлЈҢ нҸүк°Җ(peer review)лҘј 진н–үн• мҲҳ мһҲлҸ„лЎқ л…јмқҳмқҳ мһҘмқ„ л§Ҳл Ён•ҙм•ј н•ңлӢӨ. мұ…мһ„м§ҖлҸ„м „л¬ёмқҳмқҳ мҙқкҙ„ к°җлҸ…(directing)мқҖ нҳҒмӢ лҗң мҲҳл Ё м ңлҸ„мқҳ м„ұкіөм Ғмқё м•Ҳм°©кіј м „кіөмқҳ мҲҳл Ёмқҳ м§Ҳ н–ҘмғҒм—җ н•„мҲҳм Ғмқё мҡ”мҶҢмқҙлӢӨ.- 3)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 н–Ҙнӣ„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 к°ңл°ң кіјм ң
- 3)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 н–Ҙнӣ„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 к°ңл°ң кіјм ң
көӯлҜј мғқлӘ…к¶Ңмқ„ ліҙмһҘн•ҳлҠ” 충분н•ң м—ӯлҹүмқ„ к°–м¶ҳ м–‘м§Ҳмқҳ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лҘј л°°м¶ңн•ҳлҠ” кІғмқҙ н•„мҲҳ진лЈҢкіјлЎңм„ң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мқҳ лӘ©н‘ңмқҙлӢӨ. лҳҗн•ң м „л¬ё м§ҖмӢқмқ„ л°”нғ•мңјлЎң кёүліҖн•ҳлҠ” мқҳлЈҢ нҷҳкІҪм—җ мң м—°н•ҳкІҢ лҢҖмқ‘н• мҲҳ мһҲлҠ” лҠҘл Ҙмқ„ 갖추лҠ” кІғ м—ӯмӢң мӨ‘мҡ”н•ң м§Җн–Ҙм җмқҙлӢӨ. мқҙлҘј лӢ¬м„ұн•ҳкё° мң„н•ҳм—¬ н–Ҙнӣ„ мӢ кІҪкіј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мқҖ лӢӨмқҢкіј к°ҷмқҖ л°©н–ҘмңјлЎңмқҳ к°ңл°ңмқҙ мҡ”кө¬лҗңлӢӨ.мІ«м§ё, мӢ кІҪкіј н•„мҲҳ м§Ҳнҷҳм—җ лҢҖн•ң 진лӢЁкіј м№ҳлЈҢ м—ӯлҹүмқ„ ліҙлӢӨ мІҙкі„м Ғмқҙкі мӢӨм§Ҳм ҒмңјлЎң к°•нҷ”н• мҲҳ мһҲлҠ” көҗмңЎ н”„лЎңк·ёлһЁмқ„ к°ңл°ңн•ҙм•ј н•ңлӢӨ. нҳ„мһ¬ мҡҙмҳҒ мӨ‘мқё мқҙлҹ¬лӢқм„јн„°лҘј кё°л°ҳмңјлЎң м •кё°м Ғмқё м „кіөмқҳ нҶөн•© көҗмңЎ нҳ•мӢқм—җм„ң лӮҳм•„к°Җ м–ём ңл“ м ‘к·ј к°ҖлҠҘн•ң лӘЁл“Ҳ кё°л°ҳ мғҒмӢң л””м§Җн„ё көҗмңЎ мІҙкі„лЎңмқҳ м „нҷҳмқ„ кі л Өн•ҙм•ј н•ңлӢӨ.л‘ҳм§ё, мӢ кІҪн•ҷм Ғ мӨ‘мҰқ нҳ№мқҖ мқ‘кёү мғҒнҷ©м—җм„ң мӢ мҶҚн•ҳкі м •нҷ•н•ҳкІҢ лҢҖмқ‘н• мҲҳ мһҲлҠ” лҠҘл Ҙмқ„ л°°м–‘н•ҳкё° мң„н•ҙм„ңлҠ” мқҙм—җ лҢҖн•ң 충분н•ң мһ„мғҒ м§ҖлҸ„лҘј м ңкіөн•ҙм•ј н•ңлӢӨ. мӢң뮬л Ҳмқҙм…ҳ көҗмңЎмқҖ к·ё көҗмңЎ нҡЁкіјм—җ лҢҖн•ҙ м•„м§Ғ л…јлһҖмқҙ мһҲм§Җл§Ң кёүм„ұ лҮҢмЎёмӨ‘ мІҳм№ҳлӮҳ лҮҢм „мҰқмӨ‘мІ©мҰқкіј к°ҷмқҖ кі мң„н—ҳ мқ‘кёү мғҒнҷ© нҳ№мқҖ нҠ№м • мӨ‘мҡ” мҲ кё°м—җ лҢҖн•ң л°ҳліө н•ҷмҠөмқҙлқјлҠ” мёЎл©ҙм—җм„ңлҠ” м•Ҳм „н•ҳкі нҡЁмңЁм Ғмқё мҲҳл Ё лҸ„кө¬к°Җ лҗ мҲҳ мһҲлӢӨ. к·ёлҹ¬лӮҳ мҲҳл Ёкё°кҙҖмқҙлӮҳ н•ҷнҡҢ м°Ёмӣҗм—җм„ң мӢң뮬л Ҳмқҙм…ҳ м„јн„°лҘј кө¬м¶•н•ҳлҠ” лҚ°м—җлҠ” мһ¬м •м Ғ м ңм•Ҫмқҙ нҒ¬лҜҖлЎң мқҙлҠ” көӯк°Җ м°Ёмӣҗм—җм„ң 진н–үн•ҙм•ј н• кіјм ңмқҙл©° мқҙлҘј мң„н•ҙм„ң м„ёл¶Җм „л¬ёкіјлӘ©н•ҷнҡҢмҷҖ мқҳн•ҷнҡҢмқҳ м§ҖмҶҚм Ғмқё мҡ”кө¬мҷҖ л…ёл Ҙмқҙ н•„мҡ”н•ҳлӢӨ.м…Ӣм§ё, мӢӨм ң 진лЈҢ нҳ„мһҘм—җм„ң л№ҲлІҲнһҲ м ‘н•ҳлҠ” нҷҳмһҗл“Өм—җ лҢҖн•ң мһ„мғҒ мҲ кё°мҷҖ мІҳм№ҳм—җ лҢҖн•ң мҲҷл ЁлҸ„лҘј 충분нһҲ н•Ём–‘н• мҲҳ мһҲлҠ” көҗмңЎмқҙ нҸ¬н•Ёлҗҳм–ҙм•ј н•ңлӢӨ.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Ҳҳл Ёмң„мӣҗнҡҢм—җм„ңлҠ” м „кіөмқҳ нҶөн•© көҗмңЎмқ„ м§ҖмӢқкіј мҲ кё°лЎң лӮҳлҲ„м–ҙ л§Өл…„ 4м°ЁлЎҖ, 2л…„ мЈјкё°лЎң мҲҳл Ём§Җм№Ём„ң лӮҙмҡ©мқ„ 충мӢӨнһҲ л°ҳмҳҒн•ң мҳЁлқјмқё/лҢҖл©ҙ көҗмңЎмқ„ мӢңн–үн•ҳкі мһҲ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ҹ¬н•ң көҗмңЎмқҖ лҢҖл¶Җ분 м •н•ҙ진 мӢңм җм—җ м ңкіөлҗҳлҜҖлЎң м „кіөмқҳк°Җ н•„мҡ”н• л•Ң м–ём ңл“ м ‘к·јн• мҲҳ мһҲлҸ„лЎқ мҳЁлқјмқё лӘЁл“Ҳнҳ•мңјлЎң к°ңм„ н• н•„мҡ”к°Җ мһҲлӢӨ. көҗмңЎмң„мӣҗнҡҢм—җм„ңлҠ” мһ„мғҒ нҳ„мһҘм—җм„ң н•„мҲҳм Ғмқё мҲ кё°лҘј мӨ‘мӢ¬мңјлЎң лӘЁл“Ҳнҳ• көҗмңЎ м»Ён…җмё лҘј к°ңл°ң мӨ‘мқҙл©° мҲҳл Ёмң„мӣҗнҡҢлҸ„ н•Ёк»ҳн•ҳм—¬ м—°м°Ёлі„ көҗкіј кіјм • мқҙмҲҳм—җ н•„мҡ”н•ң мҲ кё° мӨ‘мӢ¬мқҳ лӘЁл“Ҳнҳ• көҗмңЎ м»Ён…җмё лҘј м ңмһ‘н• кі„нҡҚмқҙлӢӨ.лҳҗн•ң н•ҷмҠөмһҗ мӨ‘мӢ¬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 мЎ°м„ұмқ„ мң„н•ҳм—¬ м „кіөмқҳлҘј лҢҖмғҒмңјлЎң н•ң м„Өл¬ёмЎ°мӮ¬мҷҖ мқён„°л·° л“ұ лӢӨм–‘н•ң л°©мӢқмқҳ н”јл“ңл°ұ мҲҳл ҙ л…ёл Ҙмқ„ м§ҖмҶҚн•ҳкі мқҙлҘј мҲҳл Ё н”„лЎңк·ёлһЁ к°ңм„ м—җ л°ҳмҳҒн•ҙм•ј н•ңлӢӨ. мқҙлҹ¬н•ң к°ңм„ мқҖ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к°Җ мӢӨм ң мһ„мғҒм—җм„ң мҡ”кө¬лҗҳлҠ” н•өмӢ¬ м—ӯлҹүмқ„ нҡЁкіјм ҒмңјлЎң мҠөл“қн•ҳкІҢ н•ҳл©° к¶Ғк·№м ҒмңјлЎңлҠ” көӯлҜјмқҳ кұҙк°•кіј мғқлӘ…мқ„ м§ҖнӮӨлҠ” лҚ° мӨ‘추м Ғмқё м—ӯн• мқ„ мҲҳн–үн• мҲҳ мһҲлҠ” м „л¬ёмқҳлҘј м–‘м„ұн•ҳлҠ” лҚ° кё°м—¬н• кІғмқҙлӢӨ.
- кІ° лЎ
- кІ° лЎ
2024л…„ мқҳм • мӮ¬нғң мқҙнӣ„ мҲҳл Ё мӢңк°„ лӢЁм¶• л“ұ м „кіөмқҳ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ҙ кёүліҖн•ҳмҳҖлӢӨ. мқҙлҹ¬н•ң ліҖнҷ” мҶҚм—җм„ң н•„мҲҳ м—ӯлҹү көҗмңЎмқ„ мң„н•ң мғҲлЎңмҡҙ көҗмңЎ мӢңмҠӨн…ң к°ңл°ңмқҖ н•„м—°м Ғмқҙл©° к·ём—җ л§һм¶° мӢ кІҪкіј м „кіөмқҳ көҗмңЎ м—ӯмӢң мһ¬м •л№„лҗҳм–ҙм•ј н•ңлӢӨ. мӢ кІҪкіјлҠ” кі лҸ„мқҳ м „л¬ём„ұкіј мҲҷл Ёлҗң мһ„мғҒ кІҪн—ҳмқ„ мҡ”кө¬н•ҳлҠ” н•„мҲҳ кіјлӘ©мңјлЎң мҲҳл Ёмқҳ м§Ҳмқ„ нҷ•ліҙн•ҳл©ҙм„ңлҸ„ нҡЁмңЁм Ғмқё н•ҷмҠө кІҪлЎңлҘј м ңкіөн•ҳлҠ” мғҲлЎңмҡҙ көҗмңЎ лӘЁлҚёмқҙ н•„мҡ”н•ҳлӢӨ. мқҙлҘј мң„н•ҙм„ңлҠ” м§ҖлҸ„м „л¬ёмқҳ мІҙкі„ м •л№„мҷҖ ліҙмғҒ, мӢӨл¬ҙмҷҖ мҲ кё° кё°л°ҳмқҳ м—ӯлҹү мӨ‘мӢ¬ көҗмңЎ н”Ңлһ«нҸј кө¬м¶•, к°Ғ мҲҳл Ёкё°кҙҖм—җ лҢҖн•ң н”јл“ңл°ұ м ңкіөкіј нҸүк°Җ м§Җн‘ң кі лҸ„нҷ”к°Җ н•„мҲҳм ҒмқҙлӢӨ. к·ёлҹ¬лӮҳ м•„л¬ҙлҰ¬ мқҙмғҒм Ғмқё м ңлҸ„лҸ„ кө¬м„ұмӣҗмқҳ лҸҷмқҳк°Җ м—Ҷкұ°лӮҳ мқҙлҘј мӢӨнҳ„н• мҲҳ мһҲлҠ” мқён”„лқјмҷҖ лҸҷл Ҙмқҙ м—ҶлӢӨл©ҙ мӮ¬мғҒлҲ„к°Ғм—җ л¶Ҳкіјн•ҳлӢӨ. м •л¶ҖлҠ” м ңлҸ„ к°ңм„ кіј мӢӨм§Ҳм Ғ м§Җмӣҗмқ„ нҶөн•ҙ м „кіөмқҳмҷҖ м§ҖлҸ„м „л¬ёмқҳ лӘЁл‘җк°Җ м•Ҳм „н•ҳкі м§ҖмҶҚ к°ҖлҠҘн•ң нҷҳкІҪм—җм„ң көҗмңЎл°ӣкі м§ҖлҸ„н• мҲҳ мһҲлҠ” мқён”„лқјлҘј л§Ңл“Өм–ҙм•ј н•ңлӢӨ.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Ҳҳл Ёмң„мӣҗнҡҢлҠ” м•ҲмңјлЎңлҠ” м§ҖлҸ„м „л¬ёмқҳмҷҖ м „кіөмқҳмқҳ мқҳкІ¬мқ„ мҲҳл ҙн•ҳм—¬ н•„мҡ”н•ң көҗмңЎ н”„лЎңк·ёлһЁмқ„ м ңкіөн•ҳкі л°–мңјлЎңлҠ” нҳ„мӢӨм Ғмқё м ңлҸ„ к°ңм„ мқ„ мң„н•ҳм—¬ лӘ©мҶҢлҰ¬лҘј лӮј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Ӯҳ л¬ҙм—ҮліҙлӢӨлҸ„ вҖңм•„мқҙ н•ҳлӮҳлҘј нӮӨмҡ°кё° мң„н•ҙм„ңлҠ” л§Ҳмқ„ м „мІҙк°Җ н•„мҡ”н•ҳлӢӨвҖқлҠ” м•„н”„лҰ¬м№ҙ мҶҚлӢҙмІҳлҹј мӢ кІҪкіјмқҳ лҜёлһҳлҘј лӢҙлӢ№н• м „кіөмқҳ көҗмңЎкіј мҲҳл Ём—җлҠ” м–ҙлҠҗ мң„м№ҳм—җ мһҲл“ лӘЁл“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қҳ кҙҖмӢ¬кіј нҳ‘л Ҙмқҙ н•„мҲҳм ҒмқҙлӢӨ.
Table.
Korean NeurologistвҖҷs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13
- REFERENCES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мғқлӘ…кіј м§Җм—ӯмқ„ мӮҙлҰ¬лҠ” мқҳлЈҢк°ңнҳҒ 1м°Ё мӢӨн–ү л°©м•Ҳ л°ңн‘ң. [online] [cited 2024 Aug 30].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955&tag=&nPage=1#share.2. Ministry of Education. мқҳн•ҷкөҗмңЎ м—¬кұҙ к°ңм„ м—җ м•Ҫ 5мЎ°мӣҗ нҲ¬мһҗ. [online] [cited 2024 Sep 10]. Available from: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0057.3. Ryu HK, Oh JY, Kim CK, Park JS, Kang SW, Choi HJ, et al. Effect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on resident training: a comparative review of Korean NeurologistвҖҷs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13 on self-evaluation and professor's evaluation. J Korean Neurol Assoc 2024;42:307-312.
[Article]4. Choi H, Oh J, Kim CK, Ryu H, Ryu Y. Residents need competence not confidence: a retrospective evaluation of the new competency education program for Korean neurology residents. PLoS One 2023;18:e0290503.
[Article] [PubMed] [PMC]5. Choi GS. м „кіөмқҳ мҲҳл ЁнҷҳкІҪ нҳҒмӢ 2025л…„ 추진계нҡҚ л…јмқҳ. [online] [cited 2025 Apr 10]. Available from: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81.6. Kim MJ. A crisis caused by confusion in the concept of essential healthcare. Korean J Med Ethics 2023;26:257-263.
[Article]7. Korean Medical Association. н•„мҲҳмқҳлЈҢ мӨ‘мӢ¬мқҳ кұҙк°•ліҙн—ҳ м Ғмҡ©кіј к°ңм„ л°©м•Ҳ. Vol. 1.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2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н•„мҲҳмқҳлЈҢ м§ҖмӣҗлҢҖмұ…: мӨ‘мҰқгғ»мқ‘кёү, 분л§Ң, мҶҢ아진лЈҢ мӨ‘мӢ¬мңјлЎң. [online] [cited 2023 Jan 31]. Available from: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5649.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лІјлһ‘ лҒқ н•„мҲҳмқҳлЈҢ, м •мұ… нҢЁнӮӨм§ҖлЎң мӮҙлҰ°лӢӨ. [online] [cited 2025 Feb 24].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33&act=view.10. Zhao C, Lee K, Do D. Neurology consults in emergency departments: opportunities to streamline care. Neurol Clin Pract 2020;10:149-155.
[Article] [PubMed] [PMC]11. Pitts SR, Niska RW, Xu J, Burt CW.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2006 emergency department summary. Natl Health Stat Rep 2008;7:1-38.12. Liberman AL, Prabhakaran S, Zhang C, Kamel H. Prevalence of neurological complaints in US Emergency Departments, 2016-2019. JAMA Neurol 2022;80:213-215.
[Article] [PubMed] [PMC]13. Hassan MS, Sidow NO, Gökgül A, Adam BA, Osman MF, Mohamed HH, et al. Pattern of neurological disorders among patients evaluated in the emergency department: cross-sectional study. Arch Acad Emerg Med 2023;11:e20.
[PubMed] [PMC]14. Kim DY, Jo N, Cha JK, Choi HJ, Jeong SW, Koh IS, et al. Workload in emergency rooms among clinical specialties and overburdened neurologists. J Korean Neurol Assoc 2022;40:127-136.
[Article]15. Moulin T, Sablot D, Vidry E, Belahsen F, Berger E, Lemounaud P, et al. Impact of emergency room neurologists on patient management and outcome. Eur Neurol 2003;50:207-214.
[Article] [PubMed]16. Rizos T, JГјttler E, Sykora M, Poli S, Ringleb PA. Common disorders in the neurological emergency room--experience at a tertiary care hospital. Eur J Neurol 2011;18:430-435.
[Article] [PubMed]18. Torres SD, Kim CY, Das M, Ankam JV, Luche N, Harmon M, et al. Delays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bacterial meningitis in NYC: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 Neurohospitalist 2021;12:268-272.
[Article] [PubMed] [PMC]19. Betjemann JP, Lowenstein DH. Status epilepticus in adults. Lancet Neurol 2015;14:615-624.
[Article] [PubMed]20. Alkhachroum A, Der-Nigoghossian CA, Rubinos C, Claassen J. Markers in status epilepticus prognosis. J Clin Neurophysiol 2020;37:422-428.
[Article] [PubMed] [PMC]21. Hill CE, Parikh AO, Ellis C, Myers JS, Litt B. Timing is everything: where status epilepticus treatment fails. Ann Neurol 2017;82:155-165.
[Article] [PubMed] [PMC]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м „кіөмқҳ м—°мҶҚк·јл¬ҙ лӢЁм¶• мӢңлІ”мӮ¬м—… 42к°ң м°ём—¬кё°кҙҖ м„ м •. [online] [cited 2024 May 31].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1743&mid=a10503010100.23.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м •л¶ҖлҠ” мһҳлӘ»лҗң м •мұ…мқ„ мІ нҡҢн•ҳкі л№„лҜјмЈјм Ғмқё нғ„м••мқ„ мӨ‘лӢЁн•ҳмӢӯмӢңмҳӨ. [online] [cited 2024 Feb 20]. Available from: https://youngmd.org/154/?bmode=view&idx=18112487.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л…„лҸ„ мҲҳл ЁнҷҳкІҪ нҳҒмӢ м§ҖмӣҗмӮ¬м—… ліҙмЎ°мӮ¬м—…мһҗ м„ м • кіөлӘЁ. [online] [cited 2025 Jan 20].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84384&act=view&.25. Kim YS.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 „кіөмқҳ мҲҳл Ё мӢңмҠӨн…ң м „л©ҙ к°ңнҺё 추진вҖҰ AI 분м„қ нҶөн•ң лҸ„мҡ°лҜё мӢңмҠӨн…ң кө¬м¶• - мҲҳл Ё лі‘мӣҗ мқёл Ҙкіј кіөк°„ н•ңкі„ к·№ліө л°©м•Ҳ л§Ҳл Ё. [online] [cited 2025 Feb 17]. Available from: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