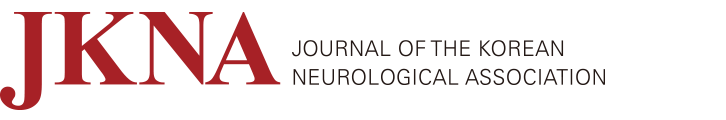Introduction to Neuroethics: A Review for Neurologists
- Sang Bum Lee, MD, Daehoon Kim, MDa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Ҙј мң„н•ң мӢ кІҪмңӨлҰ¬
- мқҙмғҒлІ”, к№ҖлҢҖнӣҲa
- Received July 31, 2025; В В В Revised August 20, 2025; В В В Accepted August 20, 2025;
- ABSTRACT
-
The rapid advancement of neuroscience is fundamentally changing our understanding of brain function and the mind, posing new ethical questions to neurologists in clinical practice. Neuroethics, a field that addresses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arising from these advancements, is broadly divided into two main areas: the ethics of neuroscience and the neuroscience of ethics. This review aims to introduce the core concepts of neuroethics and emphasize its clinical importance for Korean neurologists who may be unfamiliar with the field. It examines how traditional localizationist and modern connectionist views of brain function inform our understanding of consciousness and self, along with their limitations. Through this, we aim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pproaching the ethical dilemmas that neurologists encounter in clinical situations, such as disorders of consciousness, dementia, and deep brain stimulation. Ultimately, this review seeks to help neurologists move beyond being technical experts to become reflective practitioners who deeply consider the personhood and dignity of their patients.
- м„ң лЎ
- м„ң лЎ
21м„ёкё°лҠ” лҮҢмқҳ мӢңлҢҖлқј л¶ҲлҰҙ л§ҢнҒј мӢ кІҪкіјн•ҷ 분야мқҳ л°ңм „мқҙ лҲҲл¶ҖмӢңлӢӨ. кё°лҠҘмһҗкё°кіөлӘ…мҳҒмғҒ(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м–‘м „мһҗл°©м¶ңлӢЁмёөмҙ¬мҳҒ(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л“ұ мІЁлӢЁ лҮҢмҳҒмғҒ кё°мҲ мқҖ мӮҙм•„мһҲлҠ” мқёк°„мқҳ лҮҢ нҷңлҸҷмқ„ мӢӨмӢңк°„мңјлЎң л“Өм—¬лӢӨліј мҲҳ мһҲкІҢ н•ҳмҳҖкі лҮҢмӢ¬л¶Җмһҗк·№мҲ (deep brain stimulation, DBS), кІҪл‘җк°ңмһҗкё°мһҗк·№мҲ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кіј к°ҷмқҖ лҮҢмЎ°м Ҳ кё°мҲ мқҖ нҢҢнӮЁмҠЁлі‘, мҡ°мҡёмҰқ л“ұ лӮңм№ҳм„ұ лҮҢм§Ҳнҷҳ м№ҳлЈҢм—җ мғҲлЎңмҡҙ к°ҖлҠҘм„ұмқ„ м—ҙм—ҲлӢӨ. мқҙлҹ¬н•ң л°ңм „мқҖ лҮҢ кё°лҠҘм—җ лҢҖн•ң мҡ°лҰ¬мқҳ мқҙн•ҙлҘј мӢ¬нҷ”мӢңнӮӨкі м§Ҳлі‘ м№ҳлЈҢмқҳ м§ҖнҸүмқ„ л„“нҳ”м§Җл§Ң лҸҷмӢңм—җ кіјкұ°м—җлҠ” мғҒмғҒн•ҳм§Җ лӘ»н•ҳмҳҖлҚҳ ліөмһЎн•ң мңӨлҰ¬м Ғ, лІ•м Ғ, мӮ¬нҡҢм Ғ м§Ҳл¬ёл“Ө, мҳҲлҘј л“Өл©ҙ вҖңлӮҙ лЁёлҰҝмҶҚ мғқк°Ғмқ„ мҠӨмә”н•ҳм—¬ кұ°м§“л§җ м—¬л¶ҖлҘј нҢҗлӢЁн• мҲҳ мһҲлҠ”к°Җ?вҖқ, вҖңDBSлЎң м„ұкІ©мқҙ ліҖн•ң нҷҳмһҗлҠ” мқҙм „кіј к°ҷмқҖ мӮ¬лһҢмқҙлқјкі н• мҲҳ мһҲлҠ”к°Җ?вҖқ, вҖңмқём§Җкё°лҠҘ к°•нҷ” м•Ҫл¬јмқ„ кұҙк°•н•ң мӮ¬лһҢмқҙ мӮ¬мҡ©н•ҳлҠ” кІғмқҖ м •лӢ№н•ңк°Җ?вҖқ, вҖңмӢқл¬јмқёк°„ мғҒнғң нҷҳмһҗмқҳ лҮҢм—җм„ң нқ¬лҜён•ң мқҳмӢқмқҳ мӢ нҳёк°Җ л°ңкІ¬лҗңлӢӨл©ҙ мҡ°лҰ¬лҠ” к·ёмқҳ мғқлӘ… мң м§Җм—җ лҢҖн•ң кІ°м •мқ„ м–ҙл–»кІҢ лӮҙл Өм•ј н•ҳлҠ”к°Җ?вҖқмҷҖ к°ҷмқҖ м§Ҳл¬ёл“Өмқ„ мҲҳл©ҙ мң„лЎң лҒҢм–ҙмҳ¬л ёлӢӨ.мқҙлҹ¬н•ң м§Ҳл¬ёл“ӨмқҖ лҚ” мқҙмғҒ кіөмғҒкіјн•ҷ мҶҢм„Өмқҳ мҳҒм—ӯмқҙ м•„лӢҲлӢӨ. мқҙлҠ”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Өмқҙ 진лЈҢмӢӨ, мӨ‘нҷҳмһҗмӢӨ, м—°кө¬мӢӨм—җм„ң л§Өмқј л§ҲмЈјн•ҳкі мһҲкұ°лӮҳ кі§ л§ҲмЈјн•ҳкІҢ лҗ нҳ„мӢӨм Ғмқё л”ңл Ҳл§ҲмқҙлӢӨ. мӢ кІҪмңӨлҰ¬(neuroethics)лҠ” л°”лЎң мқҙлҹ¬н•ң л¬ём ңл“Өмқ„ нғҗкө¬н•ҳкі мӢ кІҪкіјн•ҷ кё°мҲ мқҳ мұ…мһ„к°җ мһҲлҠ” мӮ¬мҡ©кіј к·ё мӮ¬нҡҢм Ғ н•Ёмқҳм—җ лҢҖн•ң к·ңлІ”м Ғ нӢҖмқ„ лӘЁмғүн•ҳлҠ” н•ҷл¬ё 분야мқҙлӢӨ[1].мӢ кІҪмңӨлҰ¬лҠ” 2002л…„ мҠӨнғ нҚјл“ң лҢҖн•ҷкөҗм—җм„ң м—ҙлҰ° вҖңNeuroethics: Mapping the FieldвҖқ м»ЁнҚјлҹ°мҠӨлҘј нҶөн•ҙ ліёкІ©м ҒмңјлЎң н•ҷл¬ём Ғ м •мІҙм„ұмқ„ нҷ•лҰҪн•ҳмҳҖлӢӨ[2]. мӢ кІҪмңӨлҰ¬лҠ” нҒ¬кІҢ л‘җ к°Җм§Җ л°©н–ҘмңјлЎң л…јмқҳк°Җ 진н–үлҗңлӢӨ. мІ«м§ёлҠ” мӢ кІҪкіјн•ҷмқҳ мңӨлҰ¬(ethics of neuroscience)лЎң лҮҢмҳҒмғҒ, лҮҢмЎ°м Ҳ кё°мҲ л“ұ мӢ кІҪкіјн•ҷ м—°кө¬мҷҖ мһ„мғҒ м Ғмҡ© кіјм •м—җм„ң л°ңмғқн•ҳлҠ” мңӨлҰ¬м Ғ л¬ём ңл“Өмқ„ лӢӨлЈ¬лӢӨ. мқҙлҠ” лҮҢ м •ліҙмқҳ мӮ¬мғқнҷң ліҙнҳё, мқёкІ©мқҳ лҸҷмқјм„ұ, м •мӢ кё°лҠҘ мҰқк°•(neuroenhancement) л“ұмқҳ мЈјм ңлҘј нҸ¬н•Ён•ңлӢӨ. л‘ҳм§ёлҠ” мңӨлҰ¬мқҳ мӢ кІҪкіјн•ҷ(neuroscience of ethics)мңјлЎң мһҗмң мқҳм§Җ, лҸ„лҚ•м Ғ нҢҗлӢЁ, мұ…мһ„, кіөк°җ л“ұ м „нҶөм Ғмқё мңӨлҰ¬н•ҷ л°Ҹ мІ н•ҷмқҳ мЈјм ңл“Өмқ„ мӢ кІҪкіјн•ҷм Ғ м—°кө¬лҘј нҶөн•ҙ нғҗкө¬н•ҳлҠ” 분야мқҙлӢӨ. мқҙлҠ” нҠ№м • лҮҢмҳҒм—ӯмқҳ мҶҗмғҒмқҙ лҸ„лҚ•м Ғ нҢҗлӢЁ лҠҘл Ҙм—җ лҜём№ҳлҠ” мҳҒн–Ҙ л“ұмқ„ м—°кө¬н•ҳл©° мқёк°„мқҳ ліём„ұкіј мӮ¬нҡҢм Ғ н–үлҸҷм—җ лҢҖн•ң мқҙн•ҙлҘј кіјн•ҷм Ғ нғҗкө¬ мҳҒм—ӯмңјлЎң л°”кҫёкІҢ лҗңлӢӨ[3].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лҮҢмҷҖ л§ҲмқҢмқҳ кІҪкі„м—җм„ң нҷҳмһҗлҘј л§ҢлӮҳлҠ” м „л¬ёк°ҖлЎңм„ң мӢ кІҪмңӨлҰ¬м Ғ лӢҙлЎ мқҳ мӨ‘мӢ¬м—җ м„ң мһҲлӢӨ. лҮҢм§ҲнҷҳмқҖ лӢЁмҲңнһҲ мӢ мІҙ кё°лҠҘмқҳ мһҘм• лҘј л„ҳм–ҙ н•ң мӮ¬лһҢмқҳ кё°м–ө, м„ұкІ©, кҙҖкі„, мҰү мһҗм•„(self) к·ё мһҗмІҙлҘј нқ”л“Өкё° л•Ңл¬ёмқҙлӢӨ. л”°лқј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җкІҢ мӢ кІҪмңӨлҰ¬лҠ” лӢЁмҲңн•ң көҗм–‘мқҙлӮҳ мІ н•ҷм Ғ мӮ¬ліҖмқҙ м•„лӢҲлқј нҷҳмһҗмқҳ м „мқём Ғ кі нҶөмқ„ мқҙн•ҙн•ҳкі мөңм„ мқҳ 진лЈҢлҘј м ңкіөн•ҳкё° мң„н•ң н•„мҲҳм Ғмқё мһ„мғҒ м—ӯлҹүмқҙлқјкі н• мҲҳ мһҲлӢӨ. ліё л…јл¬ём—җм„ңлҠ” көӯлӮҙ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Өм—җкІҢ мӢ кІҪмңӨлҰ¬мқҳ кё°ліё к°ңл…җкіј мЈјмҡ” мҹҒм җл“Өмқ„ мҶҢк°ңн•ҳкі нҠ№нһҲ лҮҢлҘј л°”лқјліҙлҠ” кҙҖм җмқҳ ліҖнҷ”к°Җ мқёк°„мқҳ мқҳмӢқкіј мһҗм•„ мқҙн•ҙм—җ лҜём№ҳлҠ” мҳҒн–Ҙмқ„ мӨ‘мӢ¬мңјлЎң мһ„мғҒм Ғ н•ЁмқҳлҘј л…јн•ҳкі мһҗ н•ңлӢӨ.
- лҮҢ, мқҳмӢқ к·ёлҰ¬кі мһҗм•„: көӯмҶҢлЎ кіј м—°кІ°лЎ мқҳ лҢҖнҷ”
- лҮҢ, мқҳмӢқ к·ёлҰ¬кі мһҗм•„: көӯмҶҢлЎ кіј м—°кІ°лЎ мқҳ лҢҖнҷ”
- 1. көӯмҶҢлЎ м Ғ кҙҖм җ: 'лӮҳ'лҠ” лҮҢмқҳ нҠ№м • л¶Җмң„м—җ мһҲлҠ”к°Җ?
- 1. көӯмҶҢлЎ м Ғ кҙҖм җ: 'лӮҳ'лҠ” лҮҢмқҳ нҠ№м • л¶Җмң„м—җ мһҲлҠ”к°Җ?
19м„ёкё° нҸҙ лёҢлЎңм№ҙ(Paul Broca)к°Җ мўҢмёЎ н•ҳм „л‘җнҡҢмқҳ мҶҗмғҒмқҙ мҡҙлҸҷм„ұ мӢӨм–ҙмҰқмқ„ мң л°ңн•Ёмқ„ л°қнҳҖлӮё кІғмқҖ көӯмҶҢлЎ мқҳ м—ӯмӮ¬м Ғмқё м¶ңл°ңм җмқҙм—ҲлӢӨ. мқҙнӣ„ м№ј лІ лҘҙлӢҲмјҖ(Carl Wernicke)мқҳ к°җк°Ғм„ұ мӢӨм–ҙмҰқ мҳҒм—ӯ л°ңкІ¬кіј н”јлӢҲм–ҙмҠӨ кІҢмқҙм§Җ(Phineas Gage)мқҳ мӮ¬лЎҖлҘј нҶөн•ҙ м „л‘җм—Ҫмқҙ м„ұкІ©кіј мӮ¬нҡҢм Ғ нҢҗлӢЁм—җ кІ°м •м Ғмқё м—ӯн• мқ„ н•ңлӢӨлҠ” мӮ¬мӢӨмқҙ м•Ңл Өм§Җл©ҙм„ң нҠ№м • м •мӢ кё°лҠҘмқҙ лҮҢмқҳ нҠ№м • л¶Җмң„м—җ мһҗлҰ¬ мһЎкі мһҲлӢӨлҠ” мғқк°Ғмқҙ м§Җл°°м Ғмқё нҢЁлҹ¬лӢӨмһ„мңјлЎң мһҗлҰ¬ мһЎм•ҳлӢӨ.мқҙлҹ¬н•ң көӯмҶҢлЎ м Ғ кҙҖм җмқҖ мӢ кІҪн•ҷм Ғ 진лӢЁкіј м№ҳлЈҢм—җ м§ҖлҢҖн•ң кіөн—Ңмқ„ н•ҳмҳҖлӢӨ. нҠ№м • мҰқмғҒмқ„ нҶөн•ҙ лҮҢмқҳ лі‘ліҖ л¶Җмң„лҘј мҳҲмёЎн•ҳкі мҳҒмғҒ кІҖмӮ¬лҘј нҶөн•ҙ мқҙлҘј нҷ•мқён•ҳлҠ” кіјм •мқҖ нҳ„лҢҖ мӢ кІҪкіј 진лЈҢмқҳ к·јк°„мқ„ мқҙлЈ¬лӢӨ. көӯмҶҢлЎ мқҖ мқҳмӢқкіј мһҗм•„м—җ лҢҖн•ҙм„ңлҸ„ к°•л Ҙн•ң н•ЁмқҳлҘј лҚҳ진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м–‘мёЎ н•ҙл§Ҳ мҶҗмғҒмңјлЎң мғҲлЎңмҡҙ кё°м–өмқ„ нҳ•м„ұн•ҳм§Җ лӘ»н•ҳкІҢ лҗң нҷҳмһҗлҠ” кіјкұ°мқҳ мһҗм•„м—җ к°ҮнһҲкІҢ лҗҳл©° мқҙлҠ” кё°м–өмқҙ мһҗм•„мқҳ м—°мҶҚм„ұмқ„ кө¬м„ұн•ҳлҠ” н•өмӢ¬ мҡ”мҶҢмһ„мқ„ мӢңмӮ¬н•ңлӢӨ. м „л‘җмёЎл‘җм—Ҫм№ҳл§Ө(frontotemporal dementia) нҷҳмһҗм—җкІҢм„ң лӮҳнғҖлӮҳлҠ” нғҲм–өм ң, л¬ҙк°җм •, л°ҳмӮ¬нҡҢм Ғ н–үлҸҷмқҖ м „л‘җм—Ҫкё°лҠҘмқҳ мҶҗмғҒмқҙ н•ң мӮ¬лһҢмқҳ м„ұкІ©кіј лҸ„лҚ•м Ғ н’Ҳм„ұмқ„ м–ҙл–»кІҢ 붕кҙҙмӢңнӮ¬ мҲҳ мһҲлҠ”м§ҖлҘј к·№лӘ…н•ҳкІҢ ліҙм—¬мӨҖлӢӨ.көӯмҶҢлЎ м Ғ кҙҖм җм—җм„ң мһҗм•„лҠ” лҮҢмқҳ нҠ№м • н•өмӢ¬ мҳҒм—ӯл“Ө(critical nodes)мқҙ мҲҳн–үн•ҳлҠ” кё°лҠҘл“Өмқҳ мҙқн•©мңјлЎң мқҙн•ҙлҗ мҲҳ мһҲлӢӨ. мқҙ кҙҖм җм—җ л”°лҘҙл©ҙ н•ҙлӢ№ мҳҒм—ӯмқҙ мҶҗмғҒлҗ кІҪмҡ° мһҗм•„мқҳ нҠ№м • мёЎл©ҙ м—ӯмӢң мҶҢмӢӨлҗңлӢӨ. мқҙлҠ” нҷҳмһҗмҷҖ ліҙнҳёмһҗм—җкІҢ м§Ҳлі‘мқ„ лӘ…нҷ•н•ҳкІҢ м„ӨлӘ…н•ҳкі мҳҲнӣ„лҘј мҳҲмёЎн•ҳлҠ” лҚ° лҸ„мӣҖмқ„ мЈјм§Җл§Ң лҸҷмӢңм—җ мқёк°„мқҳ мһҗм•„лҘј лӢӨмҶҢ кё°кі„лЎ м Ғмқҙкі нҷҳмӣҗмЈјмқҳм ҒмңјлЎң л°”лқјліј мң„н—ҳмқ„ лӮҙнҸ¬н•ңлӢӨ. вҖңкё°м–өмқ„ м ҖмһҘн•ҳлҠ” н•ҙл§Ҳк°Җ мҶҗмғҒлҗҳм—ҲмңјлӢҲ лӢ№мӢ мқҳ м•„лӮҙлҠ” лҚ” мқҙмғҒ мҳҲм „мқҳ к·ёл…Җк°Җ м•„лӢҷлӢҲлӢӨвҖқлқјлҠ” м„ӨлӘ…мқҖ мӮ¬мӢӨм—җ кё°л°ҳн•ҳм§Җл§Ң н•ң мқёк°„мқҳ мЎҙм—„м„ұкіј м •мІҙм„ұмқҳ л¬ём ңлҘј лӢЁмҲңнһҲ нҠ№м • лҮҢ л¶Җмң„мқҳ кё°лҠҘ л¶Җм „мңјлЎң м№ҳнҷҳн•ҳм—¬ лІ„лҰҙ мҲҳ мһҲкё° л•Ңл¬ёмқҙлӢӨ.- 2. м—°кІ°лЎ м Ғ кҙҖм җ: 'лӮҳ'лҠ” лҮҢ мҶҚмқҳ көҗн–ҘкіЎмқҙлӢӨ
- 2. м—°кІ°лЎ м Ғ кҙҖм җ: 'лӮҳ'лҠ” лҮҢ мҶҚмқҳ көҗн–ҘкіЎмқҙлӢӨ
21м„ёкё° л“Өм–ҙ л°ңм „н•ң кё°лҠҘм Ғ лҮҢмҳҒмғҒ кё°мҲ кіј к·ёлһҳн”„ мқҙлЎ (graph theory) л“ұмқҖ лҮҢк°Җ лҸ…лҰҪм ҒмңјлЎң мһ‘лҸҷн•ҳлҠ” лӘЁл“Ҳмқҳ 집합мқҙ м•„лӢҲлқј мҲҳл§ҺмқҖ мӢ кІҪм„ёнҸ¬мҷҖ лҮҢмҳҒм—ӯл“Өмқҙ ліөмһЎн•ҳкІҢ м—°кІ°лҗң кұ°лҢҖн•ң л„ӨнҠёмӣҢнҒ¬(network)лқјлҠ” мӮ¬мӢӨмқ„ л°қнҳҖлғҲлӢӨ[5]. мқҙ м—°кІ°лЎ м Ғ кҙҖм җм—җ л”°лҘҙл©ҙ нҠ№м • кё°лҠҘмқҖ н•ң мҳҒм—ӯм—җ көӯн•ңлҗң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м—¬лҹ¬ лҮҢмҳҒм—ӯмқҙ мӢңкіөк°„м ҒмңјлЎң нҳ‘мқ‘н•ҳл©° л§Ңл“Өм–ҙлӮҙлҠ” м°Ҫл°ңм Ғ мҶҚм„ұ(emergent property)мқҙлӢӨ.нҠ№нһҲ мЈјлӘ©л°ӣлҠ” кІғмқҙ л°”лЎң л””нҸҙнҠё лӘЁл“ң л„ӨнҠёмӣҢнҒ¬(default mode network, DMN)мқҙлӢӨ. DMNмқҖ мҡ°лҰ¬к°Җ м•„л¬ҙлҹ° кіјм ңм—җ 집мӨ‘н•ҳм§Җ м•Ҡкі нңҙмӢқн• л•Ң нҷңм„ұнҷ”лҗҳлҠ” лҮҢмҳҒм—ӯл“Өмқҳ 집합мңјлЎң лӮҙмёЎ м „м „л‘җн”јм§Ҳ, нӣ„мёЎ лҢҖмғҒн”јм§Ҳ, л‘җм •м—Ҫ н•ҳл¶Җ л“ұмқ„ нҸ¬н•Ён•ңлӢӨ. мқҙ л„ӨнҠёмӣҢнҒ¬лҠ” мһҗм „м Ғ кё°м–өмқҳ нҡҢмғҒ, лҜёлһҳ кі„нҡҚ, нғҖмқёмқҳ л§ҲмқҢ мқҙн•ҙ л“ұ мһҗкё°(self)мҷҖ кҙҖл Ёлҗң лӮҙм Ғ мӮ¬кі кіјм •м—җ к№Ҡмқҙ кҙҖм—¬н•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һҲлӢӨ[4]. DMNмқҳ л°ңкІ¬мқҖ мһҗм•„к°Җ лҮҢмқҳ нҠ№м • мЈјмҶҢм—җ мң„м№ҳн•ҳ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м—¬лҹ¬ лҮҢмҳҒм—ӯмқҙ н•Ёк»ҳ м—°мЈјн•ҳлҠ” көҗн–ҘкіЎкіј к°ҷмқҙ м—ӯлҸҷм Ғмқё л„ӨнҠёмӣҢнҒ¬ нҷңлҸҷмқҳ кІ°кіјл¬јмқј мҲҳ мһҲлӢӨлҠ” к°ҖлҠҘм„ұмқ„ м ңмӢңн•ҳмҳҖлӢӨ.м—°кІ°лЎ м Ғ кҙҖм җмқҖ көӯмҶҢлЎ л§ҢмңјлЎңлҠ” м„ӨлӘ…н•ҳкё° м–ҙл Өмӣ лҚҳ м—¬лҹ¬ мһ„мғҒ нҳ„мғҒм—җ мғҲлЎңмҡҙ нҶөм°°мқ„ м ңкіөн•ң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мқҳмӢқмһҘм• (disorders of consciousness) нҷҳмһҗл“Өмқ„ мғқк°Ғн•ҙ ліҙмһҗ. мӢқл¬јмқёк°„ мғҒнғң(vegetative state) [7]лӮҳ мөңмҶҢ мқҳмӢқ мғҒнғң(minimally conscious state)лҠ” нҠ№м • лҮҢмҳҒм—ӯмқҳ көӯмҶҢм Ғ мҶҗмғҒл§ҢмңјлЎңлҠ” мҷ„м „нһҲ м„ӨлӘ…лҗҳм§Җ м•ҠлҠ”лӢӨ. мөңк·ј м—°кө¬л“ӨмқҖ мқҙл“Ө нҷҳмһҗмқҳ лҮҢм—җм„ң DMNмқ„ 비лЎҜн•ң лҢҖк·ңлӘЁ лҮҢ л„ӨнҠёмӣҢнҒ¬мқҳ м—°кІ°м„ұмқҙ мӢ¬к°Ғн•ҳкІҢ 붕кҙҙлҗҳм–ҙ мһҲмқҢмқ„ ліҙм—¬мӨҖлӢӨ. мҰү мқҳмӢқмқҖ лҮҢмқҳ нҠ№м • мҠӨмң„м№ҳк°Җ мјңм§Җкі кәјм§ҖлҠ” л¬ём ңк°Җ м•„лӢҲлқј кҙ‘лІ”мң„н•ң м •ліҙ нҶөн•©мқ„ лӢҙлӢ№н•ҳлҠ” л„ӨнҠёмӣҢнҒ¬мқҳ кё°лҠҘмһҘм• лЎң мқён•ҳм—¬ л°ңмғқн•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лҠ” мқҳмӢқмһҘм• нҷҳмһҗмқҳ мқҖл°Җ мқҳмӢқ(covert consciousness)мқ„ нғҗм§Җн•ҳл ӨлҠ” л…ёл Ҙ[6]кіј л„ӨнҠёмӣҢнҒ¬ кё°лҠҘмқ„ нҡҢліөмӢңнӮӨкё° мң„н•ң TMSлӮҳ DBS к°ҷмқҖ мғҲлЎңмҡҙ м№ҳлЈҢлІ• к°ңл°ңмқҳ мқҙлЎ м Ғ кё°л°ҳмқҙ лҗңлӢӨ.м№ҳл§Ө м—ӯмӢң л§Ҳм°¬к°Җм§ҖлӢӨ. м•Ңмё н•ҳмқҙлЁёлі‘ мҙҲкё°м—җлҠ” н•ҙл§Ҳмқҳ мң„축мқҙ л‘җл“ңлҹ¬м§Җм§Җл§Ң лі‘мқҙ 진н–үлҗЁм—җ л”°лқј DMNмқ„ нҸ¬н•Ён•ң м—¬лҹ¬ л„ӨнҠёмӣҢнҒ¬мқҳ м—°кІ°м„ұмқҙ м җм°Ё м•Ҫнҷ”лҗҳкі мқҙлҠ” кё°м–өл Ҙ м Җн•ҳлҘј л„ҳм–ҙ мһҗм•„к°җмқҳ мғҒмӢӨлЎң мқҙм–ҙ진лӢӨ. м—°кІ°лЎ м Ғ кҙҖм җмқҖ мһҗм•„к°Җ лӢЁмқј кё°лҠҘмқҳ мғҒмӢӨмқҙ м•„лӢҢ лҮҢ м „мІҙмқҳ кҙҖкі„лҘј л§әлҠ” л°©мӢқ, мҰү м—°кІ°мІҙ(connectome)мқҳ ліҖнҷ”м—җ л”°лқј м„ңм„ңнһҲ ліҖн•ҙк°ҖлҠ” кіјм •мңјлЎң мқҙн•ҙн•ҳкІҢ н•ңлӢӨ. мқҙлҠ” нҷҳмһҗлҘј кё°м–өмқ„ мһғмқҖ мӮ¬лһҢмңјлЎңл§Ң ліҙ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іҖнҷ”лҗң м—°кІ°м„ұ мҶҚм—җм„ң мғҲлЎңмҡҙ л°©мӢқмңјлЎң м„ёмғҒкіј кҙҖкі„лҘј л§әмңјл©° м—¬м „нһҲ мЎҙмһ¬н•ҳлҠ” н•ң лӘ…мқҳ мқёкІ©мІҙлЎң л°”лқјліҙкІҢ н•ҳлҠ” мӨ‘мҡ”н•ң кҙҖм җмқҳ м „нҷҳмқ„ м ңкіөн•ңлӢӨ.- 3. л‘җ кҙҖм җмқҳ нҶөн•©: мһ„мғҒ нҳ„мһҘмқ„ мң„н•ң м ңм–ё
- 3. л‘җ кҙҖм җмқҳ нҶөн•©: мһ„мғҒ нҳ„мһҘмқ„ мң„н•ң м ңм–ё
1) лҮҢмӢ¬л¶Җмһҗк·№мҲ кіј мқёкІ©мқҳ ліҖнҷ”
1) лҮҢмӢ¬л¶Җмһҗк·№мҲ кіј мқёкІ©мқҳ ліҖнҷ”
нҢҢнӮЁмҠЁлі‘ нҷҳмһҗм—җкІҢ DBSлҘј мӢңн–үн•ң нӣ„ мҡҙлҸҷ мҰқмғҒмқҖ нҳём „лҗҳм—Ҳм§Җл§Ң 충лҸҷм ҒмңјлЎң ліҖн•ҳкұ°лӮҳ мҡ°мҡён•ҙм§ҖлҠ” кІҪмҡ°к°Җ мһҲлӢӨ[9]. көӯмҶҢлЎ м ҒмңјлЎңлҠ” мһҗк·№ л¶Җмң„(мӢңмғҒл°‘н•ө л“ұ)мқҳ кё°лҠҘ мЎ°м ҲлЎң м„ӨлӘ…н• мҲҳ мһҲм§Җл§Ң м—°кІ°лЎ м ҒмңјлЎңлҠ” н•ҙлӢ№ мһҗк·№мқҙ к°җм •кіј ліҙмғҒм—җ кҙҖл Ёлҗң кҙ‘лІ”мң„н•ң лҮҢ л„ӨнҠёмӣҢнҒ¬м—җ лҜём№ң мқҳлҸ„м№ҳ м•ҠмқҖ кІ°кіјлЎң мқҙн•ҙн• мҲҳ мһҲлӢӨ. мқҙлҠ” мӢңмҲ м „ нҷҳмһҗмҷҖ ліҙнҳёмһҗм—җкІҢ мҡҙлҸҷ кё°лҠҘмқҳ нҡҢліөлҝҗл§Ң м•„лӢҲлқј мһҗмӢ мқҙ мһҗмӢ лӢөкІҢ лҠҗк»ҙм§Җм§Җ м•Ҡмқ„ мҲҳ мһҲлҠ” мқёкІ© ліҖнҷ”мқҳ к°ҖлҠҘм„ұм—җ лҢҖн•ҙ 충분нһҲ м„ӨлӘ…н•ҳкі лҸҷмқҳлҘј кө¬н•ҳлҠ” кіјм •(informed consent)мқҳ мӨ‘мҡ”м„ұмқ„ к°•мЎ°н•ңлӢӨ[10].2) мқҳмӢқмһҘм•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 кІ°м •
2) мқҳмӢқмһҘм•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 кІ°м •
fMRI л“ұм—җм„ң лҜём„ён•ң мқҳмӢқмқҳ мҰқкұ°к°Җ л°ңкІ¬лҗң мөңмҶҢ мқҳмӢқ мғҒнғң нҷҳмһҗм—җ лҢҖн•ҙ мҡ°лҰ¬лҠ” м–ҙл–Ө мңӨлҰ¬м Ғ мұ…мһ„мқ„ м§ҖлҠ”к°Җ? көӯмҶҢлЎ м Ғ кҙҖм җл§ҢмңјлЎңлҠ” лҮҢмқҳ мқјл¶Җ мҳҒм—ӯмқҙ мӮҙм•„мһҲлӢӨлҠ” мӮ¬мӢӨ мҷём—җ л§ҺмқҖ кІғмқ„ м•Ңкё° м–ҙл өлӢӨ. к·ёлҹ¬лӮҳ м—°кІ°лЎ м Ғ кҙҖм җмқҖ DMNкіј к°ҷмқҖ мқҳмӢқ кҙҖл Ё л„ӨнҠёмӣҢнҒ¬мқҳ мһ мһ¬м Ғ нҡҢліө к°ҖлҠҘм„ұмқ„ нғҗмғүн•ҳкІҢ н•ҳкі нҷҳмһҗмқҳ мЈјкҙҖм Ғ кІҪн—ҳмқҳ м§Ҳ(quality of life)м—җ лҢҖн•ң лҚ”мҡұ мӢ мӨ‘н•ң м ‘к·јмқ„ мҡ”кө¬н•ңлӢӨ. мқҙлҠ” м—°лӘ… м№ҳлЈҢ мӨ‘лӢЁкіј к°ҷмқҖ м–ҙл Өмҡҙ кІ°м •мқ„ лӮҙлҰҙ л•Ң лҮҢмқҳ кө¬мЎ°м Ғ мҶҗмғҒлҝҗл§Ң м•„лӢҲлқј кё°лҠҘм Ғ м—°кІ°м„ұмқҳ нҡҢліө к°ҖлҠҘм„ұк№Ңм§Җ кі л Өн•ҙм•ј н•Ёмқ„ мӢңмӮ¬н•ңлӢӨ[8].
көӯмҶҢлЎ кіј м—°кІ°лЎ мқҖ м„ңлЎң лҢҖлҰҪн•ҳлҠ” к°ңл…җмқҙ м•„лӢҲлқј мғҒнҳёліҙмҷ„м Ғмқё кҙҖкі„м—җ мһҲлӢӨ. л„ӨнҠёмӣҢнҒ¬лҠ” л…ёл“ң(node)мҷҖ м—Јм§Җ(edge)лЎң кө¬м„ұлҗҳл©° нҠ№м • кё°лҠҘмқ„ мҲҳн–үн•ҳлҠ” н•өмӢ¬ л…ёл“ң(көӯмҶҢлЎ м Ғ мӨ‘мҡ”м„ұ)мҷҖ мқҙл“Өмқ„ м—°кІ°н•ҳлҠ” м—Јм§Җмқҳ нҡЁмңЁм„ұ(м—°кІ°лЎ м Ғ мӨ‘мҡ”м„ұ) лӘЁл‘җк°Җ мӨ‘мҡ”н•ҳлӢӨ. лҮҢмЎёмӨ‘мңјлЎң мқён•ң мӢӨм–ҙмҰқ нҷҳмһҗлҘј 진лЈҢн• л•Ң мҡ°лҰ¬лҠ” мҶҗмғҒлҗң лёҢлЎңм№ҙ мҳҒм—ӯ(л…ёл“ң)м—җ мЈјлӘ©н•ҳм§Җл§Ң лҸҷмӢңм—җ к·ё нҷҳмһҗмқҳ нҡҢліө кіјм •мқҙ мЈјліҖ лҮҢмҳҒм—ӯкіјмқҳ мғҲлЎңмҡҙ м—°кІ°(л„ӨнҠёмӣҢнҒ¬ мһ¬кө¬м„ұ)мқ„ нҶөн•ҙ мқҙлЈЁм–ҙ진лӢӨлҠ” мӮ¬мӢӨ лҳҗн•ң м•Ңкі мһҲлӢӨ.л”°лқј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мқҙ л‘җ к°Җм§Җ кҙҖм җмқ„ мң м—°н•ҳкІҢ нҶөн•©н•ҳм—¬ нҷҳмһҗлҘј мқҙн•ҙн•ҙм•ј н•ңлӢӨ. көӯмҶҢм Ғ лі‘ліҖмқ„ м •нҷ•нһҲ 진лӢЁн•ҳлҠ” м „нҶөм Ғ м—ӯлҹү мң„м—җ к·ё лі‘ліҖмқҙ нҷҳмһҗмқҳ лҮҢ м „мІҙ л„ӨнҠёмӣҢнҒ¬мҷҖ мғҒнҳёмһ‘мҡ©н•ҳл©° м–ҙл–»кІҢ к·ёмқҳ мқҳмӢқ, н–үлҸҷ, к¶Ғк·№м ҒмңјлЎң мһҗм•„к°җмқ„ ліҖнҷ”мӢңнӮӨлҠ”м§ҖлҘј мҙқмІҙм ҒмңјлЎң нҢҢм•…н•ҙм•ј н•ңлӢӨ. мқҙлҹ¬н•ң нҶөн•©м Ғ кҙҖм җмқҖ лӢӨмқҢкіј к°ҷмқҖ мӢ кІҪмңӨлҰ¬м Ғ л”ңл Ҳл§Ҳ мғҒнҷ©м—җм„ң лҚ”мҡұ к№Ҡмқҙ мһҲлҠ” м„ұм°°мқ„ к°ҖлҠҘн•ҳкІҢ н•ңлӢӨ.
мӢ кІҪн•ҷмқҳ м—ӯмӮ¬лҠ” лҮҢкё°лҠҘмқҳ мң„м№ҳлҘј м°ҫмңјл ӨлҠ” көӯмҶҢлЎ (localizationism) мқҳ м—ӯмӮ¬мҷҖ к¶ӨлҘј к°ҷмқҙн•ңлӢӨкі н•ҙлҸ„ кіјм–ёмқҙ м•„лӢҲлӢӨ. к·ёлҹ¬лӮҳ нҳ„лҢҖ мӢ кІҪкіјн•ҷмқҖ к°ңлі„ лҮҢмҳҒм—ӯмқҳ кё°лҠҘмқ„ л„ҳм–ҙ мқҙл“Ө к°„мқҳ мғҒнҳёмһ‘мҡ©, мҰү л„ӨнҠёмӣҢнҒ¬мқҳ мӨ‘мҡ”м„ұмқ„ к°•мЎ°н•ҳлҠ” м—°кІ°лЎ (connectionism)мңјлЎң нҢЁлҹ¬лӢӨмһ„мқ„ м „нҷҳн•ҳкі мһҲлӢӨ. мқҙ л‘җ к°Җм§Җ кҙҖм җмқҖ мқёк°„мқҳ кі мң„ м •мӢ кё°лҠҘ, нҠ№нһҲ мқҳмӢқкіј мһҗм•„лҘј мқҙн•ҙн•ҳлҠ” л°©мӢқм—җ к№ҠмқҖ мҳҒн–Ҙмқ„ лҜём№ҳл©°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к°Җ нҷҳмһҗлҘј мқҙн•ҙн•ҳлҠ” нӢҖмқ„ нҳ•м„ұн•ңлӢӨ.
- мһ„мғҒ нҳ„мһҘм—җм„ң л§ҲмЈјн•ҳлҠ” мЈјмҡ” мӢ кІҪмңӨлҰ¬ мҹҒм җ
- мһ„мғҒ нҳ„мһҘм—җм„ң л§ҲмЈјн•ҳлҠ” мЈјмҡ” мӢ кІҪмңӨлҰ¬ мҹҒм җ
- 1. лҮҢмҳҒмғҒкіј мҡ°м—°нһҲ л°ңкІ¬лҗң мқҙмғҒ мҶҢкІ¬(incidental findings)
- 1. лҮҢмҳҒмғҒкіј мҡ°м—°нһҲ л°ңкІ¬лҗң мқҙмғҒ мҶҢкІ¬(incidental findings)
м—°кө¬лӮҳ лӢӨлҘё лӘ©м ҒмңјлЎң мӢңн–үн•ң лҮҢMRIм—җм„ң мҡ°м—°нһҲ лҮҢмў…м–‘, лҮҢлҸҷл§ҘлҘҳ, лҜёнҢҢм—ҙ лҸҷм •л§Ҙкё°нҳ• л“ұмқҙ л°ңкІ¬лҗҳлҠ” кІҪмҡ°к°Җ мҰқк°Җн•ҳкі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мҡ°м—°мў…(incidentaloma)мқ„ нҷҳмһҗм—җкІҢ м•Ңл Өм•ј н•ҳлҠ”к°Җ? м•ҢлҰ°лӢӨл©ҙ м–ҙл””к№Ңм§Җ, м–ҙл–»кІҢ м„ӨлӘ…н•ҙм•ј н•ҳлҠ”к°Җ? мҳҲл°©м Ғ м№ҳлЈҢмқҳ мқҙл“қкіј мң„н—ҳмқҙ л¶Ҳнҷ•мӢӨн•ң кІҪмҡ° нҷҳмһҗмқҳ м•Ң к¶ҢлҰ¬мҷҖ л¶Ҳм•Ҳмқ„ мң л°ңн•ҳм§Җ м•Ҡмқ„ к¶ҢлҰ¬ мӮ¬мқҙм—җм„ң м–ҙл–»кІҢ к· нҳ•мқ„ мһЎм•„м•ј н•ҳлҠ”к°Җ? мқҙлҠ” лӢЁмҲңнһҲ мқҳн•ҷм Ғ нҢҗлӢЁмқ„ л„ҳм–ҙ нҷҳмһҗмқҳ к°Җм№ҳкҙҖкіј мһҗмңЁм„ұмқ„ мЎҙмӨ‘н•ҳлҠ” 섬세н•ң мҶҢнҶөмқҙ мҡ”кө¬лҗҳлҠ” лҢҖн‘ңм Ғмқё мӢ кІҪмңӨлҰ¬ л¬ём ңмқҙлӢӨ[11].- 2. м№ҳл§ӨмҷҖ мһҗмңЁм„ұ: кіјкұ°мқҳ лӮҳмҷҖ нҳ„мһ¬мқҳ лӮҳ
- 2. м№ҳл§ӨмҷҖ мһҗмңЁм„ұ: кіјкұ°мқҳ лӮҳмҷҖ нҳ„мһ¬мқҳ лӮҳ
м№ҳл§Ө нҷҳмһҗлҠ” м§Ҳлі‘мқҙ 진н–үлҗЁм—җ л”°лқј м җм°Ё мқҳмӮ¬кІ°м •лҠҘл Ҙмқ„ мғҒмӢӨн•ңлӢӨ. кұҙк°•н•ҳмҳҖмқ„ л•Ң мһ‘м„ұн•ҙ л‘” мӮ¬м „м—°лӘ…мқҳлЈҢмқҳн–Ҙм„ңк°Җ нҳ„мһ¬мқҳ нҷҳмһҗм—җкІҢлҸ„ мң нҡЁн•ңк°Җ[12]? мҳҲлҘј л“Өм–ҙ кіјкұ°м—җлҠ” мӢқл¬јмқёк°„мқҙ лҗҳл©ҙ м—°лӘ… м№ҳлЈҢлҘј кұ°л¶Җн•ңлӢӨкі н•ҳмҳҖлҚҳ нҷҳмһҗк°Җ мӨ‘мҰқ м№ҳл§Ө мғҒнғңм—җм„ң к°җм—јлі‘м—җ кұёл ёмқ„ л•Ң лҜёмҶҢлҘј м§Җмңјл©° мӢқмӮ¬лҘј мһҳ л°ӣм•„лЁ№лҠ”лӢӨл©ҙ мҡ°лҰ¬лҠ” к·ёмқҳ нҳ„мһ¬мқҳ мӮ¶мқҳ м§Ҳмқ„ м–ҙл–»кІҢ нҸүк°Җн•ҳкі н•ӯмғқм ң м№ҳлЈҢлҘј кІ°м •н•ҙм•ј н•ҳлҠ”к°Җ? мқҙлҠ” к°ңмқёмқҳ м •мІҙм„ұмқҙ мӢңк°„мқ„ мҙҲмӣ”н•ҳм—¬ лҸҷмқјн•ҳкІҢ мң м§ҖлҗҳлҠ”м§Җм—җ лҢҖн•ң мІ н•ҷм Ғ м§Ҳл¬ёкіј л§һлӢҝм•„ мһҲмңјл©° нҷҳмһҗмқҳ мөңм„ мқҳ мқҙмқө(best interest)мқ„ нҢҗлӢЁн•ҳкё° мң„н•ң ліҙнҳёмһҗ л°Ҹ лӢӨн•ҷм ң нҢҖкіјмқҳ к№Ҡмқҙ мһҲлҠ” л…јмқҳлҘј н•„мҡ”лЎң н•ңлӢӨ[13].- 3. мӢ кІҪкё°лҠҘ мҰқк°•(neuroenhancement)мқҳ мң нҳ№
- 3. мӢ кІҪкё°лҠҘ мҰқк°•(neuroenhancement)мқҳ мң нҳ№
мЈјмқҳл ҘкІ°н•Қ кіјмһүн–үлҸҷмһҘм•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м№ҳлЈҢм ңмқё л©”нӢёнҺҳлӢҲлҚ°мқҙнҠёлӮҳ кё°л©ҙмҰқ м№ҳлЈҢм ңмқё лӘЁлӢӨн”јлӢҗ л“ұмқҙ мқём§Җкё°лҠҘмқ„ н–ҘмғҒмӢңнӮӨлҠ” м•Ҫл¬јлЎң м•Ңл Өм§Җл©ҙм„ң м§Ҳлі‘мқҙ м—ҶлҠ” н•ҷмғқмқҙлӮҳ м§ҒмһҘмқёл“Өмқҙ мқҙлҘј мІҳл°©мқ„ л°ӣмңјл ӨлҠ” кІҪмҡ°к°Җ мһҲлӢӨ.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мқҙлҹ¬н•ң мҡ”кө¬м—җ м–ҙл–»кІҢ мқ‘н•ҙм•ј н•ҳлҠ”к°Җ? м№ҳлЈҢмҷҖ мҰқк°•мқҳ кІҪкі„лҠ” м–ҙл””мқёк°Җ? лӘЁл“ мӮ¬лһҢмқҙ лҚ” лҳ‘лҳ‘н•ҙм§Ҳ кё°нҡҢлҘј к°–лҠ” кІғмқҙ мӮ¬нҡҢм ҒмңјлЎң л°”лһҢм§Ғн•ңк°Җ? мқҙлҠ” мһҗмӣҗмқҳ кіөм •н•ң 분배, мӮ¬нҡҢм Ғ кІҪмҹҒмқҳ мӢ¬нҷ”, мқёк°„ ліём—°мқҳ лҠҘл Ҙм—җ лҢҖн•ң к°Җм№ҳ нҢҗлӢЁ л“ұ ліөн•©м Ғмқё мӮ¬нҡҢм Ғ, мңӨлҰ¬м Ғ л…јмқҳлҘј мҲҳл°ҳн•ңлӢӨ[14].- 4. лҮҢмӮ¬мҷҖ мһҘкё° кё°мҰқ
- 4. лҮҢмӮ¬мҷҖ мһҘкё° кё°мҰқ
лҮҢмӮ¬ нҢҗм •мқҖ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Ө‘мҡ”н•ң лІ•м Ғ, мңӨлҰ¬м Ғ мұ…л¬ҙ мӨ‘ н•ҳлӮҳмқҙлӢӨ. лҮҢмӮ¬ нҢҗм • кё°мӨҖмқҳ м •нҷ•м„ұкіј мӢ лў°м„ұмқ„ нҷ•ліҙн•ҳлҠ” кІғмқҖ л¬јлЎ , лҮҢмқҳ мЈҪмқҢмқ„ н•ң мқёк°„мқҳ мЈҪмқҢмңјлЎң л°ӣм•„л“Өмқҙкё° м–ҙл ӨмӣҢн•ҳлҠ” ліҙнҳёмһҗмқҳ мҠ¬н””кіј л¬ёнҷ”м Ғ м •м„ңлҘј мқҙн•ҙн•ҳкі мҶҢнҶөн•ҳлҠ” кіјм •мқҙ л§Өмҡ° мӨ‘мҡ”н•ҳлӢӨ. лҮҢмӮ¬лҘј л‘ҳлҹ¬мӢј л…јмқҳлҠ” мғқлӘ…кіј мЈҪмқҢм—җ лҢҖн•ң мӮ¬нҡҢм Ғ н•©мқҳлҘј л°ҳмҳҒн•ҳл©°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мқҙ кіјм •м—җм„ң кіјн•ҷм Ғ м „л¬ёк°Җмқҙмһҗ к№ҠмқҖ кіөк°җмқ„ м§ҖлӢҢ мғҒлӢҙк°ҖлЎңм„ңмқҳ м—ӯн• мқ„ лҸҷмӢңм—җ мҲҳн–үн•ҙм•ј н•ңлӢӨ[15].
м•һм„ң л…јмқҳн•ң мқҙлЎ м Ғ нӢҖмқ„ л°”нғ•мңјлЎ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Өмқҙ мһ„мғҒ нҳ„мһҘм—җм„ң мһҗмЈј л§ҲмЈјн•ҳлҠ” кө¬мІҙм Ғмқё мӢ кІҪмңӨлҰ¬ мҹҒм җл“Өмқ„ мӮҙнҺҙліҙкі мһҗ н•ңлӢӨ.
- кІ° лЎ
- кІ° лЎ
мӢ кІҪмңӨлҰ¬лҠ” лҚ” мқҙмғҒ мӢ кІҪкіјн•ҷ м—°кө¬мһҗл“Өл§Ңмқҳ лӢҙлЎ мқҙ м•„лӢҲлӢӨ. мқҙлҠ” лҮҢм§ҲнҷҳмңјлЎң кі нҶөл°ӣлҠ” нҷҳмһҗмҷҖ к·ё к°ҖмЎұмқҳ мӮ¶м—җ м§Ғм ‘м Ғмқё мҳҒн–Ҙмқ„ лҜём№ҳлҠ”, лӘЁл“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Ҙј мң„н•ң мӢӨмІңм Ғ н•ҷл¬ёмқҙлӢӨ. мІЁлӢЁмӢ кІҪкіјн•ҷ кё°мҲ мқҖ мҡ°лҰ¬м—җкІҢ м „лЎҖ м—ҶлҠ” лҠҘл Ҙмқ„ л¶Җм—¬н•ҳмҳҖм§Җл§Ң к·ё лҠҘл ҘмқҖ лҸҷмӢңм—җ л¬ҙкұ°мҡҙ мұ…мһ„мқ„ лҸҷл°ҳн•ңлӢӨ. мҡ°лҰ¬лҠ” лҮҢ мҠӨмә” мқҙлҜём§Җм—җм„ң лі‘ліҖмқ„ м°ҫлҠ” кІғмқ„ л„ҳм–ҙ к·ё лі‘ліҖмқҙ н•ң мӮ¬лһҢмқҳ мӮ¶кіј м •мІҙм„ұм—җ м–ҙл–Ө мқҳлҜёлҘј к°–лҠ”м§Җ м„ұм°°н•ҙм•ј н•ңлӢӨ.лҮҢкё°лҠҘм—җ лҢҖн•ң көӯмҶҢлЎ м Ғ мқҙн•ҙлҠ” нҠ№м • м§Ҳнҷҳмқҳ 진лӢЁкіј м№ҳлЈҢм—җ мһҲм–ҙ м—¬м „нһҲ н•өмӢ¬м Ғмқё лҸ„кө¬лЎң нҷңмҡ©лҗң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ҹ¬н•ң м ‘к·јл§ҢмңјлЎңлҠ” мқёк°„ м •мӢ мқҳ ліём§Ҳмқ„ мҳЁм „нһҲ м„ӨлӘ…н•ҳкё° м–ҙл өлӢӨ. мқҳмӢқкіј мһҗм•„лҘј лӢЁмқј мҳҒм—ӯмқҳ кё°лҠҘм—җ көӯн•ңн•ҳм§Җ м•Ҡкі лҮҢмқҳ м—¬лҹ¬ мҳҒм—ӯмқҙ мғҒнҳёмһ‘мҡ©н•ҳм—¬ нҳ•м„ұн•ҳлҠ” м—ӯлҸҷм Ғ л„ӨнҠёмӣҢнҒ¬мқҳ мӮ°л¬јмқҙлқјлҠ” м—°кІ°лЎ м Ғ кҙҖм җмңјлЎң л°”лқјліёлӢӨл©ҙ мҡ°лҰ¬лҠ” 비лЎңмҶҢ нҷҳмһҗлҘј нҢҢнҺёнҷ”лҗң мҰқмғҒмқҳ 집합мқҙ м•„лӢҢ кі мң н•ң м—ӯмӮ¬лҘј м§ҖлӢҢ м „мқём Ғ мЎҙмһ¬лЎң мқҙн•ҙн• мҲҳ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көӯмҶҢлЎ кіј м—°кІ°лЎ мқҳ нҶөн•©м Ғ кҙҖм җмқҖ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к°Җ мһ„мғҒ нҳ„мһҘм—җм„ң л§ҲмЈјн•ҳлҠ” мҲҳл§ҺмқҖ мңӨлҰ¬м Ғ л”ңл Ҳл§Ҳ мҶҚм—җм„ң кёёмқ„ мһғм§Җ м•ҠкІҢ н•ҳлҠ” лӮҳм№Ёл°ҳмқҙ лҗңлӢӨ. лҚ” лӮҳм•„к°Җ нҷҳмһҗм—җкІҢ мөңм„ мқҳ мқҙмқөмқ„ ліҙмһҘн•ҳкі мЎҙм—„м„ұмқ„ м§ҖмјңмЈјлҠ” мӨ‘мҡ”н•ң кё°мӨҖмңјлЎң кё°лҠҘн• кІғмқҙлӢӨ.мӢ кІҪкіјн•ҷмқҳ кёүмҶҚн•ң л°ңм „мқҖ н•„м—°м ҒмңјлЎң мғҲлЎңмҡҙ мңӨлҰ¬м Ғ мҹҒм җмқ„ мҲҳл°ҳн• кІғмқҙл©° мқҙл“Ө мҹҒм җмқҖ м җм°Ё ліөмһЎн•ң м–‘мғҒмқ„ лқ 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 л”°лқјм„ң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 м°Ёмӣҗм—җм„ң н•ңкөӯ мӮ¬нҡҢмқҳ л¬ёнҷ”м Ғ л§ҘлқҪмқ„ л°ҳмҳҒн•ң мӢ кІҪмңӨлҰ¬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қ„ л§Ҳл Ён•ҳкі м§ҖмҶҚм Ғмқё көҗмңЎкіј н•ҷл¬ём Ғ л…јмқҳлҘј мң„н•ң мң„мӣҗнҡҢлҘј м ңлҸ„м ҒмңјлЎң кө¬м¶•н•ҳлҠ” л…ёл Ҙмқҙ н•„мҡ”н•ҳлӢӨ. лӘЁл“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к°Җ мқҙлҹ¬н•ң кіјм ңм—җ м Ғк·№м ҒмңјлЎң м°ём—¬н• л•Ң мӢ кІҪкіјн•ҷмқҳ кё°мҲ м Ғ 진ліҙлҠ” лӢЁмҲңн•ң кіјн•ҷм Ғ м„ұм·ЁлҘј л„ҳм–ҙ мқёлҘҳмқҳ м§ҖмҶҚ к°ҖлҠҘн•ң л°ңм „кіј ліөлҰ¬м—җ кё°м—¬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 REFERENCES
- REFERENCES
- 1. Illes J. Neuroethics: defining the issues in theory, practice, and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3. Farah MJ. Neuroethics: the practical and the philosophical. Trends Cogn Sci 2005;9:34-40.
[Article] [PubMed]4. Raichle ME, MacLeod AM, Snyder AZ, Powers WJ, Gusnard DA, Shulman GL. A default mode of brain function. Proc Natl Acad Sci U S A 2001;98:676-682.
[Article] [PubMed] [PMC]5. Sporns O, Tononi G, Kötter R. The human connectome: a structural description of the human brain. PLoS Comput Biol 2005;1:e42.
[Article] [PubMed] [PMC]6. Owen AM, Coleman MR, Boly M, Davis MH, Laureys S, Pickard JD. Detecting awareness in the vegetative state. Science 2006;313:1402.
[Article] [PubMed]7. Laureys S, Celesia GG, Cohadon F, Lavrijsen J, LeГіn-CarriГіn J, Sannita WG, et al. Unresponsive wakefulness syndrome: a new name for the vegetative state or apallic syndrome. BMC Med 2010;8:68.
[Article] [PubMed] [PMC]8. Giacino JT, Katz DI, Schiff ND, Whyte J, Ashman EJ, Ashwal S, et al. Practice guideline update recommendations summary: disorders of consciousness: report of the Guideline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the American Congress of Rehabilitation Medicin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eurology 2018;91:450-460.
[Article] [PubMed] [PMC]9. SchГјpbach M, Gargiulo M, Welter ML, Mallet L, BГ©har C, Houeto JL, et al. Neurosurgery in Parkinson disease: a distressed mind in a repaired body? Neurology 2006;66:1811-1816.
[Article] [PubMed]10. Synofzik M, Schlaepfer TE. Stimulating personality: ethical criteria for deep brain stimulation in psychiatric patients and for enhancement purposes. Biotechnol J 2008;3:1511-1520.
[Article] [PubMed]11. Illes J, Kirschen MP, Edwards E, Bandettini P, Cho MK, Ford PJ, et al. Ethics. Incidental findings in brain imaging research. Science 2006;311:783-784.
[Article] [PubMed] [PMC]12. Dresser R. Advance directiv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ementia. Hastings Cent Rep 2018;48:26-27.
[Article]13. Jaworska A. Respecting the margins of agency: Alzheimer's patients and the capacity to value. Philos Public Aff 1999;28:105-138.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