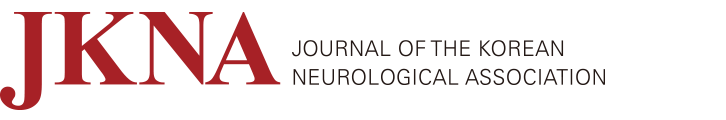The Role of Neurologists in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s and Stroke Networks
- Dae-Hyun Kim, MD, PhDa,b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ҷҖ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 к№ҖлҢҖнҳ„a,b
- Received May 4, 2025; В В В Revised June 10, 2025; В В В Accepted June 19, 2025;
- м„ң лЎ
- м„ң лЎ
лҮҢмЎёмӨ‘мқҖ мҙҲкё° м№ҳлЈҢк°Җ м§Җм—°лҗҳл©ҙ мӮ¬л§қм—җ мқҙлҘј мҲҳ мһҲлҠ” мӨ‘мҰқ м§ҲнҷҳмқҙлӢӨ. лҳҗн•ң м№ҳлЈҢлҘј л°ӣм•„лҸ„ нӣ„мң мһҘм• к°Җ лӮЁлҠ” кІҪмҡ°к°Җ л§Һм•„ мқҳлЈҢ비мҷҖ к°ҖмЎұ л¶ҖлӢҙмқҙ нҒ¬лӢӨ[1]. лҢҖн•ңлҜјкөӯмқҖ 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ңјлЎң мқён•ң мӮ¬л§қлҘ кіј мһҘм• л¶ҖлӢҙмқҙ лҶ’мқҖ көӯк°ҖлӢӨ. 2011-2022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ңмғқ нҶөкі„м—җ л”°лҘҙл©ҙ 2022л…„ лҮҢмЎёмӨ‘ нӣ„ 1л…„ мқҙлӮҙ мӮ¬л§қлҘ мқҖ м „мІҙ 20.1%, 65м„ё мқҙмғҒмқҖ 32.1%мҳҖлӢӨ. мӮ¬л§қлҘ мқҖ 2011л…„л¶Җн„° 2019л…„к№Ңм§Җ к°җмҶҢн–Ҳм§Җл§Ң 2020л…„ мқҙнӣ„ лӢӨмӢң мҰқк°Җн•ҳкі мһҲлӢӨ[2].лҮҢмЎёмӨ‘мқҖ мӢ мҶҚн•ң мқ‘кёү мқҳлЈҢ лҢҖмқ‘кіј к¶Ңм—ӯлі„ мӨ‘мҰқ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кҙҖлҰ¬ мІҙкі„к°Җ к°–м¶°м ём•ј кіЁл“ нғҖмһ„ лӮҙ м Ғм Ҳн•ң м№ҳлЈҢк°Җ к°ҖлҠҘн•ҳл©° мқҙлҠ” мғқмЎҙмңЁ н–ҘмғҒмңјлЎң мқҙм–ҙ진лӢӨ[1]. м •л¶ҖлҠ” 2008л…„л¶Җн„°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лҘј м§Җм •н•ҳм—¬ м§Җм—ӯ к°„ мқҳлЈҢ кІ©м°ЁлҘј н•ҙмҶҢн•ҳкі мһҗ н•ҳмҳҖкі [3] 2024л…„л¶Җн„°лҠ”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ӨнҠёмӣҢнҒ¬ мӢңлІ” мӮ¬м—…лҸ„ 추진 мӨ‘мқҙлӢӨ[4].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лҠ”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лҘј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мңјлЎң мӢ мҶҚн•ҳкІҢ мқҙмҶЎн•ҳкё° мң„н•ң мІҙкі„лЎң 119 кө¬кёүлҢҖмҷҖ мқҳлЈҢкё°кҙҖ лҳҗлҠ” мқјл°ҳ лі‘мӣҗкіј лҮҢмЎёмӨ‘м„јн„° к°„ нҳ‘л Ҙмқ„ к°•нҷ”н•ң мӢңмҠӨн…ңмқҙлӢӨ[1,5].ліё л…јл¬ём—җм„ңлҠ” кёүм„ұкё°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қҳ л¬ём ңм җкіј м •л¶Җ м •мұ…, лҮҢмЎёмӨ‘ лӢҙл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кіј м—…л¬ҙлҘј лӢӨлЈЁкі мһҗ н•ңлӢӨ.
- ліё лЎ
- ліё лЎ
- 1. көӯлӮҙ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қҳ л¬ём ңм җ
- 1. көӯлӮҙ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қҳ л¬ём ңм җ
1) м§Җм—ӯлі„ лҮҢмЎёмӨ‘м„јн„°мқҳ м ‘к·јм„ұ м°Ёмқҙ
1) м§Җм—ӯлі„ лҮҢмЎёмӨ‘м„јн„°мқҳ м ‘к·јм„ұ м°Ёмқҙ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һ¬кҙҖлҘҳ м№ҳлЈҢмңЁкіј м№ҳлЈҢ мӢңмһ‘ мӢңк°„мқҖ м§Җм—ӯм—җ л”°лқј нҒ° м°ЁмқҙлҘј ліҙмқёлӢӨ. мқҙлҠ”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кіј м „л¬ё мқёл Ҙмқҳ м§Җм—ӯ к°„ л¶Ҳк· нҳ• л•Ңл¬ёмқҙлӢӨ. мөңк·ј мЎ°мӮ¬м—җ л”°лҘҙл©ҙ м „көӯ 70к°ң мӨ‘ 진лЈҢк¶Ң мӨ‘ 23к°ң к¶Ңм—ӯ(32.9%)м—җлҠ” лҮҢмЎёмӨ‘ м Ғм • м№ҳлЈҢк°Җ к°ҖлҠҘн•ң лі‘мӣҗмқҙ м—Ҷм—ҲлӢӨ[8]. лҳҗн•ң 119 мқҙмҶЎ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кҙ‘м—ӯмӢң мқҙмғҒмқҳ лҢҖлҸ„мӢңм—җм„ң 119 мӢ кі нӣ„ лі‘мӣҗ лҸ„м°©к№Ңм§Җ 50분 мқҙмғҒ мҶҢмҡ”лҗҳлҠ” кІҪмҡ°к°Җ 6.4%м—җ л¶Ҳкіјн–Ҳм§Җл§Ң к·ё мҷё м§Җм—ӯмқҖ 22.5%лЎң лҚ” лҶ’м•ҳлӢӨ[10]. нҠ№нһҲ мһ¬кҙҖлҘҳ м№ҳлЈҢк°Җ к°ҖлҠҘн•ң лі‘мӣҗк№Ңм§Җ мқҙмҶЎ мӢңк°„мқҙ 90분 мқҙмғҒ кұёлҰ¬лҠ” м§Җм—ӯм—җм„ңлҠ” мһ¬кҙҖлҘҳ м№ҳлЈҢмңЁмқҙ лӮ®кі мӮ¬л§қлҘ мқҖ лҶ’мқҖ кІғмңјлЎң лӮҳнғҖлӮ¬лӢӨ[11].мҡ°лҰ¬лӮҳлқјлҠ” көӯнҶ к°Җ мўҒкі көҗнҶө мқён”„лқјк°Җ л°ңлӢ¬н•ҳм—¬ м „мІҙ мқёкө¬мқҳ 95% мқҙмғҒмқҙ м „көӯ 67к°ң лҮҢмЎёмӨ‘ м„јн„°м—җ 90분 мқҙлӮҙ лҸ„м°© к°ҖлҠҘн•ң кІғмңјлЎң мЎ°мӮ¬лҗҳм—ҲлӢӨ[11]. л”°лқјм„ң м§Җм—ӯлі„ лҮҢмЎёмӨ‘м„јн„°мҷҖ 119 мқҙмҶЎ мІҙкі„ к°„ мң кё°м Ғмқё нҳ‘л Ҙмқ„ к°•нҷ”н•ҳл©ҙ лҚ” л§ҺмқҖ нҷҳмһҗм—җкІҢ мӢңкё°м Ғм Ҳн•ң мһ¬кҙҖлҘҳ м№ҳлЈҢлҘј м ңкіө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2)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мқҳ м„ м •кіј мқҙмҶЎ мӢңк°„
2)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мқҳ м„ м •кіј мқҙмҶЎ мӢңк°„
көӯлӮҙм—җлҠ” м•„м§Ғ мІҙкі„м Ғмқё мқ‘кёү лҮҢмЎёмӨ‘ мқҙмҶЎ мІҙкі„к°Җ нҷ•лҰҪлҗҳм–ҙ мһҲм§Җ м•ҠлӢӨ. мҳӨнһҲл Ө COVID-19 мӢңкё°лҘј кұ°м№ҳл©° лҮҢмЎёмӨ‘ л°ңмғқ нӣ„ 119 мӢ кі л¶Җн„° лі‘мӣҗ лҸ„м°©к№Ңм§Җмқҳ мӢңк°„мқҙ лҚ” м§Җм—°лҗҳм—ҲлӢӨ. кө¬кёүлҢҖмӣҗмқҙ мқҙмҶЎн•ң лҮҢмЎёмӨ‘ мІҷлҸ„ м–‘м„ұ нҷҳмһҗ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мөңк·ј 5л…„к°„ 119 мӢ кі нӣ„ лі‘мӣҗ лҸ„м°©к№Ңм§Җмқҳ мҶҢмҡ” мӢңк°„мқҖ 27분м—җм„ң 33분мңјлЎң лҠҳм—Ҳкі 30분 мқҙмғҒ кұёлҰ° 비мңЁлҸ„ 38.4%м—җм„ң 58.2%лЎң мҰқк°Җн•ҳмҳҖлӢӨ[10]. мқҙлҹ° ліҖнҷ”мқҳ мЈјмҡ” мӣҗмқёмқҖ лҮҢмЎёмӨ‘ мқҳмӢ¬ нҷҳмһҗ мқҙмҶЎ мӢң мҲҳмҡ© к°ҖлҠҘн•ң лі‘мӣҗ м„ м •мқҳ м§Җм—°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лі‘мӣҗ м „ лӢЁкі„м—җм„ң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 м„ м •мқҙ лҠҰм–ҙм§Җл©ҙ мөңмў… м№ҳлЈҢк№Ңм§Җмқҳ мӢңк°„лҸ„ кёём–ҙм§Җкі м№ҳлЈҢк°Җ л¶Ҳк°ҖлҠҘн•ң лі‘мӣҗмңјлЎң мқҙмҶЎлҗ к°ҖлҠҘм„ұлҸ„ лҶ’아진лӢӨ.3) кёүм„ұкё°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һ¬мқҙмҶЎ
3) кёүм„ұкё°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һ¬мқҙмҶЎ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җ мһ…мӣҗн•ҳлҠ” кёүм„ұ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33.4%лҠ” лӢӨлҘё лі‘мӣҗм—җм„ң м „мӣҗлҗң кІҪмҡ°лЎң мІҳмқҢ л°©л¬ён•ҳлҠ” лі‘мӣҗм—җм„ң мөңмў… м№ҳлЈҢлҘј л°ӣм§Җ лӘ»н–Ҳмқ„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12].кёүм„ұ н—ҲнҳҲлҮҢмЎёмӨ‘мқҳ лҢҖн‘ңм Ғмқё м№ҳлЈҢлҠ” мӢ мҶҚн•ң м •л§Ҙ лӮҙ нҳҲм „мҡ©н•ҙм ң нҲ¬м—¬мқҙлӢӨ. н•ҳм§Җл§Ң мІ« лі‘мӣҗм—җм„ң нҳҲм „мҡ©н•ҙм ң м№ҳлЈҢлҘј л°ӣм§Җ лӘ»н•ҳкі лҮҢмЎёмӨ‘м„јн„°лЎң мқҙмҶЎлҗң нҷҳмһҗлҠ” м§Ғм ‘ лӮҙмӣҗн•ң нҷҳмһҗліҙлӢӨ м•Ҫм ң нҲ¬м—¬ мӢңмһ‘мқҙ м•Ҫ 50분 лҠҰкі мўӢмқҖ мҳҲнӣ„лҘј ліҙмқј к°ҖлҠҘм„ұлҸ„ 1.6л°° лӮ®лӢӨ[13]. көӯлӮҙм—җлҠ”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5лӘ… мӨ‘ 1лӘ…мқҙ лі‘мӣҗмқ„ мһҳлӘ» м„ нғқн•ҙ м№ҳлЈҢ кё°нҡҢлҘј лҶ“м№ҳкұ°лӮҳ м№ҳлЈҢк°Җ м§Җм—°лҗҳл©° м§Җм—ӯлі„ м „мӣҗ 비мңЁмқҖ 9.6-44.6%лЎң ліҙкі лҗҳм—ҲлӢӨ[8,13].мөңк·ј лҸҷл§ҘлӮҙнҳҲм „м ңкұ°мҲ мқҳ нҡЁкіјк°Җ мһ…мҰқлҗҳл©ҙм„ң көӯлӮҙм—җлҸ„ м „мІҙ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Ө‘ мқ‘кёү лҮҢнҳҲкҙҖ лӮҙ мӢңмҲ лҘ мқҙ 2011л…„ 5.4%м—җм„ң 2020л…„ 10.6%лЎң мҰқк°Җн•ҳмҳҖлӢӨ[1,7,9,14]. көӯлҜјкұҙк°•ліҙн—ҳкіөлӢЁ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нҳҲм „м ңкұ°мҲ мқҙ н•„мҡ”н•ң нҷҳмһҗ мӨ‘ мӢңмҲ к°ҖлҠҘн•ң лі‘мӣҗм—җ м§Ғм ‘ лӮҙмӣҗн•ҳм—¬ м№ҳлЈҢл°ӣлҠ” 비мңЁмқҖ 34%м—җ л¶Ҳкіјн•ҳмҳҖлӢӨ. мқјм°Ёлі‘мӣҗмқ„ кұ°міҗ лҮҢмЎёмӨ‘м„јн„°лЎң м „мӣҗлҗң нҷҳмһҗлҠ” м§Ғм ‘ лӮҙмӣҗн•ң кІҪмҡ°ліҙлӢӨ мһ…мӣҗк№Ңм§Җ м•Ҫ 90분 лҚ” м§Җм—°лҗҳм—Ҳкі мӢңмҲ нӣ„ мҳҲнӣ„лҸ„ мўӢм§Җ м•Ҡм•ҳлӢӨ[15]. мқҙлҠ” мһ¬кҙҖлҘҳ м№ҳлЈҢк°Җ н•„мҡ”н•ң нҷҳмһҗм—җкІҢ мІ« лі‘мӣҗ м„ нғқмқҙ мӨ‘мҡ”н•Ёмқ„ ліҙм—¬мӨҖлӢӨ.4) лі‘мӣҗ к°„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қҙмҶЎкіј мӢңк°„ м§Җм—°
4) лі‘мӣҗ к°„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қҙмҶЎкіј мӢңк°„ м§Җм—°
мқјм°Ёлі‘мӣҗм—җм„ң лҸҷл§Ҙ лӮҙ мӨ‘мһ¬ м№ҳлЈҢлҘј мң„н•ҙ лҮҢмЎёмӨ‘м„јн„°лЎң м „мӣҗлҗҳлҠ” кёүм„ұ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Ө‘ мӢңмҲ мқ„ л°ӣм§Җ лӘ»н•ҳлҠ” к°ҖмһҘ нҒ° мқҙмң лҠ” мқјм°Ёлі‘мӣҗм—җм„ңмқҳ мӢңк°„ м§Җм—°мқҙлӢӨ[16]. м „мӣҗ нӣ„ нҳҲкҙҖ мһ¬к°ңнҶөмқҙ мқҙлЈЁм–ҙм§ҖлҚ”лқјлҸ„ мқјм°Ёлі‘мӣҗм—җм„ң мӢңк°„ м§Җм—°мқҖ мҳҲнӣ„м—җ лӮҳмҒң мҳҒн–Ҙмқ„ лҒјм№ мҲҳ мһҲлӢӨ[17].л”°лқјм„ң лҮҢмЎёмӨ‘ мөңмў… м№ҳлЈҢк°Җ к°ҖлҠҘн•ң лі‘мӣҗмңјлЎң мқҙмҶЎлҗҳм§Җ лӘ»н•ҳмҳҖлӢӨл©ҙ мқјм°Ёлі‘мӣҗ мІҙлҘҳ мӢңк°„мқ„ мөңмҶҢнҷ”мӢңмјңм•ј н•ңлӢӨ[18]. көӯлӮҙм—җлҠ” лҮҢмҳҒмғҒ CD ліөмӮ¬, 진лЈҢ мҶҢкІ¬м„ң мһ‘м„ұ, мӮ¬м„Ө кө¬кёүлҢҖ м§Җм—° л“ұмқҙ мЈјмҡ” м „мӣҗ м§Җм—° мҡ”мқёмқҙлӢӨ. мқҙлҘј н•ҙкІ°н•ҳл Өл©ҙ лі‘мӣҗ к°„ мҳҒмғҒ м „мҶЎ мӢңмҠӨн…ң кө¬м¶•кіј кө¬кёүлҢҖ м „мӣҗ мІҙкі„ к°ңм„ мқҙ н•„мҡ”н•ҳлӢӨ.
- 2.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 л¬ём ң н•ҙкІ°мқ„ мң„н•ң м •мұ…
- 2.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 л¬ём ң н•ҙкІ°мқ„ мң„н•ң м •мұ…
1)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 мҡҙмҳҒ
1)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 мҡҙмҳҒ
лҮҢмЎёмӨ‘ мҙҲкё° кіЁл“ нғҖмһ„мқ„ нҷ•ліҙн•ҳкё° мң„н•ҙм„ңлҠ” 24мӢңк°„ 365мқј м№ҳлЈҢ к°ҖлҠҘн•ң кұ°м җ мқҳлЈҢкё°кҙҖмқҙ н•„мҡ”н•ҳлӢӨ. м •л¶ҖлҠ” 2008л…„ 3к°ңмқҳ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лҘј мӢңмһ‘мңјлЎң 2024л…„к№Ңм§Җ мҙқ 14к°ң м„јн„°лҘј м§Җм • л°Ҹ мҡҙмҳҒн•ҳкі мһҲлӢӨ(Fig. 1). мқҙ м„јн„°л“ӨмқҖ кёүм„ұ мӢ¬к·јкІҪмғү л°Ҹ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җкІҢ мӢ мҶҚн•ң м№ҳлЈҢлҘј м ңкіөн•ҳкі м§Җм—ӯ к°„ мқҳлЈҢ кІ©м°Ё н•ҙмҶҢмҷҖ мҳҲл°©, м№ҳлЈҢ, көҗмңЎ, мӮ¬нӣ„ кҙҖлҰ¬к№Ңм§Җ лӢҙлӢ№н•ҳлҠ” кІғмқ„ лӘ©н‘ңлЎң н•ңлӢӨ. к°Ғ м„јн„°лҠ” мӢ кІҪкіј, мӢ кІҪмҷёкіј, мӢ¬мһҘлӮҙкіј, нқүл¶Җмҷёкіј, мқ‘кёүмқҳн•ҷкіј, мҳҒмғҒмқҳн•ҷкіј, мһ¬нҷңмқҳн•ҷкіј л“ұ лӢӨн•ҷм ң нҳ‘л Ҙ мІҙкі„лҘј к°–м¶”кі мһҲлӢӨ. к¶Ңм—ӯм„јн„° мҡҙмҳҒ мқҙнӣ„ м№ҳлЈҢ м§Җм—° мӢңк°„ лӢЁм¶•, лі‘мӣҗ м „ лӢЁкі„ 진лЈҢ мІҙкі„нҷ”, мӮ¬л§қлҘ к°җмҶҢ, мқҳлЈҢ м§Ҳ н–ҘмғҒ нҷңлҸҷ л“ұ мӨ‘мҡ”н•ң м„ұкіјк°Җ мһҲм—ҲлӢӨ[3].2023л…„м—җлҠ” мӨ‘м•ҷ мӢ¬лҮҢнҳҲкҙҖм„јн„°к°Җ м§Җм •лҗҳм–ҙ көӯк°Җм Ғ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м»ЁнҠёлЎӨ нғҖмӣҢ м—ӯн• мқ„ л§Ўм•ҳкі 2025л…„м—җлҠ” м§Җм—ӯ мӢ¬лҮҢнҳҲкҙҖм„јн„° 10кіімқҙ м„ м •лҗҳл©ҙм„ң мӨ‘м•ҷ-к¶Ңм—ӯ-м§Җм—ӯмқ„ мһҮлҠ”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ҢҖмқ‘ мІҙкі„к°Җ мҷ„м„ұлҗҳм—ҲлӢӨ. м§Җм—ӯ м„јн„°лҠ” к¶Ңм—ӯ м„јн„°мҷҖ м—°кі„н•ҳм—¬ м§Җм—ӯ лӮҙ нҷҳмһҗ м№ҳлЈҢ л°Ҹ мҳҲл°© көҗмңЎмқ„ лӢҙлӢ№н•ҳл©° к¶Ңм—ӯ м„јн„°лҠ” кұ°м җ лі‘мӣҗмңјлЎң мӨ‘мҰқ нҷҳмһҗ м№ҳлЈҢ, лҚ°мқҙн„° мҲҳ집, мҳҲл°© кҙҖлҰ¬ мӮ¬м—…мқ„ лӢҙлӢ№н•ңлӢӨ. мӨ‘м•ҷ м„јн„°лҠ” м •мұ… к°ңл°ң, кё°мҲ м§Җмӣҗ, мқёл Ҙ көҗмңЎ л“ұ м „мІҙ м„јн„° мҡҙмҳҒмқ„ мҙқкҙ„н•ңлӢӨ.2)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ӨнҠёмӣҢнҒ¬ мӮ¬м—…
2)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ӨнҠёмӣҢнҒ¬ мӮ¬м—…
лі‘мӣҗ м „ лӢЁкі„м—җм„ң мқҙмҶЎ лі‘мӣҗ м„ м • м§Җм—° л°Ҹ мқҙмҶЎ мӢңк°„ мҰқк°Җ л¬ём ң(Fig. 2-A)лҘј н•ҙкІ°н•ҳкі лі‘мӣҗ к°„ м „мӣҗмқ„ нҷңм„ұнҷ”н•ҳкё° мң„н•ҳм—¬ 2024л…„ 2мӣ”л¶Җн„°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 кё°л°ҳмқҳ мқ‘кёү 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 л„ӨнҠёмӣҢнҒ¬ л°Ҹ м§Җм—ӯ лі‘мӣҗ м „л¬ёмқҳ к°„ мқём Ғ л„ӨнҠёмӣҢнҒ¬лҘј нҷңмҡ©н•ҳлҠ” мӢңлІ”мӮ¬м—…мқҙ мӢңн–ү мӨ‘мқҙлӢӨ[4].к¶Ңм—ӯ л„ӨнҠёмӣҢнҒ¬лҠ” 119 кө¬кёүлҢҖмӣҗмқҙ мӢ¬к·јкІҪмғү лҳҗлҠ” лҮҢмЎёмӨ‘ мқҳмӢ¬ нҷҳмһҗлҘј м„ лі„н•ҳм—¬ к¶Ңм—ӯ м„јн„° лҳҗлҠ” нҳ‘л Ҙ лі‘мӣҗм—җ м§Ғм ‘ м—°лқҪн•ҳм—¬ 24мӢңк°„ 365мқј нҷҳмһҗлҘј мқҙмҶЎ, м№ҳлЈҢн• мҲҳ мһҲлҸ„лЎқ м§Җмӣҗн•ҳлҠ” лі‘мӣҗ м „ лӢЁкі„ л„ӨнҠёмӣҢнҒ¬мқҙлӢӨ(Fig. 2-B) [4]. мқём Ғ л„ӨнҠёмӣҢнҒ¬лҠ”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к°Җ лҮҢнҳҲкҙҖмҲҳмҲ , нҳҲм „м ңкұ°мҲ , мҪ”мқјмғүм „мҲ мқҙ л¶Ҳк°ҖлҠҘн•ң лі‘мӣҗм—җ лӮҙмӣҗн•ҳмҳҖмқ„ л•Ң 진лӢЁ нӣ„ м „л¬ёмқҳ к°„ мҠӨл§ҲнҠёнҸ° н”Ңлһ«нҸјмқ„ нҷңмҡ©н•ҳм—¬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мңјлЎң м „мӣҗн•ҳлҠ” лі‘мӣҗ к°„ мқёл Ҙ мӨ‘мӢ¬мқҳ нҳ‘л Ҙ мІҙкі„мқҙлӢӨ(Fig. 2-C) [4].мқҙ мӮ¬м—…мқҖ 3л…„к°„ мӢңлІ” мҡҙмҳҒлҗҳл©° к¶Ңм—ӯ м„јн„° мӢңлІ”мӮ¬м—…м—җлҠ” 10к°ң к¶Ңм—ӯмқҙ, лҮҢмЎёмӨ‘ мқём Ғ л„ӨнҠёмӣҢнҒ¬м—җлҠ” 30к°ң нҢҖмқҙ м°ём—¬н•ҳкі мһҲм–ҙ н–Ҙнӣ„ мң мҡ©м„ұкіј нҡЁкіјм—җ лҢҖн•ң л©ҙл°Җн•ң 분м„қмқҙ н•„мҡ”н•ҳлӢӨ.
көӯлӮҙм—җлҠ” лҮҢмЎёмӨ‘ м№ҳлЈҢ лі‘мӣҗ л¶ҖмЎұ, м§Җм—ӯ к°„ кІ©м°Ё, мқҙмҶЎ мІҙкі„ лҜёл№„, көӯк°Җ лҚ°мқҙн„° л°Ҹ кҙҖлҰ¬ мІҙкі„ л¶Җмһ¬ л“ұ лӢӨм–‘н•ң л¬ём ңк°Җ мһҲмңјл©° нҳ„мһ¬ мқҙлҘј н•ҙкІ°н•ҳкё° мң„н•ң л…ёл Ҙмқҙ 진н–ү мӨ‘мқҙлӢӨ.- 3.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ҷҖ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 3.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ҷҖ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1) кёүм„ұ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1) кёүм„ұ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ӯн•
- (1) кёүм„ұ лҮҢмЎёмӨ‘ 진лӢЁкіј м№ҳлЈҢ
- (1) кёүм„ұ лҮҢмЎёмӨ‘ 진лӢЁкіј м№ҳлЈҢ
мқ‘кёүмӢӨм—җ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к°Җ лӮҙмӣҗн•ҳл©ҙ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мӢ кІҪкі„ нҸүк°Җ(NIH лҮҢмЎёмӨ‘ мІҷлҸ„[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л“ұ)мҷҖ лҮҢмҳҒмғҒ кІҖмӮ¬лҘј нҶөн•ҙ лҮҢмЎёмӨ‘мқ„ 진лӢЁн•ҳкі м№ҳлЈҢлҘј мӢңмһ‘н•ңлӢӨ.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җкІҢ м •л§Ҙ лӮҙ нҳҲм „мҡ©н•ҙм ң нҲ¬м—¬ м—¬л¶ҖлҘј нҢҗлӢЁн•ҳкі лҸҷл§ҘлӮҙнҳҲм „м ңкұ°мҲ мқҙ н•„мҡ”н•ң кІҪмҡ° мӢ кІҪмӨ‘мһ¬ мӢңмҲ мқҳмӮ¬мҷҖ нҳ‘л Ҙн•ҳм—¬ мӢ мҶҚнһҲ мӢңмҲ мқ„ 진н–үн•ңлӢӨ. м¶ң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лҠ” мӢ кІҪмҷёкіј л°Ҹ мӨ‘нҷҳмһҗмӢӨкіј нҳ‘л Ҙн•ҳм—¬ м№ҳлЈҢ л°©м№Ёмқ„ м •н•ңлӢӨ.көӯлӮҙ лҮҢмЎёмӨ‘ м•„нҳ•лі„ мң лі‘лҘ мқҖ н—ҲнҳҲлҮҢмЎёмӨ‘мқҙ 75-80%лЎң к°ҖмһҘ л§Һкі лӢӨмқҢмңјлЎң м¶ңнҳҲлҮҢмЎёмӨ‘кіј м§ҖмЈјл§үн•ҳм¶ңнҳҲ мҲңмқҙлӢӨ[19]. лҢҖл¶Җ분 лі‘мӣҗм—җм„ңлҠ” кёүм„ұ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лҘј мӢ кІҪкіјм—җм„ң лӢҙлӢ№н•ҳкі мһҲлӢӨ[14]. кёүм„ұ н—ҲнҳҲлҮҢмЎёмӨ‘ мҙҲкё° лҢҖмқ‘ лҠҘл Ҙ нҸүк°ҖлҘј мң„н•ҳм—¬ м •л§ҘлӮҙнҳҲм „мҡ©н•ҙмҲ кұҙмҲҳмҷҖ нҷҳмһҗ лҸ„м°© нӣ„ нҳҲм „мҡ©н•ҙм ң нҲ¬м—¬к№Ңм§Җ кұёлҰ° мӢңк°„мқ„ мЈјмҡ” м§Җн‘ңлЎң мӮјлҠ”лӢӨ[18]. көӯлӮҙ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Ҫ 8-11%к°Җ нҳҲм „мҡ©н•ҙм ң м№ҳлЈҢлҘј л°ӣкі мһҲмңјл©°[7-9] лҢҖл¶Җ분мқҳ лі‘мӣҗм—җм„ң мӢ мҶҚ лҢҖмқ‘ мІҙкі„лҘј мҡҙмҳҒн•ҳм—¬ 60분 мқҙлӮҙм—җ м•Ҫм ңлҘј нҲ¬м—¬к°Җ мқҙлӨ„м§Җкі мһҲлҠ”лҚ° мқҙлҠ” көӯм ңм ҒмңјлЎңлҸ„ мҡ°мҲҳн•ң мҲҳмӨҖмқҙлӢӨ[8]. мқҙлҹ¬н•ң м„ұкіјлҠ” мЈјлЎ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Өмқҳ л…ёл Ҙм—җ мқҳн•ҳм—¬ мқҙлЈЁм–ҙм§Җкі мһҲмңјл©° к·ём—җ л”°лҘё м—…л¬ҙ л¶ҖлӢҙлҸ„ м»Өм§Җкі мһҲлӢӨ[20].- (2) лҮҢмЎёмӨ‘м „л¬ём№ҳлЈҢмӢӨ мҡҙмҳҒ
- (2) лҮҢмЎёмӨ‘м „л¬ём№ҳлЈҢмӢӨ мҡҙмҳҒ
лҮҢмЎёмӨ‘м „л¬ём№ҳлЈҢмӢӨ(stroke unit)мқҖ кёүм„ұ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җкІҢ мөңм Ғмқҳ м№ҳлЈҢлҘј м ңкіөн•ҳкё° мң„н•ң лҸ…лҰҪ кіөк°„, м „л¬ё мһҘ비, лӢӨн•ҷм ң лҮҢмЎёмӨ‘ м№ҳлЈҢнҢҖ, мһ„мғҒ 진лЈҢ кІҪлЎң(clinical pathway) л“ұмқ„ к°–м¶° мөңм Ғ м№ҳлЈҢлҘј м ңкіөн•ңлӢӨ. нҷҳмһҗлҠ” нҳҲм••, нҳёнқЎ, мІҙмҳЁ, мӢ¬м „лҸ„ л“ұмқ„ лӘЁлӢҲн„°л§Ғн•ҳл©° NIHSSлҘј нҶөн•ҙ мӢ кІҪкі„ мғҒнғң ліҖнҷ”лҘј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нҸүк°Җл°ӣлҠ”лӢӨ. мЎ°кё° мӢ кІҪкі„ м•…нҷ” л°ңмғқ мӢң мҰүк°Ғ лҢҖмқ‘н•ҳм—¬ н•©лі‘мҰқмқ„ мӨ„мқёлӢӨ. нҸҗл ҙ мҳҲл°©мқ„ мң„н•ҳм—¬ мӮјнӮҙкіӨлһҖ кІҖмӮ¬лҘј н•ҳкі мЎ°кё° мһ¬нҷң м№ҳлЈҢлҸ„ н•Ёк»ҳ мӢңн–үн•ңлӢӨ[1,21]. мқҙ лӘЁл“ кіјм •мқҖ мЈјлЎ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к°Җ лӢҙлӢ№н•ңлӢӨ.- (3)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 к°ңм„ л°Ҹ н•«лқјмқё мҡҙмҳҒ
- (3)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 к°ңм„ л°Ҹ н•«лқјмқё мҡҙмҳҒ
119 кө¬кёүлҢҖмӣҗмқҙ лҮҢмЎёмӨ‘ мқҳмӢ¬ нҷҳмһҗм—җ лҢҖн•ҙ лі‘мӣҗ лҸ„м°© м „ м№ҳлЈҢ нҢҖм—җ м—°лқҪн•ҳл©ҙ мӮ¬м „ мӨҖ비лҘј н• мҲҳ мһҲм–ҙ мҳҒмғҒ кІҖмӮ¬мҷҖ м№ҳлЈҢ мӢңмһ‘ мӢңк°„мқҙ лӢЁм¶•лҗңлӢӨ[22,23]. лҳҗн•ң н•«лқјмқё мҡҙмҳҒ мӢң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Ҳҳмҡ© лі‘мӣҗмқҙ м—Ҷмқ„ кІҪмҡ°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к°Җ нҷҳмһҗлҘј мөңмў… мҲҳмҡ©н•ҳкІҢ лҗңлӢӨ[3]. лҮҢмЎёмӨ‘ м№ҳлЈҢнҢҖм—җ м—°лқҪ л°©мӢқмқҖ мҠӨл§ҲнҠёнҸ° м•ұ[22] лҳҗлҠ” н•«лқјмқё м „нҷ”к°Җ мһҲлҠ”лҚ°[23] м§Җм—ӯ мғҒнҷ©м—җ л”°лқј лӢӨм–‘н•ң л°©лІ•мқ„ нҷңмҡ©н• мҲҳ мһҲлӢӨ.н•ң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қҳ н•«лқјмқё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кө¬кёүлҢҖмӣҗмқҳ лҮҢмЎёмӨ‘ 진лӢЁ м •нҷ•лҸ„лҠ” 81%мҳҖкі н—ҲнҳҲ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Ө‘ 44%лҠ” м •л§ҘлӮҙнҳҲм „мҡ©н•ҙмҲ , 18%лҠ” лҸҷл§ҘлӮҙнҳҲм „м ңкұ°мҲ мқ„ л°ӣм•ҳлӢӨ[23]. мқҙлҠ” кө¬кёүлҢҖмӣҗмқҙ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лҘј мһҳ м„ лі„н•ҳм—¬ н•«лқјмқёмқ„ нҶөн•ҙ мқҙмҶЎн•ҳл©ҙ мһ¬кҙҖлҘҳ м№ҳлЈҢ кё°нҡҢк°Җ лҠҳкі м№ҳлЈҢ мӢңк°„лҸ„ лӢЁм¶•лҗңлӢӨлҠ” кІғмқ„ ліҙм—¬мӨҖлӢӨ.лҮҢмЎёмӨ‘ м „л¬ёмқҳл“ӨмқҖ нғҖ лі‘мӣҗм—җм„ң лҮҢнҳҲкҙҖ мҲҳмҲ мқҙлӮҳ мӢңмҲ мқҙ н•„мҡ”н•ң нҷҳмһҗмқҳ м „мӣҗкіј м№ҳлЈҢлҘј лӢҙлӢ№н•ҳлҠ” мқём Ғ л„ӨнҠёмӣҢнҒ¬ мӮ¬м—…м—җлҸ„ м°ём—¬н•ҳкі мһҲлӢӨ[4].- (4) 진лЈҢмқҳ м§Ҳ н–ҘмғҒ нҷңлҸҷ л°Ҹ кҙҖлҰ¬
- (4) 진лЈҢмқҳ м§Ҳ н–ҘмғҒ нҷңлҸҷ л°Ҹ кҙҖлҰ¬
лҢҖл¶Җ분мқҳ лҮҢмЎёмӨ‘м„јн„°лҠ” 진лӢЁ, м№ҳлЈҢ, мһ¬нҷңк№Ңм§Җ н‘ңмӨҖнҷ”лҗң мһ„мғҒ 진лЈҢ кІҪлЎңлҘј мҡҙмҳҒн•ҳм—¬ лҮҢмЎёмӨ‘ м№ҳлЈҢ м§Җм—°мқ„ мӨ„мқҙкі м§„лЈҢмқҳ м§Ҳ н–ҘмғҒмқ„ лҸ„лӘЁн•ҳкі мһҲлӢӨ[25]. лі‘мӣҗл“ӨмқҖ 25분 мқҙлӮҙ лҮҢмҳҒмғҒ мҙ¬мҳҒ, 60분 мқҙлӮҙ нҳҲм „мҡ©н•ҙм ң нҲ¬м—¬ л“ұ мһҗмІҙ лӘ©н‘ңлҘј м„Өм •н•ҳкі м •кё°м Ғмқё quality improvement (QI) нҷңлҸҷмқ„ нҶөн•ҙ л¬ём ңлҘј к°ңм„ н•ңлӢӨ. кұҙк°•ліҙн—ҳмӢ¬мӮ¬нҸүк°Җмӣҗм—җм„ңлҸ„ лҮҢмЎёмӨ‘ м Ғм •м„ұ нҸүк°ҖлҘј 진н–үн•ҳкі мһҲлҠ” лҚ° 2022л…„к№Ңм§Җ мҙқ 9м°Ё нҸүк°Җ кІ°кіјк°Җ кіөк°ңлҗҳм—ҲлӢӨ[26].лҢҖн•ңлҮҢмЎёмӨ‘н•ҷнҡҢлҠ” м№ҳлЈҢк°Җ мӢ мҶҚн•ҳкі м Ғм Ҳн•ң лі‘мӣҗм—җ лҢҖн•ҳм—¬ лҮҢмЎёмӨ‘м„јн„° мқёмҰқмқ„ мӢңн–үн•ҳкі мһҲлӢӨ. 2018л…„ нҳҲм „мҡ©н•ҙм ң м№ҳлЈҢ к°ҖлҠҘ м„јн„° мқёмҰқмқ„ мӢңмһ‘мңјлЎң 2021л…„м—җлҠ” лҸҷл§ҘлӮҙнҳҲм „м ңкұ°мҲ к№Ңм§Җ к°ҖлҠҘн•ң мһ¬кҙҖлҘҳ м№ҳлЈҢ м„јн„°лЎң нҷ•лҢҖн•ҳмҳҖлӢӨ. мқёмҰқ нҸүк°ҖлҠ” н‘ңмӨҖ 진лЈҢ м—¬л¶Җ, мөңмӢ м№ҳлЈҢ м Ғмҡ© м—¬л¶ҖлҘј нҷ•мқён•ҳм—¬ м°ём—¬ лі‘мӣҗмқҳ м§ҖмҶҚм Ғмқё 진лЈҢмқҳ м§Ҳ н–ҘмғҒмқ„ мң лҸ„н•ңлӢӨ[27]. мқёмҰқ лі‘мӣҗ м •ліҙлҠ” кө¬кёүлҢҖмҷҖ көӯлҜјл“Өм—җкІҢ кіөк°ңлҗҳм–ҙ мӢ мҶҚн•ң лі‘мӣҗ м„ нғқм—җ лҸ„мӣҖмқ„ мӨҖлӢӨ. лҳҗн•ң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м—җм„ңлҠ” 2024л…„л¶Җн„° кёүм„ұлҮҢмЎёмӨ‘мқёмҰқмқҳлҘј м„ м •н•ҳм—¬ м „л¬ём„ұмқ„ к°•нҷ”н•ҳкі мһҲлӢӨ.- (5) лҮҢмЎёмӨ‘ көҗмңЎ л°Ҹ нҷҚліҙ
- (5) лҮҢмЎёмӨ‘ көҗмңЎ л°Ҹ нҷҚліҙ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қҳ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Ҡ” кө¬кёүлҢҖмӣҗ, к°„нҳёмӮ¬, мӢңлҜј, нҷҳмһҗ л“ұ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лҮҢмЎёмӨ‘ көҗмңЎмқ„ мӢӨмӢңн•ңлӢӨ.кө¬кёүлҢҖмӣҗм—җкІҢлҠ” лҮҢмЎёмӨ‘ м„ лі„ лҸ„кө¬, лҢҖнҳҲкҙҖнҸҗмғү мҰқмғҒ, мқ‘кёү мІҳм№ҳ, м№ҳлЈҢ к°ҖлҠҘн•ң лҮҢмЎёмӨ‘м„јн„° мҶҢк°ң, н•«лқјмқё мӢңмҠӨн…ң л“ұмқ„ көҗмңЎн•ңлӢӨ. к°„нҳёмӮ¬м—җкІҢлҠ” лҮҢмЎёмӨ‘ 진лӢЁ, NIHSS к°ҷмқҖ мӨ‘мҰқлҸ„ нҸүк°Җ лҸ„кө¬, лҮҢмЎёмӨ‘ м№ҳлЈҢ л°Ҹ нҷҳмһҗ кҙҖлҰ¬лІ•мқ„ көҗмңЎн•ңлӢӨ.мқјл°ҳмқёкіј нҷҳмһҗм—җкІҢлҠ” кі нҳҲм••, лӢ№лҮЁлі‘, кі м§ҖнҳҲмҰқ, нқЎм—° л“ұ мЈјмҡ” мң„н—ҳ мқёмһҗ кҙҖлҰ¬, лҮҢмЎёмӨ‘ мҰқмғҒ, мқ‘кёү лҢҖмІҳ, м•Ҫл¬ј ліөмҡ©, мғқнҷңмҠөкҙҖ к°ңм„ л“ұмқ„ м•ҢлҰ¬кі мһ¬л°ң л°©м§ҖлҘј мң„н•ң 추м Ғ кҙҖлҰ¬лҸ„ лӢҙлӢ№н•ңлӢӨ.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ҷҖ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Јјмҡ” м—ӯн• мқҖ н‘ңлЎң м •лҰ¬н•ҳмҳҖлӢӨ(Table).
2) мқ‘кёүмӢӨ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л¬ҙ л¶ҖлӢҙ
2) мқ‘кёүмӢӨм—җм„ң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л¬ҙ л¶ҖлӢҙ
мӢ кІҪкіјлҠ” мқ‘кёүмӢӨм—җм„ң кёүм„ұ мӨ‘мӨ‘ м§Ҳнҷҳмқ„ к°ҖмһҘ л§Һмқҙ 진лЈҢн•ҳлҠ” лҢҖн‘ңм Ғмқё кіјмқҙлӢӨ. көӯлӮҙ 41к°ң мғҒкёү мў…н•©лі‘мӣҗмқҳ 2л…„к°„ мқ‘кёүмӢӨ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м—°к°„ мӢ кІҪкіј м „мһ„ м „л¬ёмқҳ 1мқёлӢ№ мӨ‘мҰқ нҷҳмһҗ(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1-3л“ұкёү) 진лЈҢ кұҙмҲҳлҠ” 274.1кұҙмңјлЎң мҶҢм•„мІӯмҶҢл…„кіј лӢӨмқҢмңјлЎң л§Һм•ҳмңјл©° лӮҙкіјмқҳ 1.6л°°, м „мІҙ нҸүк· мқҳ 4.2л°°м—җ н•ҙлӢ№н•ңлӢӨ. мқҙ мӨ‘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к°Җ 비мӨ‘мқҙ к°ҖмһҘ м»ёлӢӨ[20].лҮҢмЎёмӨ‘мқҖ мӢ мҶҚн•ң м№ҳлЈҢк°Җ н•„мҲҳмқҙлҜҖлЎң мӢ кІҪкіјмқҳ м—…л¬ҙ к°•лҸ„лҠ” л§Өмҡ° лҶ’лӢӨ. мөңк·ј нҳҲм „мҡ©н•ҙм ң м№ҳлЈҢмҷҖ лҸҷл§ҘлӮҙнҳҲм „м ңкұ°мҲ л“ұ м№ҳлЈҢ кё°мҲ мқҙ л°ңм „н•ҳл©ҙм„ң мӢ кІҪкіјмқҳ мқ‘кёүмӢӨ м—ӯн• лҸ„ лҚ”мҡұ нҷ•лҢҖлҗҳм—ҲлӢӨ[14]. м•һм„ң м–ёкёүн•ң кёүм„ұкё° м№ҳлЈҢ лҢҖл¶Җ분мқҖ мЈјлЎң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җ мқҳн•ҳм—¬ 진н–үлҗҳкі мһҲм–ҙ мӢ кІҪкіјлҠ” м—…л¬ҙ к°•лҸ„к°Җ лҶ’мқҖ кіјлЎң мқёмӢқлҗҳм–ҙ м ҠмқҖ мқҳмӮ¬л“Өмқҳ м§ҖмӣҗлҸ„ кәјл Өн•ҳлҠ” 분мң„кё°мқҙлӢӨ. нҠ№нһҲ к°ҷмқҖ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лқјкі н•ҳлҚ”лқјлҸ„ лҮҢмЎёмӨ‘ м „лӢҙмқҳлҠ” л¶Җм „кіө лҳҗлҠ” лҮҢмЎёмӨ‘ 진лЈҢлҘј н•ҳм§Җ м•ҠлҠ” мқҳмӮ¬м—җ 비н•ҙ м—…л¬ҙ л¶ҖлӢҙмқҙ нӣЁм”¬ нҒ¬кі мқҙм—җ л”°лқј лҮҢмЎёмӨ‘ м „мһ„мқҳ м§ҖмӣҗмңЁлҸ„ лӮ®м•„м§Җкі мһҲлӢӨ. мқҙлҘј н•ҙкІ°н•ҳкё° мң„н•ң лҢҖмұ… л§Ҳл Ёмқҙ мӢңкёүн•ҳлӢӨ. мқҙлҹ° к°ҖмҡҙлҚ° мөңк·ј мӢ кІҪкіјк°Җ н•„мҲҳмқҳлЈҢ кіјлӘ©м—җ нҸ¬н•Ёлҗң кІғмқҖ кёҚм •м Ғмқё ліҖнҷ”мқҙл©° н–Ҙнӣ„ лҮҢмЎёмӨ‘ м „лӢҙ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мқҳ мІҳмҡ° к°ңм„ кіј мқёл Ҙ ліҙк°• л“ұмқҳ 추к°Җ лҢҖмұ…мқҙ н•„мҡ”н•ҳлӢӨ.
н—ҲнҳҲлҮҢмЎёмӨ‘м—җм„ң нҳҲкҙҖ мһ¬к°ңнҶөмқҙ мқҙлЈЁм–ҙм§Җм§Җ м•Ҡмңјл©ҙ 분лӢ№ 190л§Ң к°ңмқҳ мӢ кІҪм„ёнҸ¬к°Җ мҶҗмғҒлҗңлӢӨ[6]. мқҙ л•Ңл¬ём—җ лҮҢмЎёмӨ‘мқҖ вҖңTime is brainвҖқмқҙлқјлҠ” л§җмқҙ мһҲмқ„ м •лҸ„лЎң л°ңлі‘ нӣ„ м№ҳлЈҢк№Ңм§Җ 1분 1мҙҲлқјлҸ„ мӢңк°„мқ„ лӢЁм¶•мӢңнӮӨлҠ” кІғмқҙ мӨ‘мҡ”н•ҳлӢӨ[1].мқҙлҘј мң„н•ң нҡЁкіјм Ғмқё л°©лІ•мқҖ лӢӨмқҢкіј к°ҷлӢӨ. мІ«м§ё, нҷҳмһҗлӮҳ лӘ©кІ©мһҗк°Җ 119 кө¬кёүлҢҖм—җ мӢ мҶҚнһҲ м—°лқҪмқ„ м·Ён•ңлӢӨ. л‘ҳм§ё, кө¬кёүлҢҖмӣҗмқҙ нҳ„мһҘм—җм„ң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лҘј нҸүк°Җн•ҳкі м№ҳлЈҢ к°ҖлҠҘн•ң лі‘мӣҗмқ„ м„ м •н•ҳм—¬ мқҙмҶЎн•ҳл©° нҷҳмһҗ лҸ„м°© м „ лі‘мӣҗм—җ м—°лқҪн•ҳм—¬ лҮҢмЎёмӨ‘ м№ҳлЈҢнҢҖмқ„ мӨҖ비мӢңнӮЁлӢӨ. м…Ӣм§ё, лі‘мӣҗмқҖ м „лӢ¬л°ӣмқҖ м •ліҙлҘј л°”нғ•мңјлЎң нҷҳмһҗ лҸ„м°© мҰүмӢң м№ҳлЈҢлҘј мӢңмһ‘н•ңлӢӨ[5].көӯлӮҙ н—ҲнҳҲлҮҢмЎёмӨ‘ л“ұлЎқ мһҗлЈҢм—җ л”°лҘҙл©ҙ 2011-2020л…„ мһ¬кҙҖлҘҳ м№ҳлЈҢмңЁмқҖ 14.7%м—җм„ң 17.5%лЎң мҰқк°Җн•ҳмҳҖкі лҮҢмЎёмӨ‘м „л¬ём№ҳлЈҢмӢӨ мҡҙмҳҒ л“ұмңјлЎң 3к°ңмӣ” мӮ¬л§қлҘ мқҖ 6.6%м—җм„ң 5.9%лЎң к°җмҶҢн•ҳмҳҖлӢӨ. мқҙкІғмқҖ көӯм ңм ҒмңјлЎңлҸ„ мҡ°мҲҳн•ң мҲҳмӨҖмқҙлӢӨ[7-9]. к·ёлҹ¬лӮҳ лі‘мӣҗ м „ лӢЁкі„мқҳ лҢҖмқ‘ лҠҘл Ҙкіј мӢңк°„ лӢЁм¶•мқҖ м—¬м „нһҲ н•ҙкІ° кіјм ңлЎң лӮЁм•„ мһҲлӢӨ.
- кІ° лЎ
- кІ° лЎ
кіјкұ°м—җлҠ” мӢ кІҪкіј мқҳмӮ¬к°Җ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мқҳ м№ҳлЈҢм—җ мЈјл Ҙн•ҳл©ҙ лҗҳм—Ҳм§Җл§Ң мөңк·јм—җлҠ” мқ‘кёү м№ҳлЈҢ мҷём—җлҸ„ к¶Ңм—ӯмӢ¬лҮҢнҳҲкҙҖм§Ҳнҷҳм„јн„°мҷҖ лҮҢмЎёмӨ‘ л„ӨнҠёмӣҢнҒ¬лҘј мӨ‘мӢ¬мңјлЎң лҮҢмЎёмӨ‘м „л¬ём№ҳлЈҢмӢӨ мҡҙмҳҒ, лі‘мӣҗ м „ лӢЁкі„ кҙҖлҰ¬, лӢӨн•ҷм ң нҳ‘л Ҙ, лҮҢмЎёмӨ‘ м№ҳлЈҢ м§Ҳ н–ҘмғҒ нҷңлҸҷ, көҗмңЎ, м—°кө¬ л“ұ лӢӨм–‘н•ң м—ӯн• мқ„ мҲҳн–үн•ҳкі мһҲлӢӨ.мөңк·ј л…ёл №нҷ”м—җ л”°лҘё лҮҢмЎёмӨ‘ нҷҳмһҗ мҰқк°ҖлЎң лҮҢмЎёмӨ‘ м№ҳлЈҢлҠ” к°ңлі„ мқҳмӮ¬мқҳ л…ёл Ҙл§ҢмңјлЎң к°җлӢ№н•ҳкё° м–ҙл Өмҡҙ мҲҳмӨҖмңјлЎң нҷ•лҢҖлҗҳкі мһҲлӢӨ. мқҙлҘј н•ҙкІ°н•ҳкё° мң„н•ҙ лҮҢмЎёмӨ‘ 진лЈҢ мӢңмҠӨн…ң к°ңм„ л°Ҹ м§Җмӣҗ м •мұ… к°•нҷ”, лҮҢмЎёмӨ‘ м „л¬ё мқёл Ҙ ліҙ충과 мІҳмҡ° к°ңм„ л“ұ м§ҖмҶҚм Ғ кҙҖмӢ¬кіј л…ёл Ҙмқҙ н•„мҡ”н• кІғмқҙлӢӨ.
FigureВ 2.
Emergency cardiovascular disease network pilot project model. (A) model before project implementation. (B)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nter-based network project. (C) Cardiovascular disease specialist-based network project.

TableВ 1.
The role of neurologists in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s and stroke networks
- REFERENCES
- REFERENCES
- 1. Powers WJ, Rabinstein AA, Ackerson T, Adeoye OM, Bambakidis NC, Becker K, et al. Guidelines for the early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2019 update to the 2018 guidelines for the early management of acute ischemic stroke: a guidelin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Stroke 2019;50:e344-e418.
[PubMed]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ortality trends, 2012-2022. Public Health Wkly Rep 2024;17:1391-1392.3. Kim J, Hwang YH, Kim JT, Choi NC, Kang SY, Cha JK, et al. Establishment of government-initiated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for acute ischemic stroke management in South Korea. Stroke 2014;45:2391-2396.
[Article] [PubMed]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ilot project for problem-solving care cooperation network for severe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online] [cited 2025 Apr 21]. Available from: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338&pageIndex=1&pageIndex2=1#none.5. Fassbender K, Walter S, Grunwald IQ, Merzou F, Mathur S, Lesmeister M, et al. Prehospital stroke management in the thrombectomy ERA. Lancet Neurol 2020;19:601-610.
[Article] [PubMed]7. Jeong HY, Jung KH, Mo H, Lee CH, Kim TJ, Park JM, et a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stroke in Korea: 2014-2018 data from Korean Stroke Registry. Int J Stroke 2020;15:619-626.
[Article] [PubMed]8. Lee KB, Lee JS, Lee JY, Kim JY, Jeong HY, Kim SE, et al. Quality of acute stroke care with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proposal for severe emergency medical center. J Korean Neurol Assoc 2023;41:18-30.
[Article]9. Park TH, Hong KS, Cho YJ, Ryu WS, Kim DE, Park MS, et al. Temporal trends in stroke management and outcomes between 2011 and 2020 in South Korea: results from a nationwide multicenter registry. J Am Heart Assoc 2025;14:e035218.
[Article] [PubMed] [PMC]10. Fire Department Emergency Rescue Capacity Development Team. 119 emergency service quality management report (2023 emergency rescue activities). [online] [cited 2025 Apr 21]. Available from: https://www.nfsa.go.kr/nfa/releaseinformation/statisticalinformation/main/?mode=view&cntId=65.11. Choi JC, Kim JG, Kang CH, Bae HJ, Kang J, Lee SJ, et al. Effect of transport time on the use of reperfusion therapy for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in Korea. J Korean Med Sci 2021;36:e77.
[Article] [PubMed] [PMC]12. Kim DH, Moon SJ, Lee J, Cha JK, Kim MH, Park JS, et al.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direct versus transferred-in admission to government-designated regional centers between acute ischemic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in Korea. J Korean Med Sci 2022;37:e305.
[Article] [PubMed] [PMC]13. Kim DH, Bae HJ, Han MK, Kim BJ, Park SS, Park TH, et al. Direct admission to stroke centers reduces treatment delay and improves clinical outcome after intravenous thrombolysis. J Clin Neurosci 2016;27:74-79.
[Article] [PubMed]14. Lee HJ, Shin DH, Yang KI, Koh IS, Lee KB, Lee WW, et al. The investigation on the burden of neurology residents to manage the patient who received thrombolytic treat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with hyperacute stroke. J Korean Neurol Assoc 2021;39:305-311.
[Article]15. Kang J, Kim SE, Park HK, Cho YJ, Kim JY, Lee KJ, et al. Routing to endovascular treatment of ischemic stroke in Korea: recognition of need for process improvement. J Korean Med Sci 2020;35:e347.
[Article] [PubMed] [PMC]16. Prabhakaran S, Ward E, John S, Lopes DK, Chen M, Temes RE, et al. Transfer delay is a major factor limiting the use of intra-arterial treatment in acute ischemic stroke. Stroke 2011;42:1626-1630.
[Article] [PubMed]17. McTaggart RA, Moldovan K, Oliver LA, Dibiasio EL, Baird GL, Hemendinger ML, et al. Door-in-door-out time at primary stroke centers may predict outcome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patients. Stroke 2018;49:2969-2974.
[Article] [PubMed]18. Fonarow GC, Zhao X, Smith EE, Saver JL, Reeves MJ, Bhatt DL, et al. Door-to-needle times for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administration and clinical outcomes in acute ischemic stroke before and after a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 JAMA 2014;311:1632-1640.
[Article] [PubMed]19. Kim JY, Kang K, Kang J, Koo J, Kim DH, Kim BJ, et al. Executive summary of stroke statistics in korea 2018: a report from the epidemiology research council of the Korean stroke society. J Stroke 2019;21:42-59.
[Article] [PubMed]20. Kim D, Jo N, Cha JK, Choi H, Jeong SW, Koh IS, et al. Workload in emergency rooms among clinical specialties and overburdened neurologists. J Korean Neurol Assoc 2022;40:127-136.
[Article]21. Na JH. Stroke unit. In: Korean Stroke Society. Stroke. 3rd ed. Seoul: Panmuneducation, 2024;397-402.22. Lee SH, Ryoo HW, Jin SC, Ahn JY, Sohn SI, Hwang YH, et al. Prehospital notification using a mobile application can improve regional stroke care system in a metropolitan area. J Korean Med Sci 2021;36:e327.
[Article] [PubMed] [PMC]23. Kim DH, Nah HW, Park HS, Choi JH, Kang MJ, Huh JT, et al. Impact of prehospital intervention on delay time to thrombolytic therapy in a stroke center with a systemized stroke code program. J Stroke Cerebrovasc Dis 2016;25:1665-1670.
[Article] [PubMed]24. Cho JH, Chung HI, Yoon BA, Kim DH, Cha JK.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stroke care system through the acute stroke hotline in Busan metropolitan area. J Korean Neurol Assoc 2023;41:274-280.
[Article]25. Heo JH, Kim YD, Nam HS, Hong KS, Ahn SH, Cho HJ, et al. A computerized in-hospital alert system for thrombolysis in acute stroke. Stroke 2010;41:1978-1983.
[Article] [PubMed]26. Bae HJ. Quality improvement and assessment in stroke care. In: Korean Stroke Society. Stroke. 3rd ed. Seoul: Panmuneducation, 2024;403-410.27. Korean Stroke Society. Certification criteria for stroke centers. [online] [cited 2025 Apr 21]. Available from: https://stroke.or.kr/secretariat/certifyhospita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