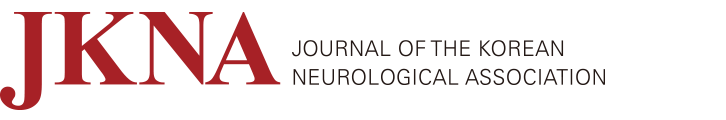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Past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Demonstrating Significant Improvement with Fremanezumab
- Ji Hyun Kim, MD, Jinhyuk Cho, MD
кіјкұ°мқҳ к°Җм—ӯлҮҢнҳҲкҙҖмҲҳ축мҰқнӣ„кө°м—җ кё°мқён•ң м§ҖмҶҚ л‘җнҶө нҷҳмһҗм—җм„ң н”„л Ҳл§Ҳл„ӨмЈјл§ҷ м№ҳлЈҢлЎң мң мқҳн•ң нҳём „мқ„ ліҙмқё мҰқлЎҖ
- к№Җм§Җнҳ„, 조진нҳҒ
- Received November 20, 2024; В В В Revised December 19, 2024; В В В Accepted December 24, 2024;
- ABSTRACT
-
A 45-year-old woman with a history of migraine experienced thunderclap headaches, after which cerebral vasospasm was confirmed by brain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Nimodipine treatment initially improved the headache, but moderate daily headaches persisted despite vasospasm resolution. Conventional headache medications including topiramate, propranolol and amitriptyline proved ineffective. Treatment with fremanezumab, a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targeted therapy, resulted in significant reduction of headache frequency and intensity after 3 months. This case suggests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CGRP inhibition for persistent headaches following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к°Җм—ӯлҮҢнҳҲкҙҖмҲҳ축мҰқнӣ„кө°(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RCVS)мқҖ лІјлқҪл‘җнҶө мқҙнӣ„ лӢӨл°ңм„ұ лҮҢнҳҲкҙҖ нҳ‘м°©мқҙ л°ңмғқн•ң л’Ө 3к°ңмӣ” мқҙлӮҙм—җ лҮҢнҳҲкҙҖ нҳ‘м°©мқҙ м •мғҒм ҒмңјлЎң лҸҢм•„мҳӨлҠ” мҰқнӣ„кө°мқҙлӢӨ[1,2]. ліҙнҶө лҮҢмһҗкё°кіөлӘ…нҳҲкҙҖмЎ°мҳҒмҲ , лҮҢм „мӮ°нҷ”лӢЁмёөнҳҲкҙҖмЎ°мҳҒмҲ к·ёлҰ¬кі кІҪлҢҖнҮҙлҮҢнҳҲкҙҖмЎ°мҳҒмҲ л“ұмқҙ 진лӢЁм—җ н•„мҡ”н•ҳл©°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кҙҖм°°лҗң мқҙнӣ„ 추м Ғ мҳҒмғҒм—җм„ң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нҳём „лҗҳлҠ” мҶҢкІ¬мқҙ н•„мҡ”н•ҳлӢӨ. л‘җнҶөмқҖ лІјлқҪл‘җнҶө м–‘мғҒмңјлЎң мӢңмһ‘лҗҳм–ҙ мқҙнӣ„ кІҪн•ң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лҠ” кІғмқҙ нҠ№м§•м Ғмқҙл©° л°ңмӮҙл°” мң мӮ¬ мЎ°мһ‘, мҡёмқҢ, кё°м№Ё, мҡҙлҸҷ, м„ұн–үмң„ мӢңм—җ л°ңмғқн• мҲҳ мһҲкі мӮ°нӣ„ мғҒнғңлӮҳ нҳҲкҙҖнҷңм„ұл¬јм§Ҳмқҙ мң л°ң мҡ”мқёмқҙ лҗ мҲҳ мһҲлӢӨ[1]. RCVSлҠ” мқјл°ҳм ҒмңјлЎң лӢЁмғҒ(monophasic) л°ңлі‘ м§ҲнҷҳмңјлЎң м—¬кІЁм§Җм§Җл§Ң мқјл¶Җ нҷҳмһҗм—җм„ңлҠ” мһ¬л°ңн•ҳлҠ” кІҪмҡ°к°Җ мһҲлӢӨ[2,3]. н•ң м—°кө¬м—җ л”°лҘҙл©ҙ RCVS нҷҳмһҗмқҳ 22%м—җм„ң л§Ңм„ұ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м—Ҳмңјл©° л‘җнҶөмқҖ мЈјлЎң нӣ„л‘җл¶ҖмҷҖ мёЎл‘җл¶Җм—җ кІҪлҜён•ң нҳ•нғңлЎң лӮҳнғҖлӮ¬лӢӨ. мқҙ мӨ‘ 20%лҠ” көӯм ңл‘җнҶөм§Ҳнҷҳ분лҘҳ м ң3нҢҗм—җ л¶Җн•©н•ҳлҠ” нҺёл‘җнҶө м–‘мғҒмқ„ ліҙмҳҖлӢӨ[2]. көӯм ңл‘җнҶөм§Ҳнҷҳ분лҘҳ м ң3нҢҗм—җм„ңлҠ” RCVSм—җ кё°мқён•ң л‘җнҶөмқҙ л°ңмғқ мӢңл¶Җн„° 3к°ңмӣ” мқҙмғҒ м§ҖмҶҚлҗҳлҠ” кІҪмҡ°м—җлҠ” кіјкұ°мқҳ RCVSм—җ кё°мқён•ң м§ҖмҶҚ л‘җнҶөмңјлЎң 분лҘҳн•ҳмҳҖлӢӨ[4]. м Җмһҗл“ӨмқҖ нҺёл‘җнҶө кіјкұ°л Ҙмқҙ мһҲлҚҳ нҷҳмһҗк°Җ лІјлқҪл‘җнҶө мқҙнӣ„м—җ л°ңмғқн•ң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мҷ„м „нһҲ нҳём „лҗҳм—ҲмқҢм—җлҸ„ 2л…„ к°Җк№Ңмқҙ м§ҖмҶҚм ҒмңјлЎң л‘җнҶөмқ„ нҳёмҶҢн•ҳм—¬ н”„л Ҳл§Ҳл„ӨмЈјл§ҷ(fremanezumab) м№ҳлЈҢ мқҙнӣ„ л‘җнҶөмқҙ нҳём „лҗң мҰқлЎҖлҘј кІҪн—ҳн•ҳм—¬ мқҙлҘј ліҙкі н•ҳлҠ” л°”мқҙлӢӨ.
- мҰқ лЎҖ
- мҰқ лЎҖ
нҺёл‘җнҶө кіјкұ°л Ҙмқҙ мһҲлҚҳ 45м„ё м—¬м„ұмқҙ лӮҙмӣҗ 3мқј м „л¶Җн„° л°ңмғқн•ң л‘җнҶөмқ„ мЈјмҶҢлЎң мӢ кІҪкіј мҷёлһҳлҘј лӮҙмӣҗн•ҳмҳҖлӢӨ. нҷҳмһҗлҠ” 10лҢҖ л•Ң к°„н—җм ҒмңјлЎң мӢ¬н•ң л‘җнҶөкіј мҳӨмӢ¬мқҙ мһҲм—ҲлҚҳ лі‘л Ҙмқҙ мһҲм—ҲмңјлӮҳ мқҙнӣ„ 30л…„к°„ л‘җнҶөмқҖ м—Ҷм—ҲлӢӨкі н•ҳмҳҖлӢӨ. лӮҙмӣҗ 3мқј м „ нҷҳмһҗлҠ” мҲҳмҳҒ к°•мҠө мӨ‘ мһ мҳҒмқ„ м§ҖмҶҚн•ҳлӢӨ к°‘мһ‘мҠӨлҹҪкІҢ м–‘мёЎ мёЎл‘җм—Ҫ мЈјліҖм—җ н„°м§Ҳ л“Ҝн•ң м–‘мғҒмқҳ л‘җнҶөмқҙ л°ңмғқн•ҳмҳҖмңјл©° 1-2분 лӮҙм—җ мӢңк°Ғм•„лӮ лЎңк·ёмІҷлҸ„(visual analogue scale, VAS) 8м җк№Ңм§Җ мҰқк°Җн•ҳмҳҖлӢӨк°Җ мҲҳмӢӯ 분 нӣ„ VAS 5м җмңјлЎң нҳём „лҗҳм—ҲлӢӨ. лӢӨмқҢ лӮ м—җлҸ„ мҲҳмҳҒ к°•мҠө мӨ‘ лҸҷмқјн•ң м–‘мғҒмқҳ лІјлқҪл‘җнҶөмқҙ л‘җ м°ЁлЎҖ лҚ” л°ңмғқн•ҳмҳҖлӢӨ. лӮҙмӣҗ лӢ№мӢң л‘җнҶө мқҙмҷём—җ кө¬м—ӯ, кө¬нҶ , л№ӣкіөнҸ¬мҰқ, мҶҢлҰ¬кіөнҸ¬мҰқ, м–ҙм§Җлҹј л“ұмқҳ лҸҷл°ҳ мҰқмғҒмқҖ м—Ҷм—Ҳмңјл©° л°ңм—ҙмқҙлӮҳ мғҒкё°лҸ„к°җм—ј 징нӣ„лҸ„ кҙҖм°°лҗҳм§Җ м•Ҡм•ҳлӢӨ. мӢ кІҪкі„ 진찰м—җм„ң көӯмҶҢмӢ кІҪн•ҷм Ғ мқҙмғҒ мҶҢкІ¬мқҖ л°ңкІ¬лҗҳм§Җ м•Ҡм•ҳлӢӨ.к°‘мһ‘мҠӨлҹҪкІҢ л°ңмғқн•ң л‘җнҶөм—җ лҢҖн•ҳм—¬ лҮҢмһҗкё°кіөлӘ…мҳҒмғҒ, мһҗкё°кіөлӘ…нҳҲкҙҖмЎ°мҳҒмҲ мқ„ н•ҳмҳҖкі м–‘мёЎ мӨ‘лҢҖлҮҢлҸҷл§Ҙ(middle cerebral artery)мқҳ M1분м Ҳ, м–‘мёЎ м „лҢҖлҮҢлҸҷл§Ҙ(anterior cerebral artery)мқҳ A1분м Ҳ, мҡ°мёЎ мІҷ추лҸҷл§Ҙ(vertebral artery)мқҳ V4분м Ҳ л°Ҹ м–‘мёЎ лӮҙкІҪлҸҷл§Ҙ(internal carotid artery) мӣҗмң„л¶Җм—җм„ң лӢӨл°ңм„ұ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нҷ•мқёлҗҳм—ҲлӢӨ(Fig. A, B). лҮҢмӢӨм§Ҳм—җлҠ” лҮҢм¶ңнҳҲ, лҮҢкІҪмғүмқ„ нҸ¬н•Ён•ң мқҙмғҒ мҶҢкІ¬мқҖ кҙҖм°°лҗҳм§Җ м•Ҡм•ҳлӢӨ. мҙқ мҪңл ҲмҠӨн…ҢлЎӨ, мӨ‘м„ұм§Җл°©, м Җл°ҖлҸ„мҪңл ҲмҠӨн…ҢлЎӨмқ„ нҸ¬н•Ён•ң лӢӨлҘё нҳҲм•Ў кІҖмӮ¬ кІ°кіјм—җм„ңлҠ” нҠ№мқҙ мҶҢкІ¬мқҖ нҷ•мқёлҗҳм§Җ м•Ҡм•ҳлӢӨ.мғҒкё° кІ°кіј л°Ҹ нҷҳмһҗмқҳ мҰқмғҒмқ„ мў…н•©н•ҳмҳҖмқ„ л•Ң м Җмһҗл“ӨмқҖ RCVS мҶҢкІ¬мңјлЎң нҷҳмһҗм—җкІҢ лӢҲлӘЁл””н•Җмқ„ нҲ¬м•Ҫн•ҳмҳҖлӢӨ. лӢҲлӘЁл””н•ҖмқҖ 30 mg н•ҳлЈЁ 3нҡҢм—җм„ң м„ңм„ңнһҲ мҰқлҹүн•ҳм—¬ мІ« 2мЈјк°„ 60 mgмқ„ н•ҳлЈЁ 6нҡҢ нҷҳмһҗм—җкІҢ нҲ¬м—¬н•ҳмҳҖмңјл©° нҷҳмһҗк°Җ мқјмқ„ 2мЈјк°„ мү¬лҠ” лҸҷм•Ҳ л‘җнҶөмқҖ VAS 3м җк№Ңм§Җ м җм°Ё нҳём „лҗҳм—ҲлӢӨ. к·ёлҹ¬лӮҳ мӮ¬л¬ҙм§Ғмқ„ лӢӨмӢң мӢңмһ‘н•ҳл©ҙм„ңл¶Җн„° л‘җнҶөмқҙ VAS 5м җмңјлЎң м•…нҷ”лҗҳм–ҙ 2лӢ¬к°„ мқјмқ„ мү¬л©ҙм„ң к·ё кё°к°„ лҸҷм•Ҳ лӢҲлӘЁл””н•Җ 60 mgмқ„ н•ҳлЈЁ 3-5нҡҢлЎң ліөмҡ©н•ҳмҳҖлӢӨ. л‘җнҶө л°ңмғқ мқҙнӣ„ м•Ҫ 80мқј л’Өм—җ 추м Ғн•ң лҮҢмһҗкё°кіөлӘ…нҳҲкҙҖмЎ°мҳҒмҲ м—җм„ңлҠ” мқҙм „м—җ нҷ•мқёлҗң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мҷ„м „нһҲ нҳём „лҗҳм—ҲлӢӨ(Fig. C, D). мқҙнӣ„ лӢҲлӘЁл””н•Җмқ„ 30 mg н•ҳлЈЁ 3нҡҢлЎң к°җлҹүн•ҳмҳҖмңјл©° лӢҲлӘЁл””н•Җ м№ҳлЈҢ мқҙнӣ„лЎңлҠ” лІјлқҪл‘җнҶөмқҖ л°ңмғқн•ҳм§Җ м•Ҡм•ҳлӢӨ. к·ёлҹ¬лӮҳ лӢӨмӢң мқјмқ„ мӢңмһ‘н•ң л’ӨлЎң л‘җнҶөмқҳ к°•лҸ„к°Җ VAS 3-5м җмңјлЎң л§Өмқјл§ҲлӢӨ м§ҖмҶҚлҗҳм—Ҳмңјл©° лӢҲлӘЁл””н•Җ 1лӢ¬ лҚ” м§ҖмҶҚ нӣ„ мҙқ 100м—¬мқј ліөмҡ© нӣ„ мӨ‘лӢЁн•ҳмҳҖлӢӨ.нҷҳмһҗлҠ”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нҳём „лҗҳм—ҲмқҢм—җлҸ„ кө¬м—ӯ, кө¬нҶ , л№ӣкіөнҸ¬мҰқ, мҶҢлҰ¬кіөнҸ¬мҰқмқҳ нҺёл‘җнҶө лҸҷл°ҳ мҰқмғҒмқҙ м—Ҷмқҙ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м—ҲлӢӨ. л‘җнҶө м№ҳлЈҢлҘј мң„н•ҳм—¬ нҶ н”јлқјл©”мқҙнҠё 25 mgмңјлЎң мӢңмһ‘н•ҳм—¬ 100 mgк№Ңм§Җ мҰқлҹүн•ҳмҳҖкі н”„лЎңн”„лқјлҶҖлЎӨмқ„ 20 mgм—җм„ң 40 mgк№Ңм§Җ мҰқлҹүн•ҳм—¬ мҙқ 23к°ңмӣ”к°„ нҲ¬м•Ҫн•ҳмҳҖлӢӨ. лҳҗн•ң м•„лҜёнҠёлҰҪнӢёлҰ°мқ„ 5 mgм—җм„ң 10 mgк№Ңм§Җ 14к°ңмӣ” лҸҷм•Ҳ лі‘мҡ©н•ҳмҳҖмңјлӮҳ л‘җнҶөмқҳ лҡңл ·н•ң нҳём „мқҖ м—Ҷм—ҲлӢӨ. л‘җнҶө л°ңмғқ мӢң лқјмҠӨлҜёл””нғ„мқ„ 추к°ҖлЎң ліөмҡ©н•ҳмҳҖмңјлӮҳ мӢ¬н•ң мЎёлҰјкіј лҚ”л¶Ҳм–ҙ нҒ° нҡЁкіјк°Җ м—Ҷм—ҲлӢӨ. лІјлқҪл‘җнҶө л°ңмғқ 150мқј л’Ө 추м Ғн•ң лҮҢмһҗкё°кіөлӘ…мҳҒмғҒ л°Ҹ лҮҢмһҗкё°кіөлӘ…нҳҲкҙҖмЎ°мҳҒмҲ м—җм„ңлҠ” м—¬м „нһҲ нҠ№лі„н•ң мқҙмғҒ мҶҢкІ¬мқҖ кҙҖм°°лҗҳм§Җ м•Ҡм•ҳлӢӨ. нҷҳмһҗмқҳ л‘җнҶөмқҖ л§Өмқј м§ҖмҶҚлҗҳм—Ҳмңјл©° лІјлқҪл‘җнҶө мқҙнӣ„ 1л…„м—¬м§ё нҺёл‘җнҶөмһҘм• мІҷлҸ„(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MIDAS) м җмҲҳлҠ” 31м җ, 2л…„м—¬м§ё MIDAS м җмҲҳлҠ” лӢӨмҶҢ к°җмҶҢн•ҳм—¬ 16м җмқҙм—ҲмңјлӮҳ м—¬м „нһҲ мӣ”к°„ л‘җнҶөмқјмҲҳк°Җ 15мқј мқҙмғҒмқҙм—ҲлӢӨ. кіјкұ° нҺёл‘җнҶө лі‘л Ҙмқҙ мһҲм—Ҳм§Җл§Ң мөңк·ј 30л…„к°„ л‘җнҶөмқҙ м—ҶлҚҳ нҷҳмһҗлЎң лІјлқҪл‘җнҶө мқҙнӣ„ лӢӨл°ңм„ұ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л“Өмқҙ нҳём „лҗҳм—ҲмқҢм—җлҸ„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м–ҙ н”„л Ҳл§Ҳл„ӨмЈјл§ҷ 225 mgмқ„ 4мЈј к°„кІ©мңјлЎң мЈјмӮ¬ м№ҳлЈҢлҘј мӢңмһ‘н•ҳмҳҖлӢӨ. мІ« лІҲм§ё н”„л Ҳл§Ҳл„ӨмЈјл§ҷ 225 mg м№ҳлЈҢ мӢңмһ‘ нӣ„ 4мЈј л’Ө 추м Ғм—җм„ңлҠ” мӣ”к°„л‘җнҶөмқјмҲҳ 30мқјлЎң нҒ° нҳём „мқ„ ліҙмқҙм§Җ м•Ҡм•ҳмңјлӮҳ л‘җ лІҲм§ё мЈјмӮ¬ мқҙнӣ„ мӣ”к°„л‘җнҶөмқјмҲҳ 20мқј, м„ё лІҲм§ё мЈјмӮ¬ м№ҳлЈҢ мқҙнӣ„ мӣ”к°„л‘җнҶөмқјмҲҳ 10мқј м •лҸ„лЎң м„ңм„ңнһҲ нҳём „лҗҳм—ҲлӢӨ. л‘җнҶөмқҳ л№ҲлҸ„лҝҗ м•„лӢҲлқј к°•лҸ„лҸ„ к°җмҶҢн•ҳм—¬ 3к°ңмӣ” к°„мқҳ MIDAS м җмҲҳлҠ” 0м җмңјлЎң нҷ•мқёлҗҳм—ҲлӢӨ.
- кі м°°
- кі м°°
RCVSм—җм„ң л°ңмғқн•ҳлҠ” лӢӨл°ңм„ұ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ҳ лі‘нғңмғқлҰ¬лҠ” нҳ„мһ¬к№Ңм§Җ лҡңл ·н•ҳкІҢ л°қнҳҖм§Җм§Җ м•Ҡм•ҳмңјлӮҳ лҮҢнҳҲкҙҖкёҙмһҘ мЎ°м Ҳ мқҙмғҒ, көҗк°җ мӢ кІҪмқҳ кіјнҷңм„ұ, нҳҲкҙҖ лӮҙн”јмқҳ кё°лҠҘмһҘм• , нҳҲм•ЎлҮҢмһҘлІҪмқҳ нҢҢкҙҙ л°Ҹ мӮјм°ЁмӢ кІҪ-нҳҲкҙҖ нҶөк°ҒмҲҳмҡ©мІҙ(trigeminovascular nociception) мһ‘мҡ©мқҳ ліҖнҷ” л“ұ м—¬лҹ¬ мӣҗмқё к°Җм„Өмқҙ мһҲлӢӨ[5]. кіјлҸ„н•ң көҗк°җмӢ кІҪ нҷңм„ұмңјлЎң нҳҲкҙҖмқҳ кёҙмһҘ ліҖнҷ”к°Җ мқјм–ҙлӮҳкі мқҙлЎң мқён•ҳм—¬ лҮҢнҳҲкҙҖ мҲҳ축과 нҳҲкҙҖ нҷ•мһҘмқ„ мқјмңјнӮ¬ мҲҳ мһҲлӢӨ. лҳҗн•ң к°‘мһ‘мҠӨлҹ¬мҡҙ нҳҲм•• мғҒмҠ№ л°Ҹ л°ңмӮҙл°” мЎ°мһ‘мқҖ көҗк°җмӢ кІҪ нҷңм„ұлҸ„лҘј мҳ¬лҰҙ мҲҳ мһҲмңјлҜҖлЎң көҗк°җмӢ кІҪмқҳ кіјлҸ„н•ң нҷңм„ұнҷ”лҠ” RVVSмқҳ лі‘мқёмңјлЎң м„ӨлӘ…лҗ мҲҳ мһҲлӢӨ[5]. мӮјм°Ё нҳҲкҙҖм„ұ кІҪлЎң(trigeminovascular pathway)лҠ” мғқлҰ¬м ҒмңјлЎң лҮҢнҳҲкҙҖм—җ мң мқјн•ң к°җк°ҒмӢ кІҪмқ„ м§Җл°°н•ҳм—¬ нҳҲкҙҖ мҲҳ축 мһҗк·№ мқҙнӣ„ нҳҲкҙҖ кёҙмһҘмқ„ нҡҢліөмӢңнӮӨлҠ” м—ӯн• мқ„ н•ҳкі мқҙлҹ¬н•ң мһ‘мҡ©мқҖ мӮјм°Ё нҶөк°ҒмҲҳмҡ©мІҙ(trigeminal nociceptor)м—җм„ң 분비лҗҳлҠ” к°•л Ҙн•ң нҳҲкҙҖ нҷ•мһҘм„ұ мӢ кІҪнҺ©нғҖмқҙл“ңмқё м№јмӢңнҶ лӢҢмң м „мһҗкҙҖл ЁнҺ©нғҖмқҙл“ң(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м—җ мқҳн•ҳм—¬ мқҙлЈЁм–ҙм§Ҳ к°ҖлҠҘм„ұмқҙ мһҲлӢӨ[5]. RCVS нҷҳмһҗм—җм„ңлҸ„ мқҙмҷҖ к°ҷмқҖ мӮјм°ЁнҳҲкҙҖл°ҳмӮ¬к°Җ нҷңм„ұнҷ”лҗ мҲҳ мһҲмңјл©° кёүм„ұ нҳҲкҙҖ мҲҳ축 мқҙнӣ„ мӮјм°ЁнҳҲкҙҖл°ҳмӮ¬мқҳ кіјлҸ„н•ң нҷңм„ұнҷ”лҘј нҶөн•ң нҳҲкҙҖ кёҙмһҘмқҙ нҡҢліөн•ҳлҠ” кіјм •мқҙ л°ңмғқн•ңлӢӨ[5]. мқҙлҠ” RCVSк°Җ лӢЁмҲңн•ң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ҳ л¬ём ңлҘј л„ҳм–ҙм„ң мӮјм°ЁмӢ кІҪкі„мҷҖ кҙҖл Ёлҗң ліөмһЎн•ң мӢ кІҪнҳҲкҙҖ мЎ°м Ҳмқҳ мқҙмғҒкіј м—°кҙҖлҗ мҲҳ мһҲмқҢмқ„ мӢңмӮ¬н•ңлӢӨ. лӢӨлҘё м—°кө¬м—җм„ңлҠ” RCVSмқҳ кёүм„ұкё°мҷҖ нҺёл‘җнҶөмқҳ л°ңмһ‘кё°м—җм„ң let-7a-5p, let-7b-5p, let-7f-5p л“ұмқҳ microRNAл“Өмқҙ мғҒн–Ҙ мЎ°м Ҳ(upregulation)лҗҳм—ҲлӢӨк°Җ RCVSмқҳ кҙҖн•ҙкё° лҳҗлҠ” нҺёл‘җнҶөмқҳ л°ңмһ‘ к°„ лӢЁкі„м—җм„ңлҠ” м •мғҒ мҲҳм№ҳлЎң лҸҢм•„мҳҙмқ„ л°ңкІ¬н•ҳмҳҖлӢӨ[6]. мқҙлҹ¬н•ң microRNAл“ӨмқҖ CGRP мқҳмЎҙм„ұ мӮјм°ЁнҳҲкҙҖл°ҳмӮ¬лҘј мЎ°м Ҳн• мҲҳ мһҲлҠ” к°ҖлҠҘм„ұмқҙ мһҲмңјл©° мқҙлҠ” RCVSмҷҖ нҺёл‘җнҶө мӮ¬мқҙмқҳ кёүм„ұ нҶөмҰқкіј кҙҖл Ёлҗң лі‘лҰ¬ кё°м „мқ„ м„ӨлӘ…н•ҳлҠ” лҚ° лҸ„мӣҖмқҙ лҗңлӢӨ. нҠ№нһҲ let-7bмқҳ м–өм ңлҠ” л’ӨлҝҢлҰ¬мӢ кІҪм Ҳ(dorsal root ganglion) мӢ кІҪм„ёнҸ¬м—җм„ң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ankyrin 1 (TRPA1) м „лҘҳмҷҖ мһҗл°ңм Ғ нҶөмҰқмқ„ к°җмҶҢмӢңмј°мңјл©° л°ҳлҢҖлЎң TRPA1мқҳ нҷңм„ұнҷ”лҠ” мӮјм°ЁмӢ кІҪм Ҳм—җм„ң CGRP 분비лҘј мң лҸ„н•ҳкі мӮјм°ЁнҳҲкҙҖл°ҳмӮ¬лҘј мқјмңјнӮ¬ мҲҳ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ЎҢлӢӨ[6]. л”°лқјм„ң RCVS кёүм„ұкё° мқҙнӣ„ let-7 family microRNAмқҳ нҷңм„ұнҷ”лЎң мқён•ң мӮјм°ЁмӢ кІҪм Ҳм—җм„ңмқҳ CGRP 분비лҠ” нҺёл‘җнҶө нҷҳмһҗм—җм„ң м§ҖмҶҚм Ғмқё л‘җнҶөмқҙ л°ңмғқн• мҲҳ мһҲлҠ” л°°кІҪмқҙ лҗ мҲҳ мһҲмңјл©° RCVSмҷҖ нҺёл‘җнҶөмқҖ л‘җнҶө л°ңмғқ л©”м»ӨлӢҲмҰҳм—җм„ң кіөнҶөм Ғмқё мӢ кІҪнҷ”н•ҷм Ғ кё°м „мқ„ кіөмң н• к°ҖлҠҘм„ұмқҙ мһҲлӢӨ. нҠ№нһҲ кіјкұ°мқҳ RCVSм—җ кё°мқён•ң м§ҖмҶҚ л‘җнҶөмқҳ лҢҖн‘ңм Ғмқё мЈјмҡ” мң„н—ҳмқёмһҗлЎң нҺёл‘җнҶө лі‘л Ҙмқҙ нҸ¬н•ЁлҗңлӢӨлҠ” м җ[3]мқҖ л‘җ м§Ҳнҷҳмқҙ мӮјм°ЁнҳҲкҙҖл°ҳмӮ¬мҷҖ CGRP 분비мҷҖ л°Җм ‘н•ҳкІҢ м—°кҙҖлҗҳм–ҙ мһҲмқҢмқ„ л’·л°ӣм№Ён•ҳлҠ” к·јкұ°к°Җ лҗңлӢӨ. CGRPлҠ” лҮҢнҳҲкҙҖмқҳ мқҙмҷ„кіј кҙҖл Ёлҗң мӢ кІҪнҺ©нғҖмқҙл“ңлЎң CGRP н‘ңм Ғ м№ҳлЈҢлҠ” лҮҢнҳҲкҙҖ мқҙмҷ„мқ„ к°Җм—ӯм ҒмңјлЎң м–өм ңн•ңлӢӨ. мқјл°ҳм ҒмңјлЎң нҳҲкҙҖ мҲҳ축мқ„ м§Ғм ‘м ҒмңјлЎң мң л°ңн•ҳм§Җ м•Ҡм§Җл§Ң лӘҮлӘҮ мӮ¬лЎҖм—җм„ң нҺёл‘җнҶө нҷҳмһҗмқҳ CGRP н‘ңм Ғ м№ҳлЈҢ мқҙнӣ„ RCVSк°Җ м•…нҷ” лҳҗлҠ” мң л°ңлҗҳм—ҲлӢӨкі ліҙкі н•ҳмҳҖлӢӨ[7-9]. лӢӨл§Ң к°Ғ мӮ¬лЎҖлҘј мӮҙнҺҙліҙл©ҙ RCVSлҘј мқјмңјнӮ¬ мҲҳ мһҲлҠ” м„ н–ү мҡ”мқёмқҙ мЎҙмһ¬н•ҳмҳҖ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м„ нғқм Ғм„ёлЎңнҶ лӢҢмһ¬нқЎмҲҳм Җн•ҙм ңлҘј ліөмҡ© мӨ‘мқё нҷҳмһҗк°Җ нҺёл‘җнҶө мЎ°м Ҳмқ„ мң„н•ҳм—¬ л§Өмқј лҰ¬мһҗнҠёлҰҪнғ„мқ„ ліөмҡ©н•ҳлӢӨк°Җ лІјлқҪл‘җнҶөмқҙ лЁјм Җ л°ңмғқн•ҳмҳҖмңјл©° мқҙлҘј мЎ°м Ҳн•ҳкё° мң„н•ҳм—¬ н”„л Ҳл§Ҳл„ӨмЈјл§ҷмқ„ мЈјмӮ¬н•ң л’Ө RCVSк°Җ м•…нҷ”лҗң мҰқлЎҖ ліҙкі к°Җ мһҲм—ҲлӢӨ[7]. лӢӨлҘё мӮ¬лЎҖм—җм„ңлҠ” м—җл ҲлҲ„л§ҷ л‘җ лІҲм§ё мЈјмӮ¬ мқҙнӣ„ м„ұкҙҖкі„ мӨ‘ л°ңмғқн•ң л‘җ м°ЁлЎҖмқҳ лІјлқҪл‘җнҶөкіј н•Ёк»ҳ м—ҳл ҲнҠёлҰҪнғ„мқ„ ліөмҡ©н•ң л’Ө RCVSк°Җ мң л°ңлҗң мӮ¬лЎҖмқҙлӢӨ[8]. л§Ҳм§Җл§ү мӮ¬лЎҖм—җм„ңлҠ” нҺёл‘җнҶө нҷҳмһҗм—җкІҢ к°Ҳм№ҙл„ӨмЈјл§ҷ 240 mgмқ„ нҲ¬м—¬н•ң нӣ„ лҮҢмһҗкё°кіөлӘ…нҳҲкҙҖмЎ°мҳҒмҲ м—җм„ң 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нҷ•мқёлҗҳм–ҙ RCVSлЎң ліҙкі н•ҳмҳҖмңјлӮҳ 3к°ңмӣ”м§ё 추м Ғ мҳҒмғҒм—җм„ң 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лӮЁм•„мһҲм—Ҳмңјл©° нҷҳмһҗк°Җ лІјлқҪл‘җнҶөмқ„ нҳёмҶҢн•ҳм§Җ м•Ҡм•ҳмңјлҜҖлЎң м „нҳ•м Ғмқё RCVSмқҳ мӮ¬лЎҖлҠ” м•„лӢҲм—ҲлӢӨлҠ” м җм—җм„ң ліҙкі мқҳ н•ңкі„к°Җ мһҲлӢӨ[9]. CGRP н‘ңм Ғ м№ҳлЈҢк°Җ лҮҢнҳҲкҙҖ мқҙмҷ„мқ„ л°©н•ҙн• мҲҳ мһҲлӢӨлҠ” м җм—җм„ң RCVSмқҳ кёүм„ұкё° м№ҳлЈҢлЎң кі л Өн•ҳлҠ” кІғмқҖ м Ғм Ҳн•ҳм§Җ м•ҠлӢӨкі мғқк°ҒлҗңлӢӨ. к·ёлҹ¬лӮҳ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мҷ„м „нһҲ нҳём „лҗң мқҙнӣ„м—җлҸ„ 3к°ңмӣ” мқҙмғҒ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лҠ” кІҪмҡ° кіјкұ° RCVSм—җ кё°мқён•ң м§ҖмҶҚ л‘җнҶөмқҳ м№ҳлЈҢлЎң CGRP н‘ңм Ғ м№ҳлЈҢлҘј кі л Ө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ліё мҰқлЎҖлҠ” нҺёл‘җнҶө лі‘л Ҙмқҙ мһҲмңјлӮҳ 30л…„к°„ л‘җнҶөмқҙ м—Ҷм—ҲлҚҳ нҷҳмһҗлЎң лІјлқҪл‘җнҶө л°ңмғқ нӣ„ лӢӨл°ңм„ұ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ҙ нҷ•мқёлҗҳм—ҲлӢӨ. 추м Ғн•ң мҳҒмғҒм—җм„ң лҮҢнҳҲкҙҖ мҲҳ축мқҖ нҳём „лҗҳм—Ҳмңјл©° л‘җнҶөмқ„ мң л°ңн• л§Ңн•ң лҮҢлі‘ліҖлҸ„ л°ңкІ¬лҗҳм§Җ м•Ҡм•ҳлӢӨ. к·ёлҹјм—җлҸ„ нҷҳмһҗлҠ” 2л…„к°„ мҳӨмӢ¬мқҙлӮҳ л№ӣкіөнҸ¬мҰқ л°Ҹ мҶҢлҰ¬кіөнҸ¬мҰқмқҙ лҸҷл°ҳлҗҳм§Җ м•ҠлҠ” VAS 3-5м җмқҳ л‘җнҶөмқҙ м§ҖмҶҚлҗҳм—ҲлӢӨ. кіјкұ°мқҳ RCVSм—җ кё°мқён•ң м§ҖмҶҚ л‘җнҶөмңјлЎң нҶ н”јлқјл©”мқҙнҠё, н”„лЎңн”„лқјлҶҖлЎӨ л°Ҹ м•„лҜёнҠёлҰҪнӢёлҰ° м•Ҫм ңм—җлҠ” нҒ¬кІҢ л°ҳмқ‘мқҙ м—Ҷм—ҲмңјлӮҳ н”„л Ҳл§Ҳл„ӨмЈјл§ҷ м„ё м°ЁлЎҖ м№ҳлЈҢ мқҙнӣ„ нҒ° л¶Җмһ‘мҡ© м—Ҷмқҙ л‘җнҶөмқҳ мң мқҳлҜён•ң нҳём „мқ„ ліҙм—¬ мқҙлҘј ліҙкі н•ҳлҠ” л°”мқҙлӢӨ.
Figure.
Initial and follow-up brain MRA. (A) Initial MRA shows multiple cerebral vasospasm in the both middle cerebral arteries, anterior cerebral arteries, right vertebral artery (arrows) and (B) distal segments of both internal carotid arteries (arrows). (C, D) A follow-up MRA performed 80 days after symptom onset demonstrated complete resolution of the cerebral vasospasm. MRA,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 REFERENCES
- REFERENCES
- 1. Ling YH, Chen SP. Narrative review: headaches after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Curr Pain Headache Rep 2020;24:74.
[Article] [PubMed]2. Ling YH, Wang YF, Lirng JF, Fuh JL, Wang SJ, Chen SP. Post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headache. J Headache Pain 2021;22:14.
[Article] [PubMed] [PMC]3. John S, Singhal AB, Calabrese L, Uchino K, Hammad T, Tepper S, et al. Long-term outcomes after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Cephalalgia 2016;36:387-394.
[Article] [PubMed]4. Headache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IHS).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 (beta version). Cephalalgia 2013;33:629-808.
[Article] [PubMed]5. Chen SP, Wang SJ. Pathophysiology of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J Biomed Sci 2022;29:72.
[Article] [PubMed] [PMC]6. Chen SP, Chang YA, Chou CH, Juan CC, Lee HC, Chen LK, et al. Circulating microRNAs associated with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Ann Neurol 2021;89:459-473.
[PubMed]7. Zhao M, Kaiser E, Cucchiara B, Zuflacht J.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exacerbation after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inhibitor administration. Neurohospitalist 2023;13:415-418.
[Article] [PubMed] [P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