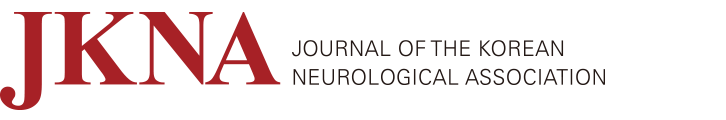Establishing the Neurology Policy Section (NPS)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A Policy-oriented Approach to Neurology
- Soo-Hyun Park, MD, PhD, Bum Joon Kim, MD, PhDa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м§Җмқҳ мӢ кІҪкіј м •мұ… л¶Җ분(Neurology Policy Section) кө¬м¶•: мӢ кІҪн•ҷмқҳ м •мұ…м Ғ м ‘к·ј
- л°•мҲҳнҳ„, к№ҖлІ”мӨҖa
- Received March 31, 2025; В В В Revised April 9, 2025; В В В Accepted April 9, 2025;
лҢҖн•ңмӢ кІҪкіјн•ҷнҡҢм§Җ(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JKNA)лҠ” мӢ кІҪн•ҷ 분야м—җм„ң м°Ҫмқҳм Ғмқё м—°кө¬мҷҖ мөңмӢ мқҳ мқҳн•ҷ м •ліҙлҘј м ңкіөн•ҳл©ҙм„ң мӢ кІҪн•ҷмқҳ 진лЈҢмҷҖ көҗмңЎ л°Ҹ м—°кө¬м—җ кё°м—¬н•ҙ мҷ”лӢӨ. ліё н•ҷнҡҢм§ҖлҠ” мӢ кІҪн•ҷ л°Ҹ мӢ кІҪкіј м§Ҳнҷҳм—җ лҢҖн•ң м „л¬ё м§ҖмӢқмқ„ ліҙлӢӨ м ‘к·јн•ҳкё° мүҪкІҢ м ңкіөн•ҳкі мһ„мғҒм—җм„ң нҷңмҡ©н• мҲҳ мһҲлҠ” мөңмӢ м—°кө¬ кІ°кіјлҘј кіөмң н•ЁмңјлЎңмҚЁ мӨ‘мҡ”н•ң м—ӯн• мқ„ н•ҳкі мһҲлӢӨ. нҠ№нһҲ көӯл¬ё н•ҷнҡҢм§ҖлЎңм„ң мӢ кІҪн•ҷмқҳ мөңмӢ лҸҷн–Ҙмқ„ мқҙн•ҙн•ҳкё° мүҪкІҢ м „лӢ¬н•ҳл©° мӢ кІҪн•ҷмқ„ м „кіөн•ҳлҠ” м „кіөмқҳл“Өм—җкІҢ мң мҡ©н•ң м§ҖмӢқмқ„ м ңкіөн•ҳмҳҖлӢӨ. мқҙлҹ¬н•ң мӢңлҸ„мқҳ мқјнҷҳмңјлЎң 2022л…„л¶Җн„°лҠ” Neurology Education Sectionмқ„ мғҲлЎң лҸ„мһ…н•ҳм—¬ мһ„мғҒ мӮ¬лЎҖ м—°кө¬мҷҖ көҗмңЎм Ғ лҸ„мӣҖмқ„ м ңкіөн•ЁмңјлЎңмҚЁ мқҳлЈҢ м „л¬ёк°Җл“Өмқҙ мӢ кІҪн•ҷмқҳ мғҲлЎңмҡҙ м •ліҙлҘј н•ҷмҠөн•ҳкі мһ„мғҒм—җ м Ғмҡ©н• мҲҳ мһҲлҸ„лЎқ м§Җмӣҗн•ҳмҳҖлӢӨ[1].
мөңк·ј көӯлӮҙ мқҳлЈҢ нҷҳкІҪмқҳ кёүкІ©н•ң ліҖнҷ”м—җ л”°лҘё н•ҷнҡҢмқҳ м§ҖмҶҚм Ғмқё л°ңм „мқ„ мң„н•ҙм„ңлҠ” нҡҢмӣҗл“Ө к°„мқҳ м •мұ…м Ғ л…јмқҳмҷҖ мӮ¬нҡҢм Ғ мҹҒм җм—җ лҢҖн•ң м Ғк·№м Ғмқё кіөлЎ нҷ”к°Җ м ҲмӢӨн•ҙмЎҢлӢӨ. мқҙм—җ л”°лқј мқҙлҹ¬н•ң ліҖнҷ”лҘј мӢ¬лҸ„ мһҲкІҢ л…јмқҳн• мҲҳ мһҲлҠ” кіөмӢқм Ғмқҙкі мІҙкі„м Ғмқё нҶ лЎ мқҳ мһҘмқ„ л§Ҳл Ён• н•„мҡ”к°Җ лҚ” мӨ‘мҡ”н•ҙм§Җкі мһҲлӢӨ. нҠ№нһҲ мӢ кІҪкіјк°Җ көӯк°Җк°Җ м •н•ң 8к°ңмқҳ н•„мҲҳ мқҳлЈҢ кіјлӘ©м—җ нҸ¬н•Ёлҗҳл©ҙм„ң көӯлҜј кұҙк°•мқ„ мң„н•ң н•„мҲҳм Ғмқё мқҳлЈҢ 분야лЎң лҚ”мҡұлҚ” л°ңм „н•ҳкё° мң„н•ң м •мұ…м Ғ м ‘к·јмқҙ мҡ”кө¬лҗҳлҠ” мӢңм җмқҙлӢӨ[2]. лҚ”л¶Ҳм–ҙ мӢ кІҪкіј м „л°ҳм—җ кұёміҗ лӢӨм–‘н•ң м •мұ…м Ғ нҳ„м•Ҳмқҙ мЎҙмһ¬н•ҳл©° к°Ғ 분과별лЎңлҸ„ мЈјмҡ” мҹҒм җл“Өмқҙ м Ғм§Җ м•ҠлӢӨ.
мӢ кІҪкіј м§Ҳнҷҳм—җ лҢҖн•ң м№ҳлЈҢмқҳ нҠ№м§•мқҖ м§Ҳнҷҳмқҳ л°ңмғқ мӢңм җм—җ л”°лқј м№ҳлЈҢмқҳ л°©лІ•мқҙ лӢ¬лқјм§Ҳ мҲҳ мһҲм–ҙ кёүм„ұкё°мҷҖ л§Ңм„ұкё° м№ҳлЈҢ кё°кҙҖ к°„м—җ мң кё°м Ғмқё 진лЈҢ нҳ‘л Ҙ мІҙкі„ кө¬м¶•мқҙ мӨ‘мҡ”н•ҳлӢӨлҠ” м җмқҙлӢӨ[3]. лҳҗн•ң м •л¶Җ м •мұ…кіј л§һл¬јл Ө мғҒкёүмў…н•©лі‘мӣҗмқҳ м „нҷҳ мӮ¬м—…мқ„ нҸ¬н•Ён•ң 진лЈҢ нҷҳкІҪмқҳ ліҖнҷ”м—җ м Ғмқ‘н•ҳкё° мң„н•ҙм„ңлҠ” мӨ‘мҰқлҸ„ м„Өм •кіј мқҳлў° л°Ҹ мһ¬мқҳлў° мІҙкі„лҘј м„ёл°Җн•ҳкІҢ кө¬м¶•н• н•„мҡ”к°Җ мһҲлӢӨ. л”°лқјм„ң м•һмңјлЎң мӢ кІҪкіј 분야мқҳ мқҳлЈҢ м •мұ…лҸ„ мқҙлҹ¬н•ң ліҖнҷ”м—җ л§һлҠ” мқҳлЈҢ мҲҳмҡ”мҷҖ кіөкёүм—җ лҢҖн•ң мІҙкі„м Ғмқё м—°кө¬к°Җ н•„мҡ”н•ҳлӢӨ[4]. мӢ кІҪн•ҷ 분야лҠ” кіјкұ° 진лӢЁ мң„мЈјмқҳ 진лЈҢм—җм„ң лІ—м–ҙлӮҳ м№ҳлЈҢмҷҖ кҙҖл Ён•ҳм—¬ нҒ° л°ңм „мқ„ мқҙлЈЁл©° к°Ғ м§Ҳнҷҳлі„ м№ҳлЈҢлІ•лҸ„ лӢӨм–‘н•ҙмЎҢлӢӨ. кі к°Җмқҳ мӢ м•Ҫкіј мғҲлЎңмҡҙ м№ҳлЈҢлІ• лҸ„мһ…мңјлЎң мқён•ҙ нҷҳмһҗл“Өмқҙ м№ҳлЈҢлҘј м Ғм ҲнһҲ л°ӣмқ„ мҲҳ мһҲлҸ„лЎқ м№ҳлЈҢ нҳ„нҷ©м—җ лҢҖн•ң 분м„қкіј м—°кө¬лҸ„ н•„мҡ”н•ҳлӢӨ[5].
м№ҳлЈҢмқҳ лӢӨм–‘нҷ”мҷҖ лҚ”л¶Ҳм–ҙ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қҳ 진лЈҢ 분야мҷҖ к·јл¬ҙ нҳ•нғңлҸ„ лӢӨм–‘н•ҙм§Җкі мһҲлӢӨ. к°Ғ лі‘мӣҗм—җм„ң мӢ кІҪкі„ мӨ‘нҷҳмһҗмӢӨмқҳ н•„мҡ”м„ұмқҙ мҰқк°Җн•ҳл©ҙм„ң мқҙлҘј м „лӢҙн•ҳлҠ”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қҳ мҲҳлҸ„ м җм җ лҠҳм–ҙлӮҳкі мһҲлӢӨ. лҳҗн•ң мӢ кІҪмӨ‘мһ¬мӢңмҲ мқ„ лӢҙлӢ№н•ҳлҠ”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 мҲҳлҸ„ мҰқк°Җ 추세м—җ мһҲмңјл©° мқ‘кёүмӢӨ л°Ҹ мһ…мӣҗ м „лӢҙмңјлЎң к·јл¬ҙн•ҳлҠ”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қҳ мҲҳлҸ„ м җм җ мҰқк°Җн•ҳкі мһҲлӢӨ[6]. л”°лқјм„ң мӢ кІҪкіј м „л¬ёмқҳмқҳ лӢӨм–‘н•ң м—ӯн• м—җ лҢҖн•ң к·јл¬ҙ нҳ„нҷ© 분м„қкіј кҙҖл Ён•ң м—°кө¬к°Җ н•„мҡ”н•ҳлӢӨ. мқҙлҘј нҶөн•ҙ мӢ кІҪкіј 분야мқҳ м№ҳлЈҢ л°Ҹ ліҙмғҒмқҳ м Ғм Ҳм„ұ, к·јл¬ҙ нҳ•нғңм—җ л”°лҘё көҗмңЎ л°Ҹ мҲҳл Ё ліҖнҷ”м—җ лҢҖн•ң кі„нҡҚмқ„ мҲҳлҰҪ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н•ҷнҡҢмқҳ м •мұ…мқҖ мҲҳл Ё л°Ҹ көҗмңЎ, 진лЈҢ, мһ„мғҒ, м—°кө¬мҷҖ к°ҷмқҖ лӢӨм–‘н•ң мҡ”мҶҢл“Өмқ„ нҶөн•©м ҒмңјлЎң кі л Өн•ҙм•ј н•ңлӢӨ. л”°лқјм„ң н•ҷнҡҢм—җм„ңлҠ” лӢӨм–‘н•ң мҡ”кө¬лҘј л°ҳмҳҒн•ҳм—¬ м—¬лҹ¬ мқёмҰқ м ңлҸ„лҘј мӢңн–үн•ҳкі мһҲмңјл©° мһҗн•ҷнҡҢл“Өм—җм„ңлҸ„ мӢ кІҪмғқлҰ¬кІҖмӮ¬мӢӨмқҙлӮҳ лҮҢмЎёмӨ‘м„јн„°мҷҖ к°ҷмқҖ мһҗмІҙ мқёмҰқм ңлҸ„ нҷңл°ңнһҲ 진н–үн•ҳкі мһҲлӢӨ[7]. мқҙлҹ¬н•ң мқёмҰқ м ңлҸ„лҠ” мӢ кІҪкіј 진лЈҢмқҳ м „л¬ём„ұмқ„ ліҙмһҘн•ҳкі мқҳлЈҢмқҳ м§Ҳмқ„ мң м§Җн•ҳлҠ” лҚ° лҸ„мӣҖмқҙ лҗң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ҖмҶҚм Ғмқё м§Ҳм Ғ кҙҖлҰ¬мҷҖ мқёмҰқ м ңлҸ„лҘј нҶөн•ҙ нҡҢмӣҗмқҳ к¶Ңмқөмқ„ мҰқ진мӢңнӮ¬ мҲҳ мһҲлҸ„лЎқ л’·л°ӣм№Ён• н•ҷнҡҢмқҳ м •мұ…м Ғ м§ҖмӣҗлҸ„ н•„мҡ”н•ҳлӢӨ. мӢ кІҪн•ҷ м—°кө¬м—җм„ңлҸ„ мңӨлҰ¬м Ғ мҡ”мҶҢмқҳ мӨ‘мҡ”м„ұмқҙ к°•мЎ°лҗҳкі мһҲмңјл©° мөңк·ј мЈјлӘ©л°ӣкі мһҲлҠ” мқёкіөм§ҖлҠҘ кё°л°ҳ м—°кө¬ л°©лІ•лЎ мқҳ лҸ„мһ… м—ӯмӢң м—°кө¬ м •мұ…м—җ л°ҳмҳҒлҗҳм–ҙм•ј н• н•өмӢ¬ мҡ”мҶҢлЎң л¶Җк°Ғлҗҳкі мһҲлӢӨ[8]. лҳҗн•ң м „кіөмқҳм—җ лҢҖн•ң көҗмңЎмқҳ мёЎл©ҙм—җм„ңлҸ„ м „кіөмқҳмқҳ мҲҳл Ё нҷҳкІҪмқ„ к°ңм„ н•ҳкі м—ӯлҹү көҗмңЎ мӨ‘мӢ¬мқҳ н”„лЎңк·ёлһЁмқ„ к°ңл°ңн•ЁмңјлЎңмҚЁ нҡЁкіјм Ғмқё мҲҳл Ёмқ„ мң„н•ң м •мұ… к°ңл°ңмқҳ мӨ‘мҡ”м„ұм—җ л¶Җмқ‘н•ҳкі мһҲлӢӨ[9].
мқҳлЈҢ м •мұ…мқҳ к·јкұ° кё°л°ҳ м ‘к·јмқҖ м •мұ… кІ°м •мқҙ кіјн•ҷм Ғ м—°кө¬мҷҖ мӢӨмҰқм Ғ лҚ°мқҙн„°м—җ кё°мҙҲн•ҳлҸ„лЎқ ліҙмһҘн•ҳм—¬ м •мұ…мқҳ нҡЁкіјм„ұкіј нҡЁмңЁм„ұмқ„ мҰқлҢҖмӢңнӮӨкі кІ°м • кіјм •мқҳ нҲ¬лӘ…м„ұкіј мұ…мһ„м„ұмқ„ м ңкі н•ҳл©° мӢ лў°м„ұмқ„ лҶ’мқёлӢӨ. мқҙлҹ¬н•ң к·јкұ°л“ӨмқҖ кұҙк°•ліҙн—ҳкіөлӢЁ, кұҙк°•ліҙн—ҳмӢ¬мӮ¬нҸүк°Җмӣҗ, ліҙкұҙліөм§Җл¶Җ л“ұ мқҳлЈҢ кҙҖл Ё м—…л¬ҙлҘј лӢҙлӢ№н•ҳлҠ” кё°кҙҖм—җм„ң м •мұ… мҲҳн–үмқҳ к·јкұ° мһҗлЈҢлЎң нҷңмҡ©лҗ мҲҳ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мҡ”кө¬лҘј л°ҳмҳҒн•ҳм—¬ JKNAлҠ” мӢ кІҪкіј м •мұ…м—җ лҢҖн•ң мқҙн•ҙлҘј лҸ„лӘЁн•ҳкі мһҗмң лЎӯкІҢ л…јмқҳн• мҲҳ мһҲлҠ” мӢ кІҪкіј м •мұ… л¶Җл¬ё(Neurology Policy Section, NPS)мқ„ мғҲлЎӯкІҢ мӢңмһ‘н•ҳкі мһҗ н•ңлӢӨ.
JKNAмқҳ NPSлҠ” мӢ кІҪн•ҷ 분야мқҳ мқҳлЈҢ м •мұ…кіј 진лЈҢ нҳ„мһҘмқҳ нҠ№мҲҳм„ұмқ„ л°ҳмҳҒн•ҳм—¬ мӨ‘мҡ”н•ң м—ӯн• мқ„ н•ҳкі мһҗ н•ңлӢӨ. лӢӨлҘё мқҳлЈҢ м •мұ… кҙҖл Ё н•ҷнҡҢм§Җл“Өмқҙ мқҳн•ҷ көҗмңЎ, кұҙк°•ліҙн—ҳ ліҙмһҘм„ұ, мқ‘кёү мқҳлЈҢ мӢңмҠӨн…ң, к°җм—јлі‘ л“ұ л„“мқҖ мЈјм ңлҘј лӢӨлЈЁлҠ” л°ҳл©ҙ NPSлҠ” мӢ кІҪкіј м§Ҳнҷҳкіј мӢ кІҪкіј нҷҳмһҗм—җ мҙҲм җмқ„ л§һ추м–ҙ лҚ”мҡұ 세분нҷ”лҗң м ‘к·јмқ„ м ңкіөн• мҳҲм •мқҙлӢӨ. мқҙлҘј нҶөн•ҙ мӢ кІҪн•ҷмқҳ н•ҷл¬ём Ғ л°ңм „лҝҗл§Ң м•„лӢҲлқј мӢ кІҪкіј нҷҳмһҗмқҳ м§Ҳ лҶ’мқҖ м№ҳлЈҢлҘј мң„н•ҙ 진лЈҢ нҳ„мһҘм—җм„ң н•„мҡ”н•ң м •мұ… м ңм•Ҳкіј л…јмқҳлҘј нҷңм„ұнҷ”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лҝҗл§Ң м•„лӢҲлқј NPSлҠ” нҡҢмӣҗл“Өмқҙ нҳ„мһҘм—җм„ң кІҪн—ҳн•ҳлҠ” лӢӨм–‘н•ң л¬ём ңлҘј л°”нғ•мңјлЎң м •мұ…м Ғ м ңм•Ҳмқ„ н• мҲҳ мһҲлҠ” нҶ лҢҖлҘј м ңкіөн•ҳл©° мқҙлҠ” мӢңмқҳм Ғм Ҳн•ң м •мұ… ліҖнҷ”лЎң мқҙм–ҙм§Җкё° мң„н•ң н•„мҲҳм Ғмқё кё°л°ҳмқҙ лҗ кІғмқҙлӢӨ. л”°лқјм„ң NPSлҠ” м •кё°м ҒмңјлЎң нҡҢмӣҗл“ӨлЎңл¶Җн„° кұҙмқҳлҘј л°ӣкі мң„мӣҗнҡҢлҘј нҶөн•ҙ мЈјм ңлҘј м„ м •н•ҳм—¬ мӢӨм§Ҳм Ғмқҙкі мӢӨн–ү к°ҖлҠҘн•ң м •мұ… м ңм•Ҳмқ„ н•ҷкі„ л°Ҹ мқҳлЈҢкі„мҷҖ кіөмң н• мҲҳ мһҲлҠ” мҲҳлӢЁмқҙ лҗ кІғмқҙлӢӨ. мқҙлҠ” нҡҢмӣҗл“Өмқҙ мқҳлЈҢ м •мұ… кІ°м • кіјм •м—җ м§Ғм ‘м ҒмңјлЎң кё°м—¬н• мҲҳ мһҲлҠ” мӨ‘мҡ”н•ң лӢЁкі„лЎң мӢ кІҪкіј кҙҖл Ё м •мұ…мқҳ нҡЁкіјм„ұкіј мӢӨнҳ„ к°ҖлҠҘм„ұмқ„ лҶ’мқј мҲҳ мһҲмқ„ кІғмңјлЎң кё°лҢҖн•ңлӢӨ.
NPSлҠ” м •мұ…кіј кҙҖл Ёлҗң мӣҗм Җ нҳ•нғңмқҳ м—°кө¬[7], нҳ„мһҘмқҳ м„Өл¬ёмЎ°мӮ¬ кІ°кіј[10], м „л¬ёк°Җмқҳ мў…м„ӨмқҙлӮҳ кё°кі л¬ё[11] л“ұ лӢӨм–‘н•ң нҳ•нғңмқҳ мӣҗкі лҘј кІҢмһ¬н•ҳм—¬ мӢ кІҪкіјмқҳ 진лЈҢ, көҗмңЎ, м—°кө¬ м •мұ… л“ұм—җ кұём№ң лӢӨм–‘н•ң 분야мҷҖ к°Ғ 분과별 м „л¬ёнҷ”лҗң 진лЈҢм—җ кҙҖн•ң м •мұ…м Ғ мӮ¬м•Ҳмқ„ л°”нғ•мңјлЎң нҡҢмӣҗл“Ө к°„ мқҳкІ¬ көҗлҘҳк°Җ к°ҖлҠҘн•ҳлҸ„лЎқ мҡҙмҳҒн• кі„нҡҚмқҙлӢӨ. мқҙлҹ¬н•ң л°©мӢқмқ„ нҶөн•ҙ н•ҷнҡҢ нҡҢмӣҗ лӘЁл‘җк°Җ кё°кі н• мҲҳ мһҲлҠ” к°ңл°©лҗң кө¬мЎ°лҘј мқҙмҡ©н•ҳм—¬ нҡҢмӣҗл“Өмқҳ лҚ” л§ҺмқҖ м°ём—¬мҷҖ кҙҖмӢ¬мқ„ мң лҸ„н• мҳҲм •мқҙлӢӨ. м•һмңјлЎңлҸ„ мӢ кІҪкіј нҡҢмӣҗл“Өмқҳ кҫёмӨҖн•ң кҙҖмӢ¬кіј м°ём—¬лЎң NPSк°Җ м •мұ…м Ғ, мӮ¬нҡҢм Ғ л¬ём ңм—җ лҢҖн•ң л…јмқҳлҘј н• мҲҳ мһҲлҠ” м „л¬ём„ұ мһҲлҠ” 분야лЎң м„ұмһҘн• мҲҳ мһҲлҸ„лЎқ л…ёл Ҙн•ҳкІ лӢӨ.
- REFERENCES
- REFERENCES
- 1. Lee SH, Bae DW. Clinical reasoning: a 28-year-old male presenting with cough induced thunderclap headache. J Korean Neurol Assoc 2022;40:91-98.
[Article]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Essential health care package. [online] [cited 2024 Mar 15].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menu.es?mid=a20101000000.3. Song EH, Moon YS, Park JH, Joo BE, Han HS, Lee CN, et al. Current statu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and future perspective: a questionnaire survey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of South Korea. J Korean Neurol Assoc 2024;42:1-12.
[Article]4. Kim D, Jo N, Cha JK, Choi H, Jeong SW, Koh IS, et al. Workload in emergency rooms among clinical specialties and overburdened neurologists. J Korean Neurol Assoc 2022;40:127-136.
[Article]5. van Dyck CH, Swanson CJ, Aisen P, Bateman RJ, Chen C, Gee M, et al. Lecanemab in early AlzheimerвҖҷs disease. N Engl J Med 2023;388:9-21.
[Article] [PubMed]6. Lee KB, Lee JS, Lee JY, Kim JY, Jeong HY, Kim SE, et al. Quality of acute stroke care with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proposal for severe emergency medical center. J Korean Neurol Assoc 2023;41:18-30.
[Article]7. Lee EJ, Park HK, Jeong HW, Boo KY, Park YJ, Kim TW, et al. Current status of stroke center certification accreditation recommendations for comprehensive stroke centers certification: a consensus statement from the Stroke Associated Korean Societies. J Korean Neurol Assoc 2023;41:257-267.
[Article]8. Ko PW. Will ChatGPT be useful for Korean neurologis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Neurol Assoc 2024;42:233-240.
[Article]9. Ryu H, Oh J, Kim CK, Park J, Kang KW, Choi H. Effect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on resident training: a comparative review of Korean neurologistвҖҷs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13 on self-evaluation and professorвҖҷs evaluation. J Korean Neurol Assoc 2024;42:307-312.
[Article]10. Ji KH, Byun JI, Koo DL, Kim H, Park HS, Lee JY, et al. A survey of Korean neurologistsвҖҷ awarenes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hallenges in sleep medicine. J Korean Neurol Assoc 2025;43:21-27.
[Article]11. Yang YS, Kwak YT. Public action for prevention of iatrogenic transmission Of CJD. J Korean Neurol Assoc 2022;40:296-306.
[Article]